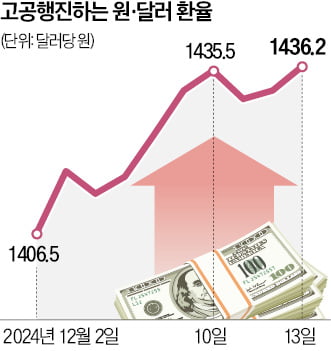[통념 비껴간 2010 증시] 외국인이 나침반?…12조 판 기관이 수익률 앞섰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채권·주식 동반강세
유동성 효과 … '거꾸로 등식' 깨져
바닥일 때 샀는데
한전·SK텔레콤 1년 내내 소외
인덱스펀드 약진
액티브는 빠른 순환매에 백기
유동성 효과 … '거꾸로 등식' 깨져
바닥일 때 샀는데
한전·SK텔레콤 1년 내내 소외
인덱스펀드 약진
액티브는 빠른 순환매에 백기
국내 증시는 올해 코스피지수 2000선을 돌파하는 초강세로 '짝수해 징크스'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날려버렸다. 짝수해 징크스는 홀수해 주가가 오르면 이듬해 부진할 것이란 대표적인 증시 통념 중 하나다. 외국인이 채권까지 쓸어담으면서 통상 반대로 움직이게 마련인 주식과 채권이 이례적으로 동반 강세를 보이는 등 올해는 증시 통념들이 뒤집힌 한 해였다.
◆증시 곳곳서 예상 외 흐름
코스피지수는 올 들어 폐장을 하루 앞둔 29일까지 360.72포인트(21.43%) 급등했다. 같은 기간 지표물인 3년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4.41%에서 연 3.38%로 1.03%포인트 떨어졌다. 금리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채권값이 올랐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채권가격은 경기가 안 좋을 때 상승(금리는 하락)하므로 주식과는 역관계를 보인다. 하지만 올해는 넘치는 글로벌 유동성이 국내 주식과 채권에 쏟아져 들어와 동시에 가격을 끌어올렸다. 외국인은 올해 국내 주식을 21조7000억원어치 샀고,채권은 64조3200억원 순매수했다.
외국인이 핵심 매수주체였지만 수익률은 오히려 기관이 앞섰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20개 종목의 올 평균 수익률은 56.30%였지만 기관 순매수 종목은 58.94% 뛰었다. 기관은 올해 12조5000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내다 팔았지만 우리금융 현대중공업 에쓰오일 등은 순매수했다. 주도적인 매수주체를 따라 사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증시 통념을 비껴간 셈이다.
종목 움직임도 예상 밖이었다. 통상 시가총액 비중이 큰 10대그룹 대표주들이 주가 상승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는 현대차(45.86%)보다 기아차(155.86%)가 더 크게 오르는 등 '형님보다 나은 아우'들이 여럿 등장했다. LG화학이 66.73% 오르는 동안 그룹 대표주인 LG전자는 되레 6.17% 하락했다. 포스코도 포스코켐텍 포스코강판 등 자회사들이 급등하는 동안 20% 넘게 밀려나 체면을 구겼다.
'밀짚모자는 겨울에 사라'는 증시 격언도 올해는 맞지 않았다. 주가가 바닥일 때 사둔 종목이 나중에 반등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격언이지만,소수 종목 위주의 장세가 펼쳐지면서 소외주들은 철저히 외면당하는 흐름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주가는 크게 올랐지만 한국전력(-12.02%) SK텔레콤(1.76%) 등은 1년 내내 힘을 쓰지 못했다.
◆분산투자도 힘 못 써
'계란을 한바구니에 담아서는 안 된다'는 투자철칙도 올해는 빛이 바랬다. 분산투자의 대표 상품인 주식형펀드에서 지속적으로 환매가 일어났지만 소수 종목에 투자하는 자문형 랩이 뜨면서 '압축투자' 열풍이 증권가를 휩쓸었다. 지난 3월 말 8000억원대였던 10대 증권사의 자문형 랩 잔액이 최근 5조원대로 6배 가까이 불어났다. 펀드에서 빠진 자금이 자문형 랩으로 흡수되자 자산운용사들은 잇따라 자문형 랩을 본뜬 압축펀드를 내놓으며 맞불 작전을 폈다.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운용으로 시장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액티브펀드(일반 주식형)는 지수를 따라가는 인덱스펀드에 백기를 들었다. 인덱스펀드는 액티브펀드에 비해 상대 수익률이 낮은 게 보통인데 올해는 오히려 인덱스펀드가 21.59%(28일 기준)로 액티브펀드(18.84%)를 웃돌았다. 빠른 순환매 장세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한 액티브펀드가 많았기 때문이다.
채권의 투자수익률이 주식보다 '한수 아래'라는 고정관념도 깨졌다. 해외펀드 중 채권형의 올해 수익률은 11.43%로 주식형(7.72%)을 4%포인트 가까이 앞섰다. 신용등급이 낮은 투기등급 채권에 투자하면서 고수익을 노리는 하이일드채권형펀드들이 글로벌 경기회복에 힘입어 선전한 덕분이다.
배성진 현대증권 연구위원은 "내년에도 종목별 순환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집중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순환매 장세에서 유리한 인덱스펀드의 강세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지연/서보미 기자 sere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