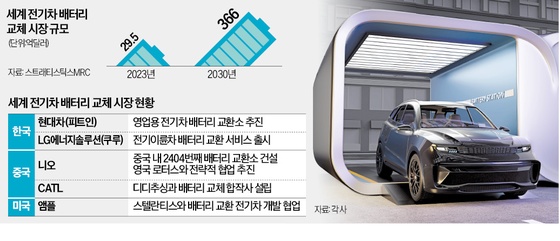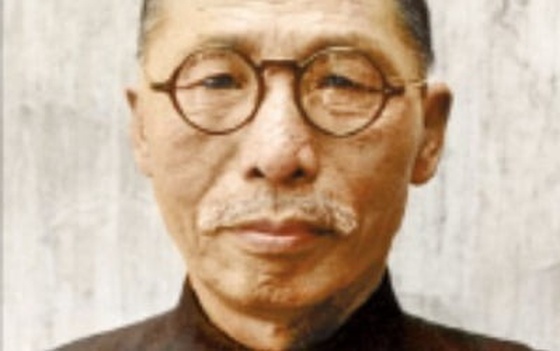[감성 여행] 난바다 잠재운 땅끝 일출…유배된 섬들이여 깨어나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곳이 반도 시작인가, 끝인가
갈두산 봉수대에 오르니 안갯속에 모습을 드러내는 흑일도·노화도·보길도
녹우당 비자나무 휩쓸리는데 고산 윤선도는 어디가고…
일지암 초막 뒤 물 한 모금에 대흥사 천년고찰도 속세일 뿐
여기서 아예 돌부처가 될까
땅끝탑 앞에 서서 이곳은 반도의 시작인가,끝인가를 생각한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 했으니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리라.젊은 날에는 끝을 떠올리는 일이 많았지만 살아갈 날이 줄어들면서 끝을 시작으로 바꾸는 법을 배워야 했다. 갈두산 봉수대에 오른다. 안갯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흑일도 · 노화도 · 보길도 등 남해의 섬들.한반도라는 광원을 바라보며 난바다에 떠 있는 외로운 위성들이다.
땅끝마을을 뒤로 한 채 윤선도의 유적지인 녹우당을 찾아 떠난다. 여기저기 밭이랑에선 농부들이 겨울 배추 모종 옮겨심기를 하고 있다. 이중환은 《택리지》 전라도편에서 '해남 · 강진 등 여덟 고을은 서울에서 아주 멀고 남해에 가까이 있으며 겨울에 초목이 시들지 않고 벌레가 움츠리지 않는다'고 했다. 그 기후조건 때문에 해남은 우리나라 최대의 배추 산지가 됐다. 겨우내 해풍을 견디며 얼었다 녹기를 반복한 해남의 겨울 배추는 이파리가 얇고 사근사근하다.
◆고산의 시심(詩心)과 정서의 원형 녹우당
해남읍 연동리.연꽃과 해송 숲이 멋들어진 방지(方池)를 지나자 유물전시관이 기다리고 있다. 전시 유물 가운데 공재 윤두서가 그린 '여협도(女俠圖)'가 특히 흥미롭다. 당나라 때 여협인 홍선을 그린 그림이다. '의리 없는 사내를 경계시키기엔 충분하다'라고 했던 한 선비의 평이 떠올라 홀로 '썩소'를 짓는다.
녹우당은 고산 윤선도(1587~1671년)가 살았던 해남 윤씨 종택이다. 문지기인 키 큰 은행나무를 스쳐 지나 사랑채인 녹우당 대문을 들어선다. 효종이 고산에게 하사한 수원 집을 옮겨 지은 녹우당은 'ㅁ' 자형 건물인 데다 마당이 좁아서 들어온 소리가 쉽사리 빠져나가지 못할 것 같은 구조다. '뒷산의 푸른 비자나무들이 바람에 휩쓸리는 소리가 빗소리처럼 들린다고 해서 붙여졌다는 '녹우(綠雨)' 소리가 잘 들릴 듯하다. 하기야 고산은 녹우당을 지은 지 3년 후에 세상을 떠났으니,언제 한번 쪽마루에 한가로이 앉아 나무들이 바람에 휩쓸리며 내는 소리를 제대로 즐겨보기나 했을까.
고산사당을 옆에 끼고 덕음산 자락 비자나무숲으로 간다. 어초은 윤효정 묘를 지나 산길을 올라가자 비자나무숲이 펼쳐진다.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서 숲이 어둑어둑하다. '뒷산의 바위가 드러나면 마을이 가난해진다'라는 선대의 말씀을 받든 후손들이 숲을 잘 가꾼 덕이다. 정형외과 환자처럼 몸속에 시멘트를 잔뜩 집어넣은 비자나무들이 늙은 종친들처럼 "어흠,어흠" 헛기침 소리를 내는 듯하다. 8세 때 큰아버지의 양자로 입양돼 스무 살까지 살았던 연동마을의 뛰어난 정취는 고산의 시심과 풍부한 정서적 배경을 이뤘을 것이다.
◆구림구곡(九林九曲) 숲길이 아름다운 대흥사
좌이대수(左而帶水).좌측에 계곡을 거느리고 구림구곡(九林九曲) 10리 길을 걸어 두륜산(703m) 대흥사로 향한다. 편백나무 · 동백나무가 울창한 숲 사잇길,푸른 공기를 흡입한 몸이 상쾌해진다. 편백나무 무릎 아래 공손히 피어 있는 바알간 꽃무릇 꽃이 애잔하다. 영화 '서편제' 촬영지인 유선관을 지나 일주문으로 들어서자 이내 부도밭이다. 이곳의 '짱'은 용 조각 위에 높이 올린 보주형 상륜부가 화려한 서산대사 부도다. 문미의 곡선이 아름다운 가허루 문을 지나 천불전 마당으로 들어서자 저마다 다른 표정을 짓고 있는 천불상이 반긴다. 잘 찾아보면 나를 닮은 부처도 있을 것 같다.
'북원'과 표충사를 둘러보고 나서 서산대사의 《선가귀감》 속 '자기 자신의 천진스러운 본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첫째 가는 정진이다(守本眞心 第一精進)'라는 말씀을 새기며 다성(茶聖) 초의선사의 40여년 흔적이 밴 일지암으로 향한다. 일지암이란 이름은 '내 항상 생각하노니 저 뱁새도/ 한 몸 편히 쉬기엔 한 가지만 있어도 충분하구나(常念焦瞭鳥 安身在一枝)'라는 한산시의 한 구절에서 빌려 온 것이다.
초의선사는 이곳에서 《동다송》을 펴내기도 했고 다산 정약용,추사 김정희 등과 교류하며 선다일여의 가풍을 드날렸다. 현재의 일지암은 초의선사 입적 후 폐허가 된 암자를 한국차인연합회원들이 1980년 복원한 것이다. 한낮의 일지암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여읜 듯 적막하다. 예전에 왔을 적엔 젊은 스님과 더불어 차를 마시며 담소도 나눴건만….
초막 뒤 바위틈에서 솟아 나무대롱을 타고 온 돌확 속 물을 한 모금 떠 마시고 나서 노승봉 아래 마애미륵불을 만나러 북미륵암을 향해 올라간다. 천상의 선녀가 해를 묶어 놓고 하루 만에 만들었다는 마애여래좌상(국보 제308호)은 높이 4.2m에 달하는 거대한 돌부처다. 살찐 얼굴에 둥글넓적하여 원만한 인상이지만 약간 위로 치켜 올라간 눈초리와 굳게 다문 입 때문에 무척 근엄한 인상이다. 마애여래보다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왼쪽 무릎을 굽혀 오른손으로 차공양을 하는 좌우의 공양상에 더 마음이 끌린다. 공양상은 내게 "아만심을 버려라,그러면 네 마음이 바로 극락이다"라고 설법한다. 동삼층석탑 옆 산기슭에서 저 아래 대흥사를 내려다본다. 이곳에선 천년고찰 대흥사도 아득하게 먼 속세일 뿐이다.
◆진도대교에 묻혀버린 울돌목의 추억
해남의 서쪽 끝 전라우수영성지를 찾아간다. 우수영항이 내려다보이는 산자락엔 명량대첩비가 서 있다. 비문은 선조 30년(1597년) 이순신 장군이 진도 벽파정에 진을 설치하고 우수영과 진도 사이 바다의 빠른 물살을 이용해 12척의 배로 133척의 왜적함대를 무찌른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또 비문은 '명량(鳴梁)의 입구여 좁고도 단단하니/ 조수가 밀려오면 양쪽의 땅이 잠길 듯하구나/ 지리를 잘 이용하여 기이한 계략을 내었으니/ 새까맣게 몰려들던 추한 무리 버틸 수가 없었네'라며 역사적 승리를 영탄한다.
충무사 뒤편엔 무슨 상징처럼 소나무 두 그루가 한 가지로 이어진 연리지가 있다. 우수영항과 진도 벽파항을 오가는 거북선 유람선을 일별한 후 명량대첩공원으로 가서 우수영과 진도 녹진 사이 325m밖에 되지 않는 좁은 해협을 바라다본다. 물살이 빨라 우는 소리가 난다 해서 울돌목이라 부르는 이곳은 11.5노트에 달할 정도로 유속이 빨라 소용돌이치듯 급류가 흐른다. 30년 전 진도로 여행 갔다가 통통배로 명량해협을 건너올 때 배가 계속 밀려나는 바람에 두 시간 만에 겨우 건넜던 추억이 떠오른다. 이순신 장군의 지략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가를 실감한 기회였다. 어쩌면 저 허궁다리 진도대교는 우리에게 교통의 편리함을 주는 대신 역사로 건너가는 법을 망각하게 하는 건 아닐는지.
안병기 여행작가
◇보길도서 어부사시사 듣고 해물탕 맛에 취하노니
◆맛집
1998년 남도음식축제에서 대상을 차지한 적이 있는 해남읍 중앙통 오거리 축협 맞은편 골목 안의 용궁해물탕(061-535-5161)을 추천할 만하다. 보리새우,세발낙지,주꾸미,대맛,꽃게,석화,미더덕 등의 해산물 30여 가지를 넣고 끓여내는 해물탕 맛이 일품이다. 3만~6만원.
◆여행 팁
해남 우수영관광지,진도 녹진관광지 일원,울돌목 일원에서 오는 8~10일 명량대첩축제가 열린다. 명량해전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이 축제는 이충무공과 전라도 민초들의 구국정신을 기리는 한마당.명량해전 재현과 도립국악단 공연 등 볼거리와 강강술래 대회 등 관광객 참여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해남군청 문화관광과(061-530-5919),진도군청 문화관광과(061-540-3250).
고산 윤선도의 유적지를 찾아 여행을 계속하고 싶으면 땅끝에서 보길도행 배를 타면 된다. 보길도 부용동은 고산이 마음을 다스리면서 '어부사시사'와 같은 뛰어난 시가문학을 탄생시킨 섬이다. 배는 보길도와 다리로 이어진 노화도 '산양' 선착장으로 가는 것이 많으며 땅끝 선착장에서 보길도까지는 약 60분 걸린다. 뱃삯은 땅끝~산양 5700원,땅끝~보길 8200원.땅끝매표소(061-535-5786).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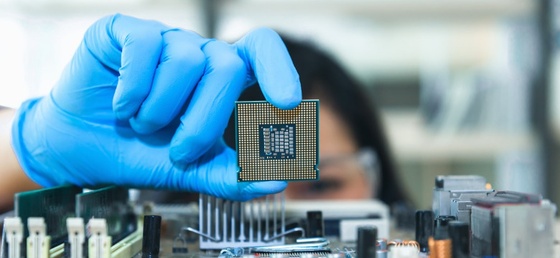
![금리인하 '연내 1회' 축소에도…S&P·나스닥 또 최고치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7017767.1.jpg)

![[단독] 새마을금고 '특판 예금' 가입했는데…"파산 위기라니"](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01262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