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스님 길상사 떠나던 날] 대나무 평상 위에 가사 한장 덮고 송광사로…"스님 추우시겠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처님께 삼배 후 영구차로…수천명 불경외며 극락왕생 기원
李대통령 조문 "큰 교훈 남긴 분"…17일 초재·21일 추모법회
이날 오전 11시30분쯤 길상사 행지실을 나선 법정 스님의 법체는 단촐했다. 그럴싸한 관도,꽃 장식도 없었다. 법체는 관이 아니라 평상에 누운 채 밤색 가사를 넓게 펴서 덮었을 뿐이었다. 평상은 한 사람이 누우면 꼭 맞을 정도로 좁고 작았다.
법정 스님은 생전에 "내가 죽거든 강원도 오두막에서 쓰던 대나무 평상에 입던 옷 그대로 눕혀 다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다비준비위원회는 당초 강원도 오두막에서 이 평상을 가져오려 했으나 폭설 때문에 갈 수 없어 똑같은 모양의 평상을 만들어 고인을 모셨다.
아직 한기(寒氣)를 품은 봄바람 속에 입던 승복 그대로 가사 한 장만 덮은 법정 스님의 모습에 신자들은 "스님 추우시겠다"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위패와 영정을 앞세운 채 법체가 극락전 앞마당으로 향하자 경내를 가득 메운 불자와 시민들은 "나무아미타불""석가모니불"을 염송하며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이날 길상사에 모인 사람은 8000여명.경내는 물론 일주문 밖까지 조문객으로 넘쳐났다. 극락전을 향하는 걸음걸음마다 땅에 엎드려 절하는 불자들도 많았고,이들이 외우는 "나무아미타불" 소리도 점점 커졌다. 법체를 멘 10여명의 스님들은 극락전 앞에서 무릎을 세 번 구부렸다 폈다. "일체의 장례의식을 하지 말라"는 고인의 뜻에 부처님께 삼배를 드리는 것으로 의식을 대신했고,법체는 곧바로 영구차에 모셔졌다.
불자와 시민들의 울음을 뒤로 한 채 길상사를 나선 영구차는 바로 전남 순천 송광사로 향했다. 경찰 차량의 호위를 받으며 이날 오후 5시쯤 송광사에 도착한 법정 스님의 법체는 곧바로 문수전에 모셔졌다.
이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이날 오전 길상사에서 "철저한 무소유의 삶을 살며 마지막 순간까지 참 수행자의 면목을 보여주고 떠난 스님의 가르침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는 내용의 발원문을 낭독하고 법정 스님의 영정 앞에 대종사 추서 법계증과 가사,불자,휘장 등을 바쳤다.
송광사는 13일 오전 11시 영결식을 생략한 채 조촐하게 다비식을 치를 예정이다. 다비식 이후에는 49재와 추모법회가 진행된다. 입적 7일째인 오는 17일부터 6주 동안 길상사에서 매주 수요일에 재를 지낸 뒤 마지막 7재(막재)는 다음 달 28일 송광사에서 치르게 된다. 길상사에서는 또 오는 21일 추모법회도 연다.
한편 빈소가 마련된 길상사와 송광사 등에는 조문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전날 자정까지 2000여명이 조문했던 길상사에는 12일 이른 아침부터 조문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평생을 '무소유'의 정신으로 살다 간 고인의 뜻대로 조의금을 받지 않았고,헌화할 꽃도 없어 빈소는 매우 간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길상사를 찾아 설법전에서 분향한 뒤 "평소 제가 존경하던 분이셔서 저서도 많이 읽었는데 마음이 아프다"며 "살아있는 많은 분들에게 큰 교훈을 남기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환담하며 큰 스승을 잃은 불자들을 위로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주호영 특임장관,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등도 함께 조문했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고건 사회통합위원장 등과 평소 불교에 대한 거친 발언으로 불자들의 원성을 샀던 장경동 대전 중문교회 담임목사 등 이웃종교인들도 추모 대열에 동참했다.
길상사 외에 송광사 지장전,서울 정토회관,대전 백제불교회관,광주 태현사 · 지장왕사 · 보각사,경남 창원 성주사,프랑스 파리의 길상사 파리분원 등 국내외 여러 곳에도 분향소가 마련돼 추모 열기를 더했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논란의 560억 달러 결국 받는다…"자율주행 전환 큰 진전"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B20240614072306907.jpg)

![[단독] 새마을금고 '특판 예금' 가입했는데…"파산 위기라니"](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012629.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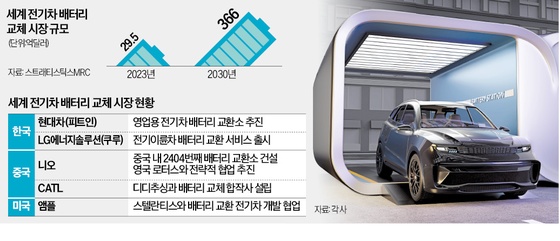





![[베스트셀러] 8년 전 출간 소설의 역주행…'리틀 라이프' 1위](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ZK.3703062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