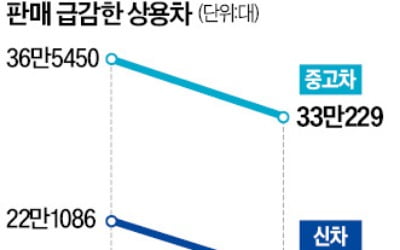[IGM과 함께하는 경영노트] '대박 예감' 10센트짜리 식수정화제, 아프리카서 실패한 까닭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업들이 월드컵을 계기로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아프리카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그렇다면 월드컵이 열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시장을 효율적으로 공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세계적인 생활용품 제조업체 P&G의 사례에서 힌트를 찾아보자.
P&G는 2000년 식수 정화용 분말 '퓨어(PUR)'를 시장에 내놨다. 당시 전 세계에서 매년 300만명 이상이 비위생적 환경으로 죽어갈 때였다. P&G는 물을 정화함으로써 질병을 평균 50%에서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해 상품을 개발했다. 식수 정화 사업으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래 소득증대가 예상되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P&G는 프로젝트에 모두 2000만 달러를 투입했다. 한 봉지에 10센트라는 저렴한 가격에 10ℓ의 물을 정화할 수 있는 획기적 제품이었기 때문에 기대도 컸다.
하지만 P&G는 2003년 하반기 퓨어 프로젝트의 실패를 선언했다. 원인은 뭘까. 그것은 P&G가 최저소득계층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싸고 좋은 제품이면 당연히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일반 소비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우선 최저소득계층은 무언가를 '돈을 주고 사야 한다'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또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도 자각하지 못했다.
한 아프리카 여성이 퓨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보자.우선 그녀에게는 '박테리아' '위생' 등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정보와 지식이 필요하다. 그런 것 없이는 퓨어라는 제품이 왜 필요한지,왜 구매해야 하는지 생각할 수가 없다. 또 퓨어로 '정화한 물'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물과 색깔,맛이 다르기 때문에 '적응'이 필요하다. 여기에 10센트라는 돈도 장벽이었다. 작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돈은 자녀에게 콜라를 사주는 데 보탠다면 훨씬 요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돈이었다. 즉 퓨어를 사려면 자녀의 콜라를 희생해야 했다. 이런 장애물들이 퓨어의 성공을 가로막았다.
결국 P&G는 2004년 이후 퓨어 프로젝트를 일종의 '자선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그 결과 지금은 70개의 파트너들이 50여개의 시장에서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퓨어를 제공하고 있다. 퓨어 프로젝트는 상업적으로는 실패했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으로서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고 있는 셈이다.
미시간대 경제학 교수인 C.K 프라할라드(Prahalad)는 최저소득계층을 빙산의 아랫부분에 비유했다. 보이지 않는 큰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 최저소득계층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뛰어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시장에는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
조미나 상무 · 윤혜임 연구원
세계적인 생활용품 제조업체 P&G의 사례에서 힌트를 찾아보자.
P&G는 2000년 식수 정화용 분말 '퓨어(PUR)'를 시장에 내놨다. 당시 전 세계에서 매년 300만명 이상이 비위생적 환경으로 죽어갈 때였다. P&G는 물을 정화함으로써 질병을 평균 50%에서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해 상품을 개발했다. 식수 정화 사업으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래 소득증대가 예상되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P&G는 프로젝트에 모두 2000만 달러를 투입했다. 한 봉지에 10센트라는 저렴한 가격에 10ℓ의 물을 정화할 수 있는 획기적 제품이었기 때문에 기대도 컸다.
하지만 P&G는 2003년 하반기 퓨어 프로젝트의 실패를 선언했다. 원인은 뭘까. 그것은 P&G가 최저소득계층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싸고 좋은 제품이면 당연히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일반 소비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우선 최저소득계층은 무언가를 '돈을 주고 사야 한다'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또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도 자각하지 못했다.
한 아프리카 여성이 퓨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보자.우선 그녀에게는 '박테리아' '위생' 등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정보와 지식이 필요하다. 그런 것 없이는 퓨어라는 제품이 왜 필요한지,왜 구매해야 하는지 생각할 수가 없다. 또 퓨어로 '정화한 물'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물과 색깔,맛이 다르기 때문에 '적응'이 필요하다. 여기에 10센트라는 돈도 장벽이었다. 작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돈은 자녀에게 콜라를 사주는 데 보탠다면 훨씬 요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돈이었다. 즉 퓨어를 사려면 자녀의 콜라를 희생해야 했다. 이런 장애물들이 퓨어의 성공을 가로막았다.
결국 P&G는 2004년 이후 퓨어 프로젝트를 일종의 '자선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그 결과 지금은 70개의 파트너들이 50여개의 시장에서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퓨어를 제공하고 있다. 퓨어 프로젝트는 상업적으로는 실패했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으로서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고 있는 셈이다.
미시간대 경제학 교수인 C.K 프라할라드(Prahalad)는 최저소득계층을 빙산의 아랫부분에 비유했다. 보이지 않는 큰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 최저소득계층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뛰어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시장에는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
조미나 상무 · 윤혜임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