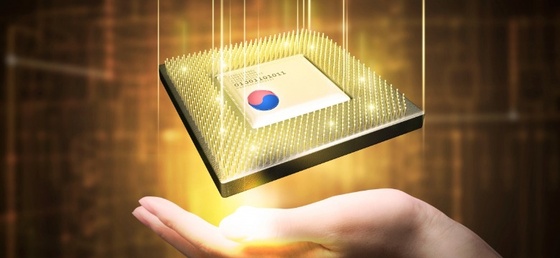[취재여록] 전기차 보조금 딜레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업계의 사정은 절박하다.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전기차를 구매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란 게 기업들의 걱정이다. 예컨대 CT&T가 만든 경차 크기의 'e-존' 판매 가격은 2150만원(리튬이온배터리 탑재)에 달한다. 비슷한 사양의 경차는 가격이 1000만원가량에 불과하다. 차액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정부가 대줘야 초기 수요의 불씨를 지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올림픽대로에도 못 들어가는 차에 보조금을 줄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작년 하반기 '2011년 전기차 양산'을 발표할 정도로 적극적이던 정부가 NEV 보조금 지급에 대해 부정적인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대책없이 보급만 확대했다가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게 정부의 속내다.
쉽게 상상해볼 수 있는 문제는 NEV 운전자들을 위한 도로 표지판이 없다는 점이다. NEV는 시속 60㎞ 이하 도로에서만 운행할 수 있는데,운전자들이 충분히 도로 정보를 숙지하지 않고 그 이상의 속도로 달려야 하는 도로에 잘못 진입했을 경우 교통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아파트에 충전 시설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뚜렷한 실체도 없이 전기차라는 이름 석자만 내건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는 것 역시 정부로선 골칫거리다.
어쨌든 막대한 돈을 들여 생산 라인을 만든 NEV 제조업체와 관련 부품업체들은 난감해졌다. CT&T 관계자는 "일본에 수출한 214만9000엔짜리 'e-존'에 대해 일본 정부는 77만엔의 보조금을 주고,미국에선 최대 4885달러를 지원해 주고 있다"며 "왜 우리만 결정을 못 내리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경부 얘기에도,업계 주장에도 나름의 일리는 있다. 하지만 저속 전기차 도로주행 허용이라는 주사위는 던져졌다. "전기차 보급을 위해 법규를 마련했으면 초기 시장 육성을 정부가 책임지는 게 일관된 정책일 것"이라는 업계 주장에 대한 답변은 정부 몫이다.
박동휘 산업부 기자 donghuip@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