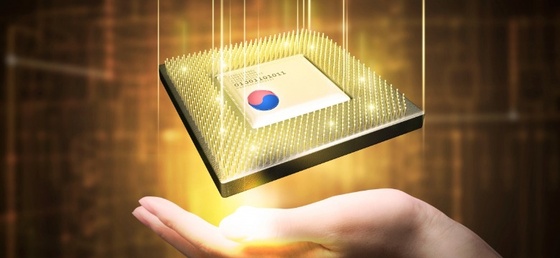佛경제, 부진속 선방하는 비결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미국뿐 아니라 유럽 경제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프랑스가 이웃 국가들보다 선방하는 이유는 뭘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 재정지출에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와 금융권의 대출 관행, 대기업의 업종 분산 등 과거 프랑스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았던 특성들이 이제는 경기가 이웃 국가보다 크게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충격 흡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프랑스는 13일 발표될 2008년 4·4분기 유로존 및 유럽연합(EU)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서도 경기침체에 진입하진 않았을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의 4분기 GDP 증가율은 -1%를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앞서 3분기에 0.1% 성장률을 보였기 때문에 통상 GDP가 2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 침체로 진단하는 기준에 따르면 프랑스는 아직 경기침체에 진입하지 않은 상태다.
이는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이웃 유럽국가들이 경기침체로 고전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선방'하는 수준이다.
물론 올해 1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1분기 성장률이 나오는 2분기초에나 프랑스의 경기침체 진입이 공식화될 예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프랑스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를 넘는 위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는 독일이나 영국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프랑스가 독일이나 일본처럼 수출에 의존도가 높지 않으며, 공공부문의 역할이 큰 경제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브뤼셀 소재 싱크탱크인 브뤼겔연구소의 니콜라 베롱은 "프랑스는 자체적인 문제는 크지 않다"라면서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특화된 부문이 없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됐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07년 프랑스는 국민 1천명중 91명이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갖고 있어 49명인 독일에 비해 고용시장의 정부 의존도가 높았다.
같은 해 재정지출도 GDP의 52.4%로 영국 44.4%나 미국 37.4%보다 월등히 높았다.
경제전문가들은 수년간 프랑스의 강력한 규제와 큰 공공부문 의존도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라고 비난해왔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프랑스의 평균 성장률은 1.9%에 불과해 영국의 2.7%에 크게 못 미쳤다.
통상 정부는 경기침체기에 신속하게 감원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프랑스는 요즘 같은 불황에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을 다소 억제할 수 있는 셈이다.
또 프랑스의 은행들이 다른 나라보다 대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점이나 은행부터 제약까지 대기업이 여러 업종에 분산돼 있다는 점도 경기침체로 인한 타격을 줄이는 요인이다.
하지만, 반면에 경제가 회복돼 호황기로 접어들면 프랑스는 또다시 저성장의 패턴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바클레이즈캐피털의 이코노미스트인 로런스 분은 "프랑스는 수출 회복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될 것"이라면서 "프랑스 모델이 더 좋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뉴욕연합뉴스) 김지훈 특파원 hoonkim@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