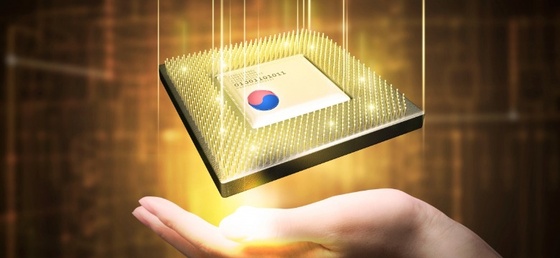구태 못버린 국회…'그들만의 싸움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30일 밤 8시40분 여야의 법안처리 최종협상이 결렬됐다.
기다렸다는 듯이 김형오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일순 국회 주변은 전운에 휩싸였고, 국회 정문을 제외한 모든 출입구는 봉쇄됐다.
말그대로 국회가 '그들만의 싸움터'로 변했다.
본회의장에서 6일째 농성중인 민주당 의원들은 등산용 로프와 고리를 허리에 차고 '인간사슬'을 연출하고 있다.
그런 그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고 이른바 '쟁점법안'을 처리하려는 여권의 수싸움은 불을 뿜는다.
무자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까지 끊없는 추태의 늪으로 빠져든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172석이라는 `공룡 여당'인 한나라당도, 10년 집권 경험을 자랑하는 민주당도 난국을 헤쳐나갈 지혜를 발휘할 의지나 지도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이 왜 스스로 나락에 빠져들려고 하는 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서로를 향해 '좌파 10년의 꿈에서 깨어나라', '민간독재의 길을 가려하느냐'고 삿대질하는 그들에게 정파적 이익만 있을 뿐 '국민'은 안중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에게 내년이야말로 자신들의 국정운영을 승부짓는 결정적인 순간이다.
전광석화처럼 경제살리기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올해 반드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안 정비가 필수적이라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그러자면 여의도가 속도전을 펼쳐야 한다.
그래서 '지휘통제권이 여의도 밖에 있다'는 말이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내에서도 회자되고 있다.
눈치를 보는 듯한 원내사령탑은 당내에서조차 확실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다.
정치 컨설팅업체인 포스 커뮤니케이션 이경현 대표는 "여당의 경우 청와대와의 관계가 종속적으로 고착돼있는 상태에서 자율적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홍 원내대표가 미디어법안의 '2월 협의처리' 제안이 의원총회에서 강력히 비판받은 것이 좋은 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나라당은 여론의 따가운 질시를 의식한 나머지 직권상정을 놓고 국회의장을 '무책임한 담임선생'으로 몰아붙였다.
한나라당 출신인 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한 아쉬움도 제기되고 있다.
여야가 `벼랑끝 대치'를 하고 있는 여의도를 떠나 지역구가 있는 부산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많다.
야당의 전략에 대한 질책도 만만치않다.
민주당은 "`MB악법'이 통과될 경우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야당에 불리한 주변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같은 결기에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기본 원칙은 묻혀버리고 말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특히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의 강경대치 이후 당 지지율이 다소 상승한 데 힘 입어 민주당 지도부는 강경 대응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여권에게 핍박받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여론을 감정적으로 자극하려는 속내도 들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이 한나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을 때 난장판이 된 본회의장의 모습이 17대 총선에서 소수당이던 열린우리당을 일약 제1당으로 만들었던 기억과 무관치 않다는 것.
정치컨설팅업체인 `민기획'의 박성민 대표는 "결사항전을 통해 지지세력 결집을 유도하려는 계산을 해야 하는 등 민주당 당내 사정도 여권과 만만치 않다"면서 "정치권 내부의 정치력 부재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 실종된 국회에는 이제 구태와 무책임의 경연만이 남게됐다는 얘기다.
정치권은 그러면서도 '최후의 결투' 이후를 내다보고 있다.
1월초 대통령 신년연설과 국정장악, 4월 재보선과 이후 내후년 지방선거 등을 염두에 둔 치열한 수싸움에 여념이 없다.
그럴수록 정치권은 다시 또 국민을 버리려하고 있고, 그런 정치권을 보는 국민들만 안쓰러워지는 국면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lwt@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