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제학계 "美 구제금융안 본질적 결함"
23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경제학계는 구제의 필요성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재무부가 내놓은 구제책에는 본질적인 결함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더글러스 엘멘도프 연구원은 정부의 구제방침을 환영하지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시간을 갖지 않은 채 재무부가 매우 빨리 조치에 나선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러한 우려의 기저에는 월가(街) 출신인 헨리 폴슨 재무장관에게 온전히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백지수표를 건네는 데 대한 불안이 깔려 있다.
모두가 패자(敗者)로 전락할 금융붕괴란 대참사를 모면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국민들에게 모든 고통을 전가하려 들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결국 사태의 원흉인 월가의 이익만 반영하는 결과를 피하려면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업체들이 향후 회생했을 때 납세자들이 확실한 이득을 볼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지적이다.
현재 폴슨 장관은 사들인 부실자산을 나중 경제가 회복됐을 때 되팔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경제학자들은 1990년대 금융위기를 겪은 스웨덴처럼 해당 금융기관의 지분을 확보하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금융붕괴는 은행뿐 아니라 보통 미국인들마저 파멸시킬 것이라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 구제금융안 통과를 요구한 폴슨 장관의 문제 접근방식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딘 베이커 경제정책연구센터 이사는 "부시 행정부는 이번 사태 예방에 완전히 실패하고 거의 모든 문제에 잘못된 결정을 내린 헨리 폴슨의 손에 7천억달러 규모의 백지수표를 쥐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미국 카네기멜론 대학의 앨런 멜처 교수는 "이건 공익이 아닌 사익에 부합하는 뭔가를 시도하기 위한 겁주기 전술"이라면서 이런 행동은 '최악'의 부류에 속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폴슨 장관이 수주 전 금융위기가 진정됐다고 주장해 시장의 신뢰를 잃은 것도 문제다.
일부는 이를 시장의 패닉을 막기 위한 선의의 노력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공적 발언이 정책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경우 사람들은 이 사람의 말을 믿지 않게 된다"고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빈센트 라인하르트 교수는 지적했다.
구제금융안에 금융기관 경영자와 주주들에 대한 제재가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딘 베이커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이사는 "이는 절대적으로 징벌적 성격을 띠어야 한다.
(구제안은) 회사와 경영진의 배를 불리는 수단이 아니라 이들이 업계에 남아 금융체계가 붕괴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기관 부실자산의 적정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느냐는 것도 문제다.
이번 사태의 원흉으로 지목되는 금융 파생상품들은 수백만건의 모기지를 한데 묶은 뒤 다시 잘게 잘라 파는 방식으로 구성돼 위험성이나 정확한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들이려는 사람도 없어 작금의 유동성 부족의 주범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가치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들은 해당 자산의 가격을 올려 잡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시장가격으로는 재무부에 자산을 넘기지 않으려 들 가능성이 높다.
결국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프리미엄을 얹어 줘야 매매가 성립되지만, 이는 금융기관들에 혈세를 퍼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것이 경제학계의 지적이다.
마틴 베일리 전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은 "이는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으로 "본질적으로 돈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hwangch@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ECB, 2019년 이후 첫 0.25%P 금리인하…美 Fed도 낮출까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6956532.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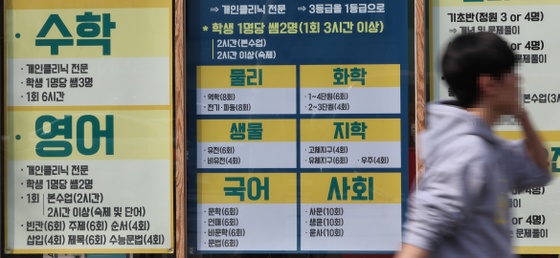

![엔비디아 첫 시총 3조 달러…애플 5개월 만에 3위로 추락 [글로벌마켓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B2024031607295542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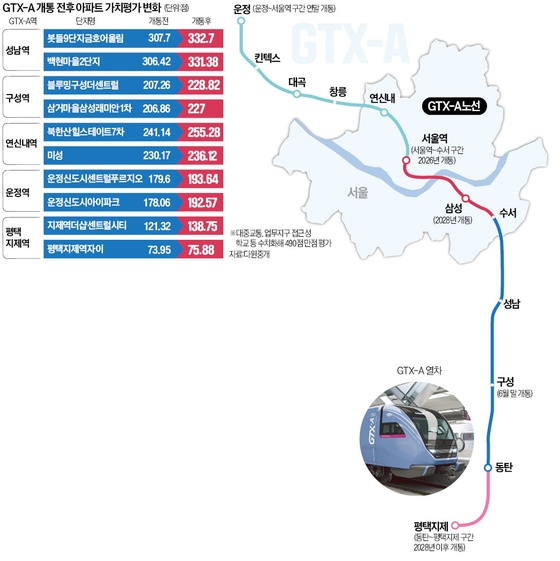







![[이 아침의 발레리노] 중력을 거스른 몸짓…발레를 해방시키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531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