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세계] 50代부터 '사전증여' 로드맵 미리 짜세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상속을 염두에 둔 것들이다.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해지고 부동산 시장은 각종 규제로 침체의 늪에서 빠져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부자들 사이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보다 세금이나 아껴 재산 지키기에 집중하는 게 낫겠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서다.
부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 사이에서도 상속세에 대한 관심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일선 PB팀장들은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상속세 납부 문제는 더 이상 부자들에게만 국한한 문제가 아닌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일반 서민들도 평소에 상속세 절세 방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상속세 절감 대원칙은'사전 증여'
상속세는 과세표준이 얼마인가에 따라 내야 할 금액이 달라진다.
당연히 물려받은 재산이 많을수록 적용받는 세율도 커진다.
그렇다면 상속세를 한푼이라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사전 증여다.
사망 시점에 보유할 재산을 줄여놔 사망하고 난 이후에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50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한 자산가가 자식들에게 사전에 재산을 증여해 놓지 않고 사망했다고 가정하면,자식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재산공제 10억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절반이나 된다.
그렇지만 전체 재산 가운데 20억원을 사망 이전에 미리 증여를 해놨다면,공제 혜택을 고려하면 세율이 40%로 줄어든다.
하지만 사전 증여가 항상 바람직한 절세 방법인 것만은 아니다.
사전 증여를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것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해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예로 든 자산가가 20억원을 사망하기 3년 전에 자녀에게 증여했다면,사전 증여 액수에 상관없이 5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사전 증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망하기 10년 이전부터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여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이런 이유 때문에 요즘 부자들 가운데는 비교적 젊다고 할 수 있는 50대 때부터 미리 미리 재산을 자식들에게 증여하는 사람들이 많다.
◆돈보다는 현물로 증여하는 게 유리
불치병을 선고받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부자들 가운데도 사망하기 전에 미리 재산을 증여해 놓으려는 사람들이 꽤 있다.
이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모두 현금화해 증여하면 어차피 사전 증여에 따른 이익을 보지 못한다.
그렇지만 부동산이나 주식 미술품 등 현물자산으로 증여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게 아니라 증여세 납부 신고 당시의 기준시가를 또는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한다.
통상 기준시가의 경우 시가 대비 30~70%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요즘에는 미술품이 재테크의 '틈새'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는데,그 이유 가운데는 증여나 상속에 유리하다는 점도 포함돼 있다.
미술품의 경우 부동산과 달리 사고 팔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1990년 세법에 서화 및 골동품에 대한 양도세 과세 제도를 도입했지만 미술시장 위축을 우려한 미술계의 반대로 입법 이후 13년 동안 유예를 거듭하다 2003년 세법 개정 때 아예 과세 근거를 삭제해 버렸다.
또 미술품은 토지나 건물이 아니어서 재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 세법에서는 미술품도 가치를 평가해 세금을 매기도록 돼 있지만 실제 신고 과정에서 누락하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 편법적인 절세 방식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상속에 대한 인식 전환 절실
일선 PB팀장들은 "사전 증여에 대한 부자들의 인식이 지나치게 안좋은 게 상속 세테크의 가장 큰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주면 늙어서 대접을 못 받는다'는 인식이 부자들 사이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지름길'인 사전 증여에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별다른 준비 없이 부모가 사망해 상속세만 수십억~수백억원씩 내야 할 경우 남겨진 자식들 입장에서 그것만큼 난감한 일도 없다.
김재한 국민은행 평촌PB센터장은 "선진국의 경우 10여년에 걸쳐 상속계획을 수립,시행해 자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게 일반화돼 있다"며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한국도 이런 방향으로 문화를 바꿔 나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 도움말=황재규 신한은행 PB그룹 세무사 >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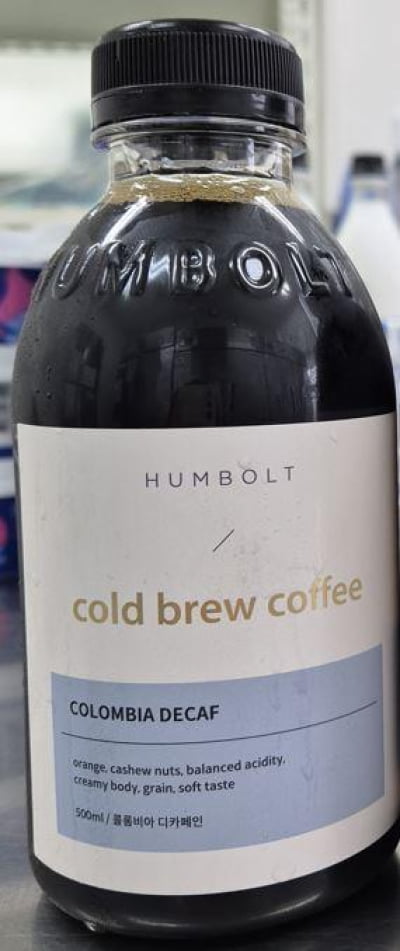
!["고량주 별론데 이건 맛있네"…판다 내세운 中 하이볼 반응이 [현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034424.3.jpg)











![[신간] 이더리움의 탄생 비화…'이더리움 억만장자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ZK.3704147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