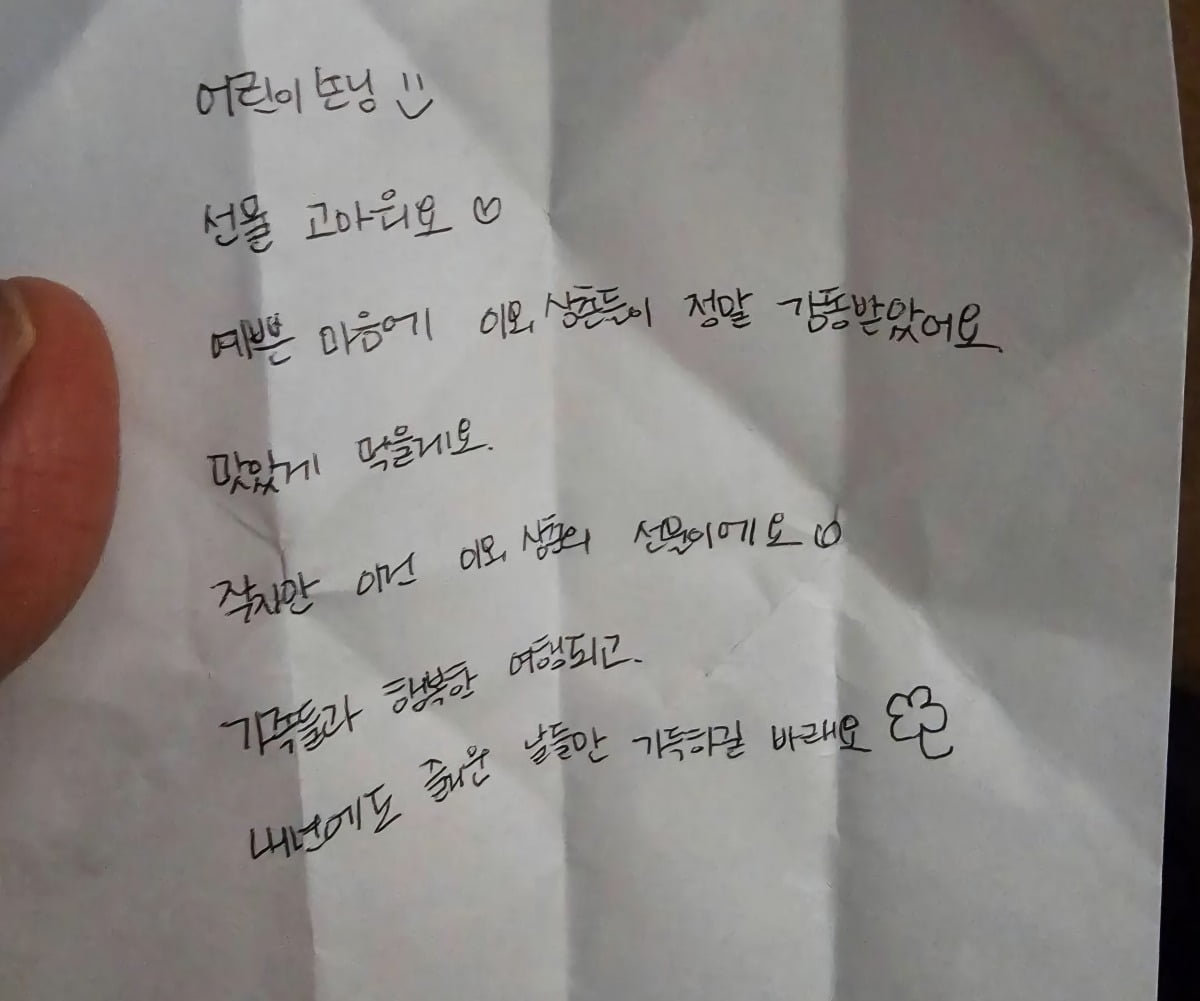파이낸셜타임스(FT)는 26일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는 데도 배출권을 매매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에 비리와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선 어떤 기업이 할당된 허용량을 초과해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그 초과량만큼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사들여 벌금과 같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기업들은 또 친환경 기술을 이용해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보다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그 차이만큼 온실가스 배출권을 획득할 수도 있다.
하지만 FT는 최근 들어 온실가스 감축 결과를 거짓으로 꾸며 거래권을 판매하는 행위나 배출권 매매 브로커들의 농간 등이 성행해 거래 시장이 신뢰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배출권 구매자들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실제로 확인하기 힘들다는 것도 문제다.
게다가 최근에는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전가하는 문제도 생겨나고 있다.
일례로 석유화학 기업인 듀폰의 경우 켄터키 지역 공장에서 온실가스의 일종인 HFC-23을 배출하고 있는데 소비자에게 t당 4달러를 처리 비용으로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처리에 드는 비용은 이보다 적어 그만큼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듀폰 측은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일부에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의 본뜻을 왜곡해 편법으로 배출권을 판매하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배출권 거래업체인 블루소스의 경우 땅 속에서 원유를 끌어올려 수익을 내는 한편 원유를 뽑아내 생긴 빈 공간엔 다시 온실가스를 채워넣는 방법으로 탄소 배출권을 획득하고 있다.
FT는 이 같은 방법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당국의 규제가 불가능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거래 시장 규모는 연일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으며 2010년까지는 지금의 두 배인 682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