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連休의 경제학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민족명절인 추석을 맞아 연휴에 들어간 직장이 많다. 조사에 따르면 4일을 쉬는 직장이 제일 많지만 특히 금년에는 같은 주에 하루 쉬고 하루 일하는 이른바 샌드위치 데이가 이틀이나 돼 6일을 쉬는 직장도 있으며 심지어 아예 한 주를 몽땅 쉬어 9일 연휴를 갖는 직장인도 있다고 한다.
요즘처럼 추석을 맞아 며칠씩 쉬는 관행은 근대화 과정의 부산물(副産物)이라 할 수 있다. 농업이 주 산업이고 가족들이 가깝게 모여 살던 1960년대만 해도 추석명절은 하루를 쉬었다. 그 때의 추석은 햅쌀로 밥을 짓고 송편을 빚어 조상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내고 가족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는 '휴식의 시간'이었다. 물론 다음 날로 일감이 널려있는 가을 들판으로 돌아가곤 했다. 그러다 1970년대 이후 근대화와 함께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일하는 가족들이 늘어남에 따라 추석은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는 '귀향의 시간'이라는 의미를 더 강하게 갖게 됐다. 이에 따라 먼 타지에서의 귀향 및 직장 복귀에 필요한 시간으로 인해 2∼3일씩 쉬게 된 것이다.
그러나 바쁘게 와서 성묘(省墓)하고 반가운 가족과의 재회도 잠깐이고 다시 직장으로 서둘러 떠나야 했던 산업화 시대의 추석연휴와 달리 요즘은 성묘는 미리 해놓고 연휴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떠나는 '레저의 시간'이라는 의미가 더 강해진 것 같다. 귀성길 고속도로는 한산한 반면 인천공항은 크게 붐빈다는 뉴스가 전혀 놀랍게 느껴지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외교부는 이번 추석연휴 동안 해외여행객이 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휴의 의미가 귀향 혹은 가족 재회에서 레저 쪽으로 바뀌어 간다면 추석연휴가 갖는 가치와 비용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사람은 언제 일하고 언제 놀고 싶어 하는가? 경제학은 여가(餘暇)의 가치와 여가 대신 일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소득의 가치를 비교함으로써 일과 여가의 선택이 이뤄진다고 가르친다. 예컨대 휴일과 휴일 사이의 샌드위치 데이에 일하는 경우 10만원을 버는데 그날 하루 쉬는 것에 대해 근로자가 15만원의 가치를 부여한다면 근로자는 일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즉 여가의 가치가 일함으로써 버는 소득의 가치보다 크다면 일하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소득의 가치가 여가의 가치보다 크다면 일을 할 것이다.
여가의 가치는 전통적으로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매우 높아진다. 가족끼리 시간을 갖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일하는 대신 휴가를 갖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추석휴가가 귀향에서 레저의 시간으로 바뀌고 있는 현실 및 주5일 근무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3일씩 연휴를 갖는 것은 여가의 가치보다 비용이 더 클 수가 있다. 추석이 있는 가을은 모든 산업에서 계절적으로 가장 바쁜 때이며 생산성 또한 가장 높은 때이다. 수출 납기도 맞춰야 하며 선선하고 비가 적은 때에 건설도 빠른 속도로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공휴일이 겹쳐 금년과 같은 경우 한 달의 실 근로일수가 17∼18일밖에 안된다면 그로 인한 국민 경제적 손실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봐도 일을 적게 하면 경제성장률은 낮아지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근로자의 날까지 합해 연간 16일로 선진국 평균에 비해 6일정도 많은 게 현실이다. 주 5일제를 전제로 할 때 법정공휴일로서의 추석연휴는 하루 줄이는 대신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추석이 목요일이라면 금요일까지 쉬고 금요일이라면 목요일부터 쉬면 주말을 합쳐 4일을 쉴 수 있다. 또 월요일이나 화요일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하면 된다. 귀성(歸省)이나 귀경(歸京)을 위해 추가적 시간이 필요하다면 다른 주말의 휴일을 당겨서 사용하는 방법을 택하면 된다.
사람은 누구나 휴일을 좋아한다. 다만 그것은 소득을 희생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므로 적절한 선택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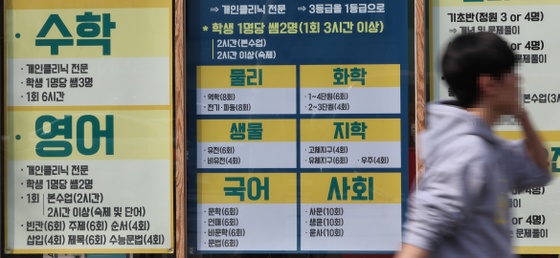

![고용보고서 앞두고 혼조 마감…엔비디아, 시총 3위로 밀려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4384444.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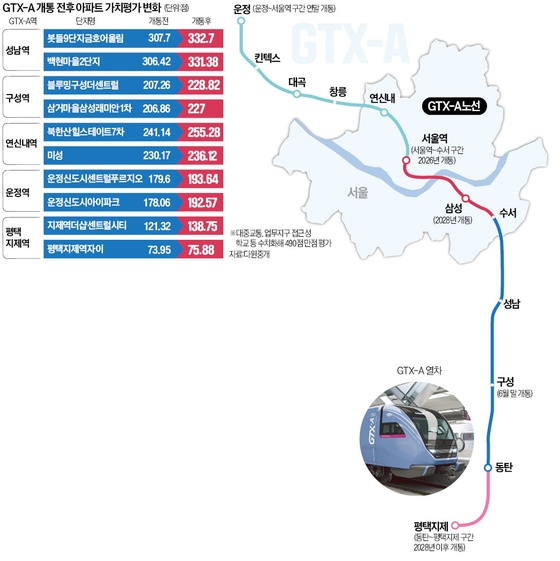







![[공연소식] 국립극단 창작 연극 '전기 없는 마을' 내달 초연](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ZK.3696118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