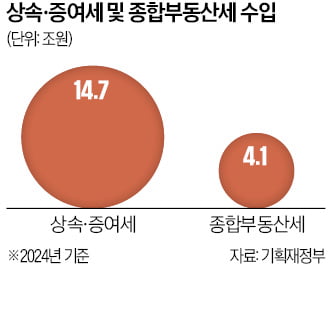한명숙 총리 인준과 정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의 불안을 야기할 불확실성이 해소된 셈이지만 여야간에는 여전히 `살얼음판'과 같은 냉랭함과 긴장감이 팽팽히 감돌고 있다.
물론 `여성적 리더십'을 슬로건으로 내건 한 총리체제의 등장은 여야간 대결과 갈등도 불사했던 이해찬(李海瓚) 총리 체제와는 달리 비교적 우호적 여야관계를 조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게 사실이다.
그러나 여야관계의 `순항'을 기대할 만큼 현 정국을 둘러싼 환경은 녹록지 않다.
당장 한나라당 공천비리 파문을 계기로 표면화된 비리의혹 폭로전은 `양날의 칼'처럼 여야의 목줄을 향해 치닫고 있고, 이 와중에 불거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공천비리 철저단속 지시는 `기름을 끼얹은 듯' 여야관계를 급속히 `결빙'시키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등장한 한 총리체제는 경색정국의 `종지부'가 아니라 오히려 여야간의 새로운 긴장관계를 조성하는 `시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다시말해 한 총리의 인준으로 내각의 틀이 완성된 것을 계기로 여야 모두 "진검승부는 이제부터"라며 새롭게 `구두끈'을 조이며 전면전에 대비하는 임전태세에 돌입한 형국이다.
이는 한 총리 인준이 최근의 폭로정국과 맞물려 중반전에 돌입한 지방선거 구도에 적지 않은 상황변화를 야기하고 있고, 이에 따라 종전과는 `수위'와 `강도'를 달리하는 새로운 대응전략이 요구된다는 여야의 상황인식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여당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자평하며 `득의양양'한 표정이다.
낮은 지지율과 불확실한 선거구도를 근본적으로 뒤엎을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게 우리당 스스로의 평가다.
특히 강금실(康錦實) 전 법무장관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출마에 이어 한명숙 총리 체제가 본격 출범함에 따라 그동안 별러온 `한.강(韓.康)' 라인을 선거전의 전면에 내세워 `돌풍효과'를 일으켜나갈 수 있다는게 우리당의 판단이다.
여풍(女風)이라는 시대적 조류를 활용해 선거판 분위기를 일신해보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여기에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독점해온 여성 정치인 프리미엄을 희석시킴으로써 얻는 반사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숨기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은 "여성총리 탄생을 높이 평가한다"고 환영의사를 표명하면서도 속내가 편치 않은 듯한 표정이다.
그렇찮아도 공천비리 파문으로 수세에 내몰려있는 상황에서 한 총리 인준마저 `선선히' 수용함으로써 정국 주도권을 여당에 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역력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처럼의 `호재'인 이번 인사청문회를 대여투쟁의 공간으로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 채 오히려 여당에 끌려다닌 듯하다는 내부의 비판도 나온다.
특히 `한.강'라인의 등장으로 `여풍'이 선거정국에 새 바람을 일으킬 경우 `오세훈 카드'로 승세를 잡아가던 서울시장 선거판도가 크게 뒤흔들릴 것이라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총리인준 만으로 여야 어느 일방의 우위구도가 형성됐다는 전망은섣부르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 견해다.
각종 돌출변수가 도사린 향후 정국의 기상도가 그야말로 시계제로의 형국이어서 여야는 잠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총리 인준이 마무리되면서 정국의 중심추는 공천비리 파문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여당의 공천비리 파문 공세로 코너에 몰린 한나라당은 18일 노 대통령의 공천비리 철저단속 지시를 문제삼아 "또다시 탄핵을 유도하는 것이냐"며 선거관리의 정치적 중립 논란을 제기, 여야간 긴장의 파고가 고조되고 있다.
여야간의 이전투구식 폭로전도 갈수록 기승을 부리면서 정국의 앞날을 더욱 흐릿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의 `경악할만한 비리' 발언 파동에서 드러났듯이 발을 헛디딜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살얼음판' 정국인 셈이다.
지방선거를 42일 앞두고 선거전의 한복판을 관통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은 끝이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어두운 터널'로 빨려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rhd@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