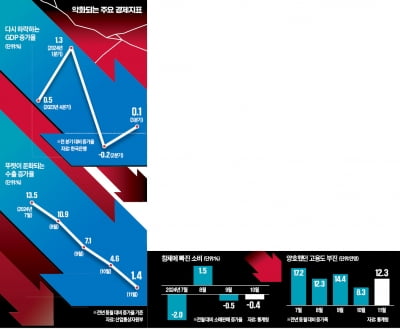2656억 들인 民軍겸용기술사업..기술료 수입은 고작 30억원 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과학기술부의 '10개 대형 국책연구사업 성과분석'은 한국형 R&D(연구개발)가 성공하기 위해선 기업체,학계,국책연구기관이 역할을 분담하면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기획 단계에서 '선택과 집중'전략으로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이 총동원된 사업들은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다.
최우수로 나타난 디스플레이사업(1995∼2001)의 경우 1994년 삼성 LG 현대 등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TFT-LCD 기술개발에 투자하던 상황에서 국가적 사업으로 전환,산·학·연의 역량을 집중시켜 큰 성과를 일궈냈다. 우수 평가를 받은 CDMA상용화사업(1989∼1996)도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가 시스템 기술개발을 맡고 장비 제조업체가 상용화,통신사업자가 현장시험을 맡는 등 역할분담 전략이 주효했다.
하지만 명확한 목표 없이 정부 부처별로 따로 진행된 사업들은 제대로 된 성과가 도출되지 못해 미흡 판정을 받았다. 군사용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하거나 민간기술을 군에서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민·군 겸용 기술사업(1999∼현재)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국방부가 각각 나서 추진함으로써 체계적 기획이 이뤄지지 못했고 목표도 뚜렷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6년간 2656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였음에도 지난해까지 개발된 기술은 120개에 불과하고 그나마 이전된 기술은 52개에 그쳤다. 특히 이전기술을 통한 매출액은 160억원에 지나지 않고 기술료 수입은 고작 30억원에 머물렀다. 민·군 겸용을 상징하는 '스타기술'이 부족했으며 민간이 보유한 기술의 군 적용이 미약했기 때문이라고 과기부는 분석했다.
환경공학기술 사업(1992∼2001)도 이 기술,저 기술 등 백화점식 지원으로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크노파크사업(1997∼현재)은 본래의 임무인 기업 지원 활동이 부족하며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문제점을 낳았다고 과기부는 지적했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