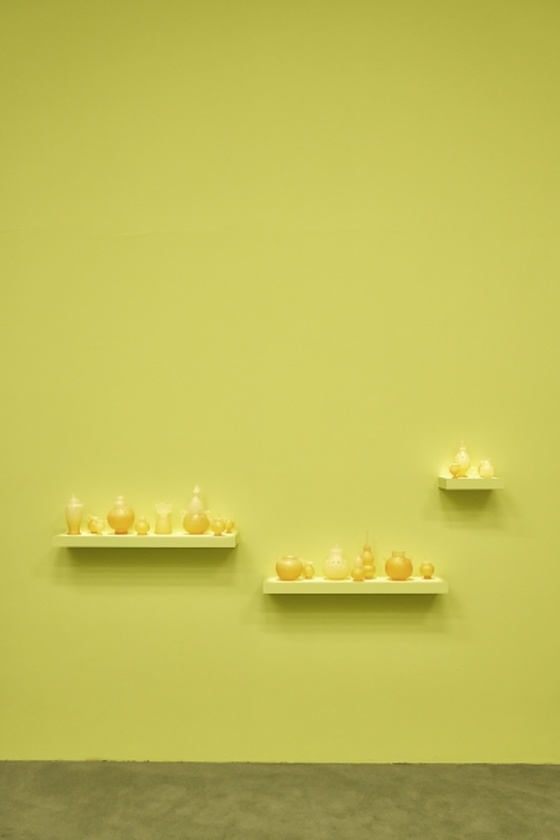현대그룹의 '마지막 가신(家臣)' 김윤규 현대아산 부회장(61)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김 부회장은 고 정주영 명예회장과 정몽헌 회장의 두터운 신임 아래 그동안 '왕자의 난'과 '숙부의 난' 등 갖은 역경에도 살아 남았었다.
하지만 대북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개인 비리는 그에게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그의 비리는 이미 지난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그룹측은 "대북사업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회장직은 유지시킬 방침"이라고 했지만 그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현대건설에 입사한 김 부회장은 정 명예회장의 의중을 꿰뚫고 추진력도 남달라 이사 시절인 1980년대 중반부터 정 명예회장의 총애를 받아 왔다.
상무 시절이던 1989년 정 명예회장이 최초로 방북,금강산 관광 의정서를 맺을 당시에도 정 명예회장을 수행했었다.
1998년 10월 현대건설 사장 자리에 오른 그는 1999년 2월 공식 출범한 현대아산의 대표이사 사장을 겸임하는 등 대북사업을 키워갔다.
2000년 김재수 당시 그룹구조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과 함께 '왕자의 난'을 일으킨 '가신 3인방'으로 지목됐던 그는 1년 뒤 현대건설의 유동성 위기에 책임을 지고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왕자의 난' 이후 현대그룹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대북사업의 수장으로서 그의 입지는 불변적이었다.
더욱이 자살한 정몽헌 회장이 김윤규 부회장에게 "명예회장님께는 당신이 누구보다 진실한 자식이었습니다.
명예회장님께서 원했던 대로 모든 대북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기 바랍니다"라는 유서를 남긴 이후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정몽헌 회장 사후 찾아온
KCC와의 경영권 분쟁에서도 그는 살아 남았다.

![[홍석환의 인사 잘하는 남자] 수명과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99.3264495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