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3:16
수정2006.04.09 17:10
그동안 그야말로 `만만디 행보'로 일관하던 중국당국이 21일 저녁 전격적으로 위안화 절상을 발표했다.
달러화가 급락하고,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도 `점진성'을 강조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하지만 이번 위안화 절상은 오랜 기간 진행돼온 중국과 국제사회의 줄다리기의 소산이다.
위안화 절상 가능성은 지난 2000년 하반기 중국 내부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다음해에 일본의 압력으로 절상설이 고조됐으나 2001년말 엔화의 급등으로 상황이 크게 바뀌자 수면아래로 잠복했다.
그러나 2002년 들어 달러가 급락하자 미국 무역적자의 주범으로 몰린 중국의 위안화 절상설이 다시 부상했다.
그리고 2003년 2월 파리에서 열린 선진7개국(G7) 재무장관 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이 협공해오자 위안화 문제는 국제금융계의 최대 화두가 돼버렸다.
특히 파리 G7 회동 이후로는 미국이 위안화 절상압력의 주도세력으로 부상하며 아시아 통화들이 동반 절상 압력에 놓이게 된다.
미 의회는 물론이고 행정부의 주요 요인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위안화 가치가 시장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며 중국 정부를 압박했다.
게다가 중국의 인근인 한국의 원화가 2003년 3월말 이후 2년여간 25% 가량 절상됐고, 일본의 엔화 가치도 15% 가량 상승한 것과 비교할 때 달러와에 고정(페그)된 위안화의 비정상적인 상황은 중국의 아킬레스건으로 전락했다.
결국 중국 당국이 더이상 시기를 놓치지 않는 시점을 선택해 국제경제계에 화답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국이 환율정책을 크게 바꾼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실제로 중국은 1994년 1월 이중환율제를 단일화하면서 공정환율을 일시에 달러당 5.77위안에서 8.72위안으로 상향한 바 있다.
한꺼번에 무려 45%나 절하한 경험이 있는 중국이다.
그래서 한동안 경제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안정성을 강조할 때 `1994년의 경험'을 제시하곤 했다.
(상하이=연합뉴스) 이우탁 특파원 lwt@yn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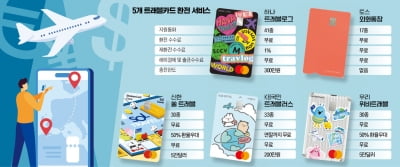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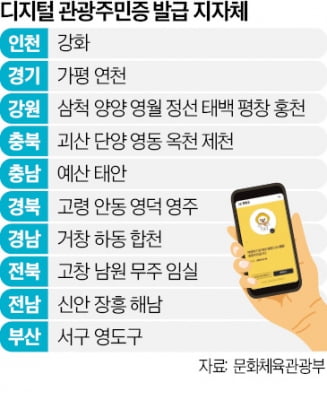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베네치아 비엔날레 섹션 인상 깊어](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05171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