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2:27
수정2006.04.03 02:29
법무부가 개인의 통화내역 보관기간을 현행보다 두배로 늘리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개인정보가 임의로 보관ㆍ유출될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통화기록 보관기간이 최장 1년까지 늘게 되면 데이터 저장장치를 구매, 유지하는 비용도 늘게 돼 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비용부담이 가중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28일 통신업계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이동통신과 시외전화 및 국제전화 기록은 12개월간 보관토록 하고, 시내전화 및 인터넷 로그 기록은 각각 6개월간 없애지 못하도록 했다.
이 법령이 발효되면 통신업체들은 통신일시와 통신 개시ㆍ종료시간, 통화 상대방 가입자 번호는 물론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단말기 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 자료 등을 1년간 보관하다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기존에는 통신업체가 각각의 이용약관에 따라 이동통신의 경우 6개월, 시내전화의 경우 3개월 동안 통화기록을 보관해 왔다.
통신업체들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이 발효되면 현행 약관을 삭제ㆍ개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에 따라 통신기록 보관기간을 늘일 계획이며 데이터 저장장치 등의 설비투자 증설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들은 통화기록 보존기간이 연장되면 개인정보가 임의로 보관ㆍ유출될 우려가 높아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함께 하는 시민행동' 김영홍 국장은 "정보통신부가 3월께부터 통화기록 보존기간을 최소 3개월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해온 것으로 안다"라며 "법무부는 오히려 수사 필요성을 내세워 이러한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개인정보는 보관될수록 국가나 수사기관의 접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며 이 경우 임의로 개인정보가 유출ㆍ사용될 우려도 동시에 증폭될 것"이라며 "1년 동안 통화기록이 보관되면 수사기관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도 자의적인 기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YMCA의 김희경 간사는 "통화기간을 늘리려면 통화내역을 담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비용도 두배로 늘어야 할 것"이라며 "이 경우 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이 돌아갈 가능성도 동시에 높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간사는 특히 "법무부가 발표한 개정안은 개인을 잠정적인 범법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두배로 늘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라며 "실제로 통화내역이 수사 자료로서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만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과정에서 통신 서비스 가입자를 포함한 소비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신유리기자 newglass@yn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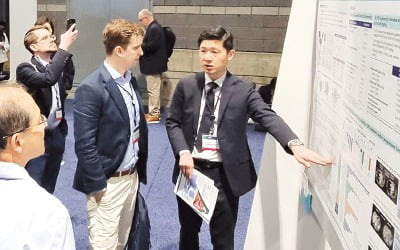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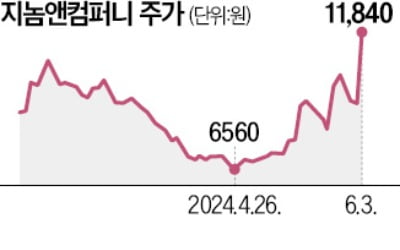











![[단독] 홈플러스, 슈퍼마켓 사업 부문 매각한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22731.3.jpg)
![[오늘의 arte] 예술인 QUIZ : 가택 연금됐던 러시아의 '反푸틴' 감독](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2036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