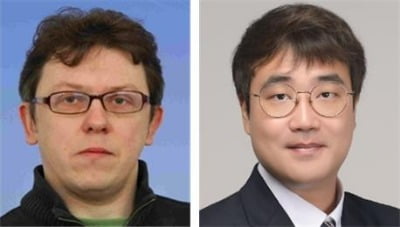[신성장동력 지역에서 찾는다] (전문가제언) "현 정책, 미인만 찾는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과거 개발연대에 전략적으로 선택됐던 산업도시들이 팽창을 거듭해 지금은 지역 거점도시화했으나 성장 속도 둔화와 산업수명 주기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지방 거점도시들은 각종 인프라 등이 상당히 갖춰져있는 데다 도시 중산층이 몰려 살고 있는 곳들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을 재생시키는 것은 '투자 대비 효율'이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민생' 차원에서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정치권과 정책당국은 조강지처는 버려둔 채 새로운 곳과 새로운 미인만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행정도시에서 기업도시에 이르기까지 과거 방식을 되풀이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산업화 초기에 시·도지역 소득 1위로 한국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던 부산이 80년대 이후 정체를 거듭하고 있는 생생한 경험을 하면서도 새로운 기업도시 건설을 모색하는 것은 '난센스'다.
기존 도시의 이미 이뤄진 '저력'을 바탕으로 지역 거점을 확충하는 일은 별로 생색이 나지 않는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이나 단기 실적에 연연해하는 정책당국은 '신도시'나 '특별지구' 조성에 매력을 느낄 것이다.
행정도시든 기업도시든 새로 계획하고 개발 청사진을 제시한 뒤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신나는 일이고 정치적인 효과도 클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난 30여년 동안 애써 가꿔놓은 기존 산업도시들이 더 빨리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세계 일류의 운동화를 만드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던 부산의 신발제조업이 이렇게 빨리 쇠퇴해버린 것은 정책당국이 일찌감치 신발산업을 '사양산업'으로 치부해버린 탓도 크다.
부산 대구 광주 같은 도시들은 결코 일조일석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사람의 건강도 예방적 차원의 체질 개선이 최선의 방책이듯이 지역정책도 마찬가지다.
또 하나 지적할 점은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맹목적 믿음이다.
지역 발전을 공업화,산업화와 동일시하는 관념은 과거의 경우 타당성이 있었다.
그러나 이미 도시화 수준이 세계 최고에 달한 한국이 전 국토의 도시화를 초래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인가는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지역을 살기 좋게,또 편리하게 만드는 것과 도시화하는 것은 동일 개념이 아니다.
산업정책이나 지역정책이 시대를 앞서가지 못하고 민원에 뒤따라가는 것은 21세기형 리더십으로는 부적절하다.
'서울과 그 이외의 사막'과 같은 한국의 상황에서 또 다른 사막지역을 만들기 전에 이미 개발되고 투자됐으나 조만간 산업 구조 전환을 피할 수 없는 지방 도시들을 구조 고도화를 통해 신거점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