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7:31
수정2006.04.02 17:35
박정희 정권이 일본으로부터 '청구권 자금'을받아 피징용.징병자중에서도 부상자 등을 제외한 사망자에 대해서만 보상을 실시한배경은 무엇일까? 박 정권은 한일협정 체결 5년 후인 1971년 1월19일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을 제정, 일제에 의해 징용.징병된 사람중 사망자와 일제 당시 예금.채권.보험금 등 재산권을 소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상신청을 받았다.
박 정권은 이를 바탕으로 1974년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뒤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 중 무상자금 3억달러를 활용, 사망자 8천552명에 대해 1인당 30만원씩, 총 25억6천560만원을 지급했다.
30만원은 보상 당시 군민 및 대간첩 작전 지원중 사망한 향토예비군에게 지급하는 일시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징용 및 징병으로 피해를 입은 상당수의 생존자는 물론 부상자도 정작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박 정권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을 개별적인 청구권에 대한 보상이라기 보다는 '대한민국 및 국민 전체에 대한 보상성격의 자금'으로규정했던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보상대상에서 생존자가 제외된 것은 우리 민족 전체가 일제 36년간의 식민지 지배 피해자라는 점과 청구권 자금의 성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이뤄진 조치였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를 감안해 보상 관련 법률을 통해 청구권 자금이 국민경제의 자주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에 사용되도록 기본방향이 설정됐고 이에 따라 자금 중 극히 일부만 민간보상에 사용됐다는 것이다.
또 생존자를 보상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독립운동가와 수탈농민 등과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오랜 시간이 경과돼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확인이 곤란했을것이라는 설명도 정부는 곁들이고 있다.
그러나 박 정권은 한일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 당시 생존자와 부상자까지도 대일청구권에 포함시켰으면서도 정작 보상에서는 이들을 제외시켜 현재까지도 비판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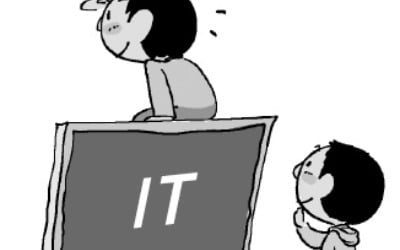
![[속보] 당정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 전향적 검토"](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050806.3.jpg)
![[속보] 당정, 6·24∼9·6 전력수급대책기간 지정…상황실 운영키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6567906.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