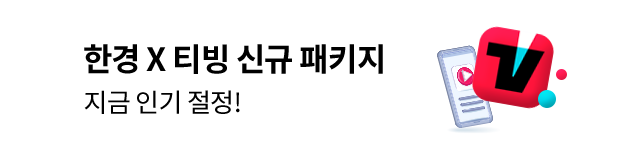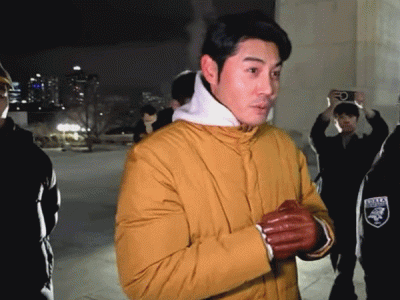"요즈음 돈 있는 사람들은 모임 성격을 가려서 옷을 입습니다. 같은 계층이 모이는 극소수의 자리에만 이른바 수입명품을 걸치고 나가고,그렇지 않은 자리엔 일부러 국산을 입고 갑니다."
서울 강남 청담동에서 프랑스제 고급 만년필과 핸드백 등을 수입하는 신기태 사장이 전하는 강남의 분위기다. 신 사장은 "최상위 계층마저 돈이 궁해 명품을 못 사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명품 구매 위축은 주로 최근 몇 년새 우리사회에 형성된 이른바 '가진 자에 대한 질시' 분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남 논현동에서 명품매장 인테리어를 하는 이동운 사장은 "일부 시민단체는 강남 명품시장이 풀이 죽은 것을 두고 '호화 사치 분위기가 사라지니 좋은 것 아니냐'는 식으로 풀이하지만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비난조로 말했다.
이 사장은 "최상위 계층이 구매를 자제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국내의 눈총을 피해 해외골프 등을 나가 면세점이나 현지 명품점에서 쇼핑을 한다"면서 "사회적 분위기로 강남시장이 죽는 만큼 돈이 밖으로 나간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때 파리나 밀라노 등 명품 본산지에서 서울(강남)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됐지만 최근 들어선 '미운 오리 새끼'로 취급당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탈리아에서 1백만~1백50만원대 패션시계와 액세서리를 수입·판매하고 있는 이희경 사장은 "이웃 일본의 경우 경제가 되살아나면서 명품시장이 다시 급신장하고 있고,중국 시장은 상하이를 중심으로 비약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동아시아에서 서울(강남) 명품시장만 '역신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명품 중에서도 상위 최고급 브랜드를 20여개로 잡을 때 루이비통 샤넬 버버리 프라다 페라가모 등 5~6개 정도를 제외하곤 대부분 작년에 비해 20~30%씩,많게는 절반까지 매출이 준 브랜드도 있다"고 전했다.
세계적인 명품 베르사체도 유명 백화점에서 철수하는 등 강남에선 '크리스마스 때까지 시장경색이 풀리지 않으면 줄줄이 철수하는 사태가 우려된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강남 청담동 일대 고급(럭셔리) 레스토랑가도 마찬가지다.
갤러리아 백화점 뒤편에서 이탈리아 음식점을 운영하는 최모 사장은 "강남에 살면서 이탈리아 음식을 제대로 즐기는 최상위 고객 10%는 여전하지만 문제는 그 아래 계층이 지갑을 완전히 닫았다"면서 "주중 매출이 작년 3분의 1 수준으로 급락했고 주말 매출만으로 버티기엔 역부족"이라고 하소연했다.
최 사장은 "청담동에서 이른바 럭셔리 레스토랑(평균객단가 5만원 이상)으로 꼽히는 상위 20여개 중 5개 정도만 버티고 나머진 적자라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은 물론 중국에서도 고급 패션·음식·차 등 럭셔리 소비시장이 첨단산업의 하나로 인식되는 데 반해 한국에선 최근 들어 떳떳하지 못한 장사로 취급당한다"면서 "이는 우리 경제가 '업그레이드'하는 데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 글자크기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글자행간
-
- 1단계
- 2단계
- 3단계
공유하기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