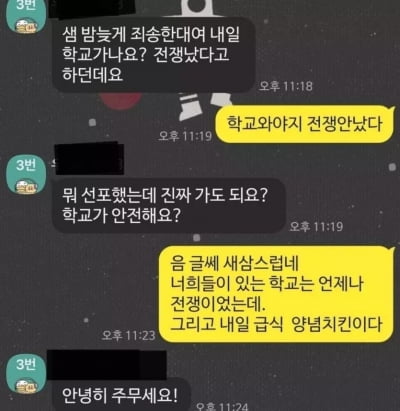"대우 前임원들 주가손실 배상하라" ‥ 법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분식회계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전 대우그룹 임원진에게 투자손실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 제기된 위헌심판이 작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됨에 따라 각급 법원이 보류했던 심리를 재개한 후 나온 첫 판결이어서 '대우그룹 분식회계 손배소' 선고가 향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개인투자자 등이 승소하더라도 대우그룹의 전직 경영진들이 2심까지 24조원이 넘는 추징금을 선고받아 사실상 '추징 불능' 상태에 놓여 있어 피해회복의 실제 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헌 부장판사)는 30일 개인투자자 이모씨가 '분식회계 사실을 모르고 대우 주식에 손댔다가 손해를 봤다'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임원 3명과 대우중공업ㆍ대우조선해양ㆍ대우종합기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전 회장 등 임원과 대우중공업은 9천7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 등의 책임범위는 97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된 98년 3월31일부터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사실이 세간에 알려진 99년 10월28일까지 취득된 주식에 한정한다"며 "배상액은 이 기간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와 처분가의 차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속보] 서울교통공사·1노조, 파업 3시간여 앞두고 협상 타결](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855605.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