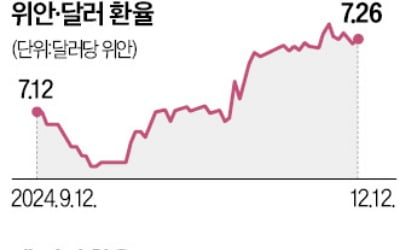[월드투데이] '적대적 M&A' 다시 거세지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The Economist 본사 독점전재 ]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오라클이 최근 피플소프트에 대한 적대적 M&A를 선언한지 몇주만에 캐나다 알루미늄 회사 알칸이 프랑스의 경쟁사 페생니를 향해 비슷한 선전포고를 했다.
전세계 M&A는 90년대 후반 한창 활기를 띠다가 이후 감소세로 반전,올해 상반기 성사된 계약은 90년대 중반 수준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올 상반기 유럽의 적대적 M&A는 알칸과 페셍니를 포함,14건으로 이미 지난 한햇동안 공개된 13건을 넘어섰다.
알칸은 3년 전에도 스위스 알그룹과 프랑스 페셍니를 한꺼번에 흡수하는 M&A를 시도했지만 당시엔 알그룹만 인수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3각 M&A를 허가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페셍니 인수에 성공하기까지는 브뤼셀 경쟁위원회,외국인에게 시장을 내주기 싫어하기로 유명한 프랑스 정치인들의 까다로운 정밀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미국에서도 오라클 외에 자동차 부품회사 아빈메리터가 최근 다나그룹을 인수하겠다고 선언,80년대 유행했던 적대적 M&A가 다시 거세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적대적 M&A에 대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것으로 따지면 미국이 유럽보다 덜하지 않다.
80년대 적대적 M&A가 봇물처럼 일어났을 때 대법원 및 많은 주 정부들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책을 잇따라 법제화했기 때문이다.
유명한 것이 극약 처방(poison pills)과 시차임기제(staggered board)다.
극약 처방은 인수희망자가 대상 기업 주식을 일정량 이상 매집할 경우 대상 기업이 주식을 대량 발행해 물타기를 함으로써 적대적 M&A를 저지하는 방법이고,시차임기제는 인수자가 이사진을 한꺼번에 교체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단기간내 경영권 장악을 막는 것이다.
미국 기관투자가서비스(ISS)가 감독하는 5천5백29개 상장사 중 극약 처방을 도입한 곳이 3분의1 이상,시차임기제를 준비해놓고 있는 회사는 절반을 넘는다.
이론적으로 이런 방법들은 무모한 인수합병을 저지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진짜 목적은 현재 경영진의 자리 보전에 있었다.
실제로 90년대 여러 건의 대형 합병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인수자가 피인수기업 경영진 몫으로 거액을 떼어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90년대엔 이런 식의 '퍼주기'가 너무 과도했고,그 부작용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
주주와 법원은 경영권 방어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최근 휴렛팩커드와 에너지 회사 엘파소는 주주들의 요구에 못 이겨 극약처방을 폐기했다.
엘파소는 '적정 가격'을 결정할 때 주주 대다수의 컨센서스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도 없앨 예정이다.
미시간주 상원은 사이먼의 인수 시도를 막아 달라는 쇼핑몰 업체 타우만 센터의 요청을 거부했다. 대다수 주주가 적대적 인수합병에 찬성한 이상 '토착기업'을 살리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적대적 M&A가 인기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주주들은 적어도 M&A과정에서 어느 때보다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정리=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
--------------------------------------------------------------
◇이 글은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인터넷판에 8일 실린 'Tough measures for tough times'를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