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9:54
수정2006.04.03 09:56
북한이 10일 탈퇴를 선언한 핵확산금지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NPT)은 핵무기의 확산을 막고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미국과 구 소련이 토대를 마련, 유엔총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70년 3월5일 발효된 국제조약이다.
이 조약의 주된 목적은 핵보유국(미.중.러.프.영 등 5개국)이 핵무기 및 그 관련 장비와 기술을 핵비보유국에 이양하는 것과 핵비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지난해 2월 현재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 쿠바 등을 제외하고 한국(75년4월23일 가입), 북한(85년12월12일 가입) 등을 포함해 전세계 187개국이 가입해 있다.
NPT는 핵무기확산금지 원칙의 이행 여부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3조4항에 조약의 최초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안전조치협정(safeguards agreement)을 체결, 발효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85년 12월 구 소련의 설득 결과 NPT에 가입한 북한은 92년 1월30일 IAEA와전면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고 IAEA의 사찰을 받았지만 IAEA가 북한의 핵개발 실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93년 3월12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중앙인민위원회 제9기 7차 회의를 열어 NPT 탈퇴를 결정했다.
이는 '각 당사국은 본 조약상의 문제와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최고이익을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각 당사국은 탈퇴 통고를 3개월 전에 모든 조약당사국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행한다'는 NPT 10조1항에 따른 것.
이에 따라 북한의 탈퇴 효력은 같은 해 6월12일에 발생하게 돼있었지만 북한은하루전인 6월11일 북미 제1단계회담 공동발표문에서 NPT 탈퇴 효력을 정지시켰다.
북한과 미국은 당시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의 불사용 및 불위협 보장 ▲전면적인 핵안전조치의 공정한 적용을 포함한, 비핵화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의 보장과상대방 주권의 상호존중 및 내정 불간섭 등 원칙에 합의했고 북한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 핵확산금지조약으로부터 탈퇴 효력을 일방적으로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
북한은 이후 'NPT 탈퇴를 유보한 특수상황'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IAEA의 특별사찰을 거부하다 94년 6월13일 IAEA를 탈퇴했지만 NPT는 여전히 '탈퇴 유보' 상태였다가 이번에 탈퇴했다.
한편 NPT 당사국들은 조약 발효 25년만인 지난 95년 5월 조약 연장회의를 열고NPT 발효기간 무기한 연장을 결정했다.
NPT는 핵보유국과 핵비보유국의 권리와 의무를 서로 다르게 규정함으로써 차별성 시비가 계속되고 있으며, 미국의 후원을 받는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개발하면서도NPT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NPT 평가회의는 5년마다 열리며 2000년 4월24일부터 5월20일까지 4주간 유엔본부에서 열린 6차 평가회의에서는 5개 핵보유국들이 구체적인 핵무기 철폐 일정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핵무기 전면 철폐를 위한 분명한 약속'을 최종문서에 명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 기자 chungwon@yna.co.kr
!['여의도 문법 파괴자' 이준석…이번엔 지하철서 숙면 포착 [정치 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035329.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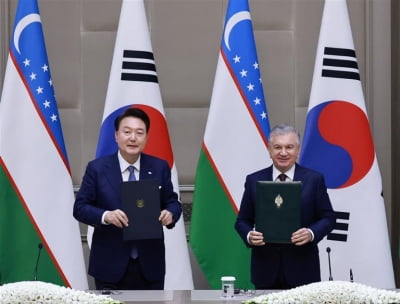












![[오늘의 arte] 전준혁 발레리노 독무, 너무 인상적](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03208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