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1:43
수정2006.04.03 01:46
'유비쿼터스' 개념은 1991년 미국 제록스사 팰러앨토연구센터의 마크 와이저 박사가 처음으로 제안했다.
이후 미국은 국가기관과 대학연구소, 첨단기업 등을 축으로 유비쿼터스 혁명을 선도하고 있다.
MIT의 '생각하는 사물', UC버클리의 '스마트 먼지', 컴퓨터과학연구소(CSL)의 '옥시전(Oxygen) 프로젝트', 국가표준기술원의 '침투하는 컴퓨팅' 등이 대표적 사례다.
먼지같이 작은 입자에 컴퓨터칩이나 센서를 탑재하거나 산소처럼 도처에 컴퓨터를 심어 인간과 모든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한다는 것이다.
일본도 '정보기술(IT) 경쟁에서 잃어버린 10년을 유비쿼터스에서 되돌려받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민관이 힘을 모으고 있다.
1984년 도쿄대 사카무라 켄 교수가 '트론(TRON.실시간운영시스템핵)'이란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이 시발이 됐다.
일본은 지난해 11월 총무성 산하에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기술의 장래 전망에 대한 조사연구소'를 설립했다.
이 연구소는 옷 서류 유가증권 등에 칩을 내장하는 '초소형 네트워크 프로젝트', 비접촉카드를 이용해 순식간에 어떤 단말기라도 자신의 단말기처럼 사용하는 '무엇이든 마이(MY) 단말 프로젝트' 등을 추진중이다.
EU(유럽연합)도 지난해 시작된 정보화사회기술계획(IST)의 일환으로 '사라지는 컴퓨팅 계획'이란 이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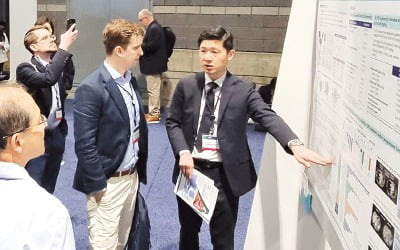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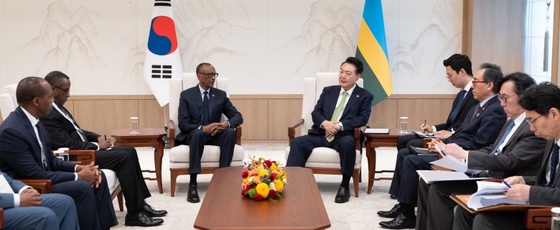


![[단독] 홈플러스, 슈퍼마켓 사업 부문 매각한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22731.3.jpg)
![[오늘의 arte] 예술인 QUIZ : 가택 연금됐던 러시아의 '反푸틴' 감독](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2036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