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0:32
수정2006.04.03 00:32
전통적 의미의 한국화는 지필묵(紙筆墨)을 필수요소로 한다. 종이와 먹, 붓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작가 권영우(76ㆍ예술원 회원)씨는 이중 종이만 사용한다. 이를 두고 누군가가`먹과 붓을 버렸다'며 그의 실험성을 강조했다. 권씨는 이에 대해 "먹과 붓을 버린게 아니라 보류한 것이라고 해야 옳다"고 한자락 여지를 남긴다.
아무튼 그는 1950년대부터 한지작업에 줄곧 몰입해온 작가로 꼽힌다. 한국화단에서는 보기 드문 경우다. 50년 전에는 전통기법과 소재의 수묵채색화가 주류를 이뤘다. 이런 때에 그는 추상형식을 과감히 도입하며 한국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했다.
그는 당시의 도전에 대해 한국의 예술적 독자성을 찾고 싶어서였다고 설명한다.전통동양화는 중국의 흔적이 너무나 짙게 남은 일종의 `모방'이었다는 얘기다. 그는애초 이런 화풍을 외면했다. 그를 한국화단의 아방가르드(전위)로 평가하는 이유는여기에 있다.
고희를 훨씬 넘긴 나이지만 그의 실험성은 여전히 강하다. 한지작업에 매달려있으되 다양한 시도와 변화의 모색은 한결같다. 이미 원로반열에 올라 있으나 예술적 열정은 신진작가의 그것이나 다름없다.
권씨는 최근 10여년간 실험한 작품을 29일 서울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리는 개인전에 내놓는다. 12월 22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는 1998년 국립현대미술관의 초대전 이후 가장 크게 마련하는 개인발표회이다. 출품작은 `무제' 시리즈. 지난해와 올해 제작한 작품이 주류를 이루되 세로 223cm 가로 170cm 크기의 대작도 많다.
1989년에 10년간의 프랑스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권씨는 90년대 들어 작품에 오브제를 끌어들인다. 1950년대가 전위적 한국화시기였다면 60년대와 70년대는 한지의물성에 침잠했던 때이고 80년대는 색채의 도입기였다. 다시 말해 프랑스 체류가 그에게 채색에 눈을 돌리게 했던 셈이다.
따라서 90년대의 오브제 작업은 또하나의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패널에 못이나 옷걸이, 막걸리병 등을 놓은 뒤 한지로 덮어 씌우는 것이다. 오브제는 일상에서흔히 사용된 것들로 이들은 폐기되지 않고 예술품으로 다시 태어나곤 했다.
최근들어서는 사물의 형태를 캔버스에 평면으로 올리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갈색 캔버스에 갖가지 형태의 종이를 한 겹 혹은 여러 겹으로 붙여 새로운 형상을만들어간다. 오브제를 통한 입체에서 형태를 이용한 평면의 시대로 돌아가는듯 하지만 기법은 매우 독창적이다.
권씨는 자신을 종이의 화가라고 부르는 것에 흔쾌히 동의한다. 어느 등산가가 `산이 거기 있으니 오를뿐이다'고 말했다면 그는 "화선지가 있으니 그곳에 작업할뿐이다"고 단순명쾌하게 설명한다.
그의 독창성은 캔버스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한다. 오브제도 직접 구해오고 한지를 한 장 한 장 바르는 것도 자신의 몫이다. 남이 닦아놓은 탄탄대로를 달리기보다잡풀 우거진 산언덕에 길을 새로 내어 홀로 걷고자 한다. 이로 비추어 그가 보류해두고 있다는 먹과 붓은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같다. 이번 전시에는 막걸리병으로 만든 설치작도 나와 그의 다양한 관심사를 엿보게 한다. 그에게 장르나 동서 구분 등은 아예 무의미하다.
함남 이원에서 태어난 권씨는 서울대 미대 회화과를 중앙대 예술대학 교수,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국전 초대작가상, 예술원상,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작가, 정부 은관문화훈장 등의 수상경력을 갖고 있다. ☎720-1020.
(서울=연합뉴스) 임형두 기자 ido@yn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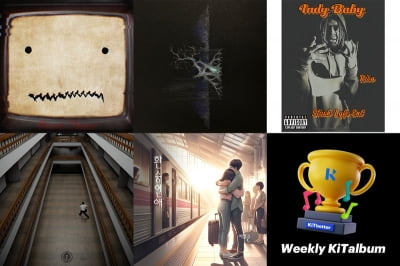
![[포토] 수피아 카야, '깜찍하게 하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3.37036065.3.jpg)
![[포토] 수피아 하나, '귀여운 미소'](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3.37036064.3.jpg)











![[오늘의 arte] 전준혁 발레리노 독무, 너무 인상적](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03208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