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2:42
수정2006.04.02 12:46
대대적인 성형수술을 받은 오거스타내셔널골프클럽이 타이어 우즈(미국)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으면서 '코스 방어'에 대한 차후 대책이 벌써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두자릿수 언더파 스코어로 우승하는 것을 더 이상 못보겠다'며 코스 길이를 모두 285야드나 늘리고 벙커를 보강하는 등 난이도를 높였으나 우즈의 장타와 탄도높은 아이언샷에 자존심 회복이 물거품이 됐다.
97년 18언더파 270타로 마스터스 대회 최저타 신기록을 세우며 첫 그린 재킷을 입은데 이어 지난해 14언더파 274타로 우승한 우즈는 이번에도 12언더파 276타로 거뜬히 두자릿수 언더파 스코어를 냈다.
그나마 우즈에게 나흘 연속 60대 스코어를 허용하지 않은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할 처지.
우즈를 견제하기 위해 코스를 개조한 것이 오히려 우즈에게 날개를 달아줬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우즈는 300야드를 넘나드는 장타를 마음껏 휘둘렀고 이에 따라 파 5홀과 파4홀에서 다른 선수들에 비해 훨씬 짧은 아이언으로 그린을 공략하는 이점을 톡톡히 누렸다.
우즈 뿐 아니라 순위표 상단을 장타자들의 파티로 만든 오거스타의 코스 개조는 결국 정교한 어프로치와 퍼트 실력으로 버텨온 '단타자'들을 마스터스의 구경꾼으로 만들었다.
최종 라운드를 제외하고 1~3라운드 동안 비에 젖어 자랑거리이던 '유리알 그린'이 위력을 잃자 러프없이 길이만 긴 코스는 장타자들에게 속절없이 무너졌다.
'최고의 코스'라고 자부하던 오거스타는 올해 대회를 계기로 오히려 US오픈이나 브리티시오픈이 열리는 코스에 비해 '평범한 골프장'으로 전락했다는 혹평을 받을 위기에 몰렸다.
이처럼 정성을 들인 코스 개조가 힘을 쓰지 못함에 따라 오거스타의 후속 조치가 우려대로 '장비 제한'으로 나타날지가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 존슨 회장은 "오거스타 전용 클럽을 제정할 수도 있다"고 이미 언급한 적이 있고 잭 니클로스, 그레그 노먼 등이 "볼의 탄력만 규제해도 코스는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과연 내년에는 오거스타가 마스터스의 명예회복을 위해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권 훈기자 khoon@yn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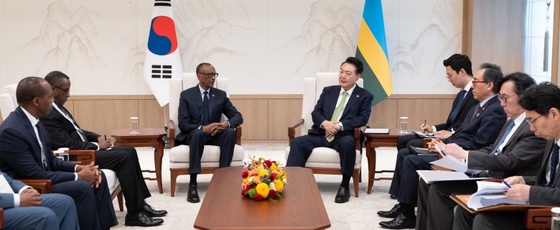


![[단독] 홈플러스, 슈퍼마켓 사업 부문 매각한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22731.3.jpg)
![[오늘의 arte] 예술인 QUIZ : 가택 연금됐던 러시아의 '反푸틴' 감독](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2036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