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노동정책 실무자의 하소연
설 연휴때도 청와대 업무보고를 준비하기 위해 출근했다.
그를 괴롭히는 것은 휴일을 반납할 정도의 격무가 아니다.
공존하기 힘든 과제의 해결책을 찾아내야 하는데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A 과장은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면서도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찾고 있노라면 자괴심이 느껴진다고 실토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영환경에서 근로자를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느냐의 여부는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비핵심분야의 경우 파트타임근로자나 단기계약근로자 파견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대세다.
반면 정규직 채용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
1년이상 일을 시키면 반드시 퇴직금을 주어야 하며 해고 절차도 까다롭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임금외 간접비용도 정규직 채용의 걸림돌이다.
IMF 경제위기 이후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명분아래 최근 3년간 고용보험료는 44%,의료보험료는 16% 인상됐다.
중소기업체를 경영중인 K 사장은 "사회보험료와 통신비 등을 포함한 간접비용이 임금의 2배에 육박하는데 누가 정규직을 쓰겠는가"며 따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극적으로 도입된 정리해고 제도마저 유명무실해지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노동부에 정리해고를 실시하겠다고 신고한 업체는 11개사에 그쳤다.
더구나 실제로 단행한 업체는 3개사 뿐이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노동부는 지난해말 1년미만의 단기계약근로자가 1년이상 반복적으로 일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토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고용안정과 사회보험 적용등의 혜택을 주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내심으론 부작용을 두려워하고 있다.
자칫하다간 그나마 일고 있는 비정규직 채용 수요마저 감소시켜 취업난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최고통치권자의 의중도 읽어야 하고 노동계의 눈치도 봐야 하는 노동부의 실무자로선 상충되는 과제가 등장할 때마다 한숨이 더욱 깊어지게 마련이다.
최승욱 사회부 기자 swchoi@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속보] 삼성전자 노조 파업 선언…사상 처음](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2.22579247.3.jpg)



![뉴욕증시, 나스닥 사상 첫 17,000선 돌파마감...엔비디아 7%↑ [출근전 꼭 글로벌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52906423590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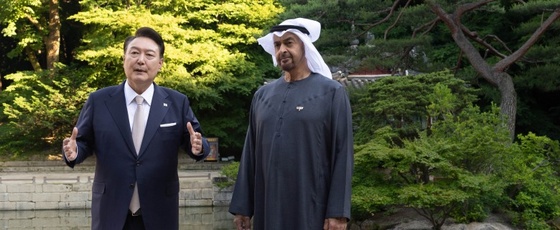


!["한국 가면 꼭 들러야할 곳"…3대 쇼핑성지 '올·무·다' 잭팟 [설리의 트렌드 인사이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6156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