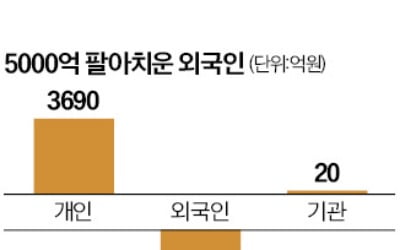절묘한 '오리콤 주가관리' 대우증권 시장조성 모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우증권이 오리콤에 대해 시장조성(공모주 대량 매입)의무를 ''절묘한 타이밍''으로 면해 증권가의 구설수에 올랐다.
두산그룹계열 광고회사인 오리콤은 코스닥에서 지난 10월24일부터 매매됐다.
상장제도에 따라 신규상장 종목에 대해선 매매개시일 다음날(10월25일)부터 2개월간 주간사 증권회사(대우)가 시장조성 의무를 져야 한다.
오리콤 주가를 공모가격(1만6천5백원)의 80%(1만3천2백원) 이상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다.
만약 주가 유지가 힘든 상황이면 주간사 증권회사는 시장조성을 준비해야 된다.
오리콤에 대한 대우증권의 의무 만료일은 금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22일이다.
이렇게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오리콤 주가는 지난 20일의 폭락장세 속에서 장중 한때 1만3천5백50원을 나타내 증권가에서는 대우가 단 이틀(21,22일) 남겨놓고 시장조성이라는 불행을 당하는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20일 오후장 막판에 동원증권 창구를 통해 ''강력한 매수주문''이 들어와 이날 주가를 바로 1만7천원(종가)으로 치솟게 만들었다.
다음날인 21일의 오리콤 주가는 하한가인 1만5천원.그러나 오리콤의 하한가를 가정한 22일 최악의 주가가 1만3천2백원으로 정확하게 공모가격의 80% 수준과 일치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우증권은 시장조성의무를 질 필요가 없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22일 최악의 경우(하한가)에도 오리콤 주가가 공모가의 80% 이상을 유지하는 셈이기 때문에 관계당국에 시장조성신고서를 낼 필요조차 없다"고 말했다.
증권전문가들조차 감탄할 정도로 오리콤 주가가 폭락장세 속에서도 대우증권을 위해 움직여 주는 바람에 자금부담이 우려되는 시장조성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증권업협회 감리부 관계자는 "시장조성 의무를 면하기 위한 시세조종이 있었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면밀하게 거래상황과 정황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홍모 기자 yang@hankyung.com
두산그룹계열 광고회사인 오리콤은 코스닥에서 지난 10월24일부터 매매됐다.
상장제도에 따라 신규상장 종목에 대해선 매매개시일 다음날(10월25일)부터 2개월간 주간사 증권회사(대우)가 시장조성 의무를 져야 한다.
오리콤 주가를 공모가격(1만6천5백원)의 80%(1만3천2백원) 이상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다.
만약 주가 유지가 힘든 상황이면 주간사 증권회사는 시장조성을 준비해야 된다.
오리콤에 대한 대우증권의 의무 만료일은 금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22일이다.
이렇게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오리콤 주가는 지난 20일의 폭락장세 속에서 장중 한때 1만3천5백50원을 나타내 증권가에서는 대우가 단 이틀(21,22일) 남겨놓고 시장조성이라는 불행을 당하는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20일 오후장 막판에 동원증권 창구를 통해 ''강력한 매수주문''이 들어와 이날 주가를 바로 1만7천원(종가)으로 치솟게 만들었다.
다음날인 21일의 오리콤 주가는 하한가인 1만5천원.그러나 오리콤의 하한가를 가정한 22일 최악의 주가가 1만3천2백원으로 정확하게 공모가격의 80% 수준과 일치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우증권은 시장조성의무를 질 필요가 없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22일 최악의 경우(하한가)에도 오리콤 주가가 공모가의 80% 이상을 유지하는 셈이기 때문에 관계당국에 시장조성신고서를 낼 필요조차 없다"고 말했다.
증권전문가들조차 감탄할 정도로 오리콤 주가가 폭락장세 속에서도 대우증권을 위해 움직여 주는 바람에 자금부담이 우려되는 시장조성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증권업협회 감리부 관계자는 "시장조성 의무를 면하기 위한 시세조종이 있었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면밀하게 거래상황과 정황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홍모 기자 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