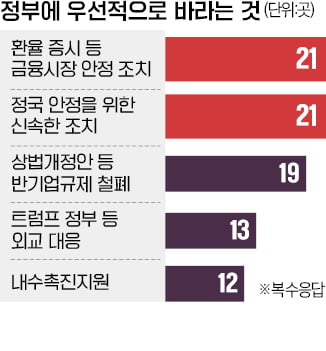또 減資소식에 行員 '망연자실' .. "틈틈이 사둔 우리사주 '쪽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또다시 감자한다는게 정말입니까"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직원들이 또 한차례 감자(減資.자본금 줄임)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에 망연자실하고 있다.
우리사주로 받은 주식의 가치가 이미 10분의 1도 안되게 쪼그라들었는데 그나마도 감자를 한다니 행원들은 거의 자포자기 상태다.
물론 이론상으로는 감자를 하더라도 주식수가 줄어든 만큼 주당 가치가 높아지므로 전체 보유주식 가치에 손실은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은행주식에 관한 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감자 후에도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게 그동안의 경험이기 때문이다.
한빛은행의 부장급인 A씨의 사례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결론부터 말해 그가 지금까지 자의반 타의반으로 한빛은행 주식을 사는데 들인 돈은 5천2백75만원.
그런데 현재 평가액은 4백50만5천원에 불과하다.
4천8백여만원이 날아간 셈이다.
그 과정을 보자.
A씨는 1989년 옛 한일은행에서 실시했던 우리사주 배정때 주당 1만9천9백원에 5백주를 사들였다.
이듬해에는 1만4천8백원에 역시 5백주를 우리사주로 배정받았다.
그는 "당시만 해도 주가가 2만원대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고 의무보유기간인 7년뒤에는 5만원은 넘을 것이라고 생각해 대출까지 받아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가는 계속 떨어졌고 1994년에 또다시 실시한 우리사주 배정때는 ''물타기''하는 심정으로 6천3백원에 3천주를 추가로 받았다.
이렇게 사모은 4천주의 주식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10대 1의 ''감자''를 당하면서 4백주로 줄었다.
문제는 주식수가 10분의 1로 줄었는 데도 주가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
A씨는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지난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받은 돈으로 6천원에 2천주를 사들였다.
이후 한빛은행 주식은 대우사태라는 직격탄을 맞으면서 또다시 액면가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에 은행과 노조에서 주가방어를 위해 ''자사주 사기 운동''을 벌였고 A씨는 4천5백원대에 다시 1천주를 사 보유물량이 3천4백주가 됐다.
그러나 이런 주가방어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 현재 한빛은행 주가는 1천3백25원에 머물러 A씨의 보유주식 평가액은 4백50만5천원에 불과하다.
그는 "그동안 이자비용 등을 따지면 사실상 우리사주를 산 돈은 모두 날린 셈"이라며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직원들이 또 한차례 감자(減資.자본금 줄임)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에 망연자실하고 있다.
우리사주로 받은 주식의 가치가 이미 10분의 1도 안되게 쪼그라들었는데 그나마도 감자를 한다니 행원들은 거의 자포자기 상태다.
물론 이론상으로는 감자를 하더라도 주식수가 줄어든 만큼 주당 가치가 높아지므로 전체 보유주식 가치에 손실은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은행주식에 관한 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감자 후에도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게 그동안의 경험이기 때문이다.
한빛은행의 부장급인 A씨의 사례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결론부터 말해 그가 지금까지 자의반 타의반으로 한빛은행 주식을 사는데 들인 돈은 5천2백75만원.
그런데 현재 평가액은 4백50만5천원에 불과하다.
4천8백여만원이 날아간 셈이다.
그 과정을 보자.
A씨는 1989년 옛 한일은행에서 실시했던 우리사주 배정때 주당 1만9천9백원에 5백주를 사들였다.
이듬해에는 1만4천8백원에 역시 5백주를 우리사주로 배정받았다.
그는 "당시만 해도 주가가 2만원대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고 의무보유기간인 7년뒤에는 5만원은 넘을 것이라고 생각해 대출까지 받아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가는 계속 떨어졌고 1994년에 또다시 실시한 우리사주 배정때는 ''물타기''하는 심정으로 6천3백원에 3천주를 추가로 받았다.
이렇게 사모은 4천주의 주식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10대 1의 ''감자''를 당하면서 4백주로 줄었다.
문제는 주식수가 10분의 1로 줄었는 데도 주가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
A씨는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지난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받은 돈으로 6천원에 2천주를 사들였다.
이후 한빛은행 주식은 대우사태라는 직격탄을 맞으면서 또다시 액면가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에 은행과 노조에서 주가방어를 위해 ''자사주 사기 운동''을 벌였고 A씨는 4천5백원대에 다시 1천주를 사 보유물량이 3천4백주가 됐다.
그러나 이런 주가방어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 현재 한빛은행 주가는 1천3백25원에 머물러 A씨의 보유주식 평가액은 4백50만5천원에 불과하다.
그는 "그동안 이자비용 등을 따지면 사실상 우리사주를 산 돈은 모두 날린 셈"이라며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