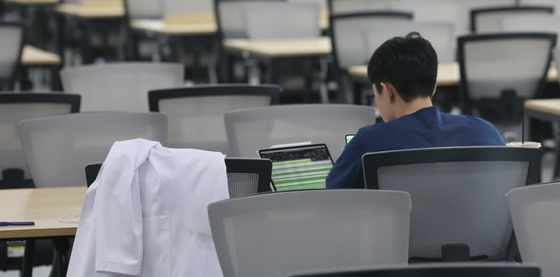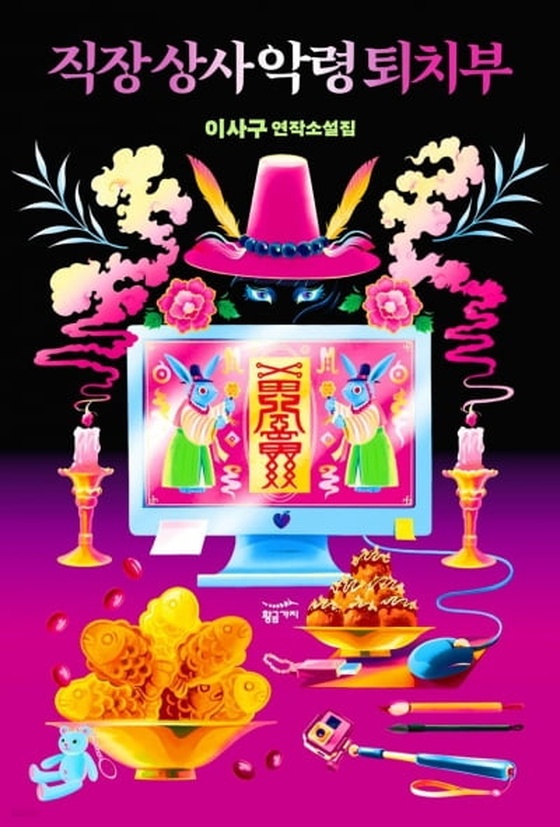[스톡옵션 도입열기 주춤] 人材지키기 팀단위 보상制가 효과..미국 시각
미국 와튼경영대학원의 피터 카펠리 교수는 최근 하버드경영대학원이 발행하는 하버드 비즈니스지에서 스톡옵션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스톡옵션을 아무리 많이 지급하더라도 더 많이 지급하는 회사가 나타난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고급인력을 잡아두기 위해서는 스톡옵션보다 팀단위의 보상제를 도입하라고 권유한다.
다음은 그의 글 요약임.
오늘날 거의 모든 기업들은 필요한 사람들을 잡아두기 위해 스톡옵션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스톡옵션은 이제 더 이상 인재를 지키는 도난경보기 역할을 할 수 없게 됐다.
97년 AT&T에서 차기 경영자 서열에 올랐던 알렉스 맨들은 소규모 회사인 어소시에이티드 커뮤니케이션즈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1천만달러어치의 AT&T 스톡옵션을 포기한 대신 2천만달러가 넘는 입사보너스를 받았다.
93년 IBM은 온갖 스톡옵션에도 불구하고 이곳 저곳으로 빠져 나가는 인력들로 골치를 앓았다.
이유는 IBM의 주식값이 떨어지면서 스톡옵션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스톡옵션을 포함한 연봉 프로그램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역기능도 갖고 있다.
반도체산업의 경우 회사가 보너스를 두둑이 지급하거나 회사 주식이 오르면 오히려 이직률이 높아진다.
엔지니어들이 창업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또 사원들은 큰 돈이 생기면 일을 덜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게 노동경제학자들의 결론이다.
여가를 즐기기 위해 조기퇴직을 하거나 근무시간이 짧은 곳으로 옮기려 한다는 것이다.
또 연봉 프로그램의 또 다른 문제는 경영자들이 긍적적인 참여와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혼동한다는 점이다.
충성심이 없으면 일에 대한 열의도 결여된 사람이라고 단정짓는다.
과연 그러한가.
열의란 개인과 회사간에서 보다 개인들 사이에서 훨씬 많이 나타난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팀단위로 일을 구성하는 것도 열의를 복돋워줄 수 있는 방법이다.
팀을 바탕으로 한 보상시스템은 공동체의 운명이 팀원의 실적에 달렸다는 의식을 조성하는데 한몫한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팀을 중심으로 한 생산업무의 설계는 현저한 실적개선을 가져 왔다.
또 기업과 종업원의 긍정적인 관계는 근무시간이 짧을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단기간 근무할 경우 회사의 기대치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업무에 대한 목표의식이 뚜렷해지기 때문이다.
이심기 기자 sglee@ked.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심각한 고평가"…AI 서버 수요 의심 커졌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B202406010655477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