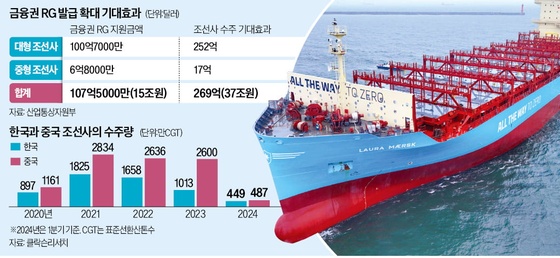[사이버 증권거래] 미국 사이버거래소 'ECN' 돌풍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핵"으로 주목받고 있다.
ECN이란 증권회사나 언론사들이 온라인상에 설립하는 가상증권거래소.
뉴욕증권거래소(NYSE)등과는 달리 실체가 없이 인터넷 등 온라인상에만
존재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인스티넷 아일랜드 등 9개 ECN이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등록, 운영중이다.
이들이 증권시장에서 차지하는 거래 점유율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NYSE나 나스닥 등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 97년의 경우 나스닥 거래물량의 20%만이 ECN을 통해 체결됐다.
나머지는 브로커나 마켓메이커(시장조성자)들을 통해 소화됐었다.
그러나 지난해말 이 비율은 33%로 높아졌다.
나스닥 종목 뿐 아니라 NYSE 거래물량의 4~5%도 ECN에서 거래중이다.
이같은 증가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ECN이 이처럼 급속히 성장하는 이유는 여러가지다.
우선 ECN은 증권거래소로 등록되지 않고 증권거래가 가능한 일종의
"증권업체"로 등록돼 있다.
따라서 증권거래소와 같이 정부가 요구하는 거래 감시규정이나 투자자
보호법등을 따를 의무가 없다.
회원사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컴퓨터가 주문 접수에서부터 매매연결,거래청산까지 일괄처리해 주기
때문에 수수료가 싸다.
ECN에서는 뉴욕증권거래소나 나스닥에서 내는 거래수수료의 10~16%면
족하다.
뿐만 아니다.
ECN은 회원사들만 참여하는 폐쇄적인 운영형태를 갖고 있어 대규모 물량을
거래해도 NYSE이나 나스닥에 거의 충격을 주지 않는다.
때문에 대규모 물량을 소화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장종료후 거래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현재 ECN을 설립하는 업체는 주로 로이터와 블룸버그등 경제전문 통신사와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피델리티 등 대형 증권사들이다.
이들은 한꺼번에 2~3개 ECN에 출자해 놓고 자사 보유물량을 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등 기존 거래소들도 자체
ECN을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규제가 없고 수수료가 싼 ECN을 찾아 떠나는 고객들을 두고만 볼 수
없기 때문.
게다가 최근 미 SEC가 각종 증권거래소간의 상호침투를 금지해온 규정을
잇따라 철폐하고 있어 이같은 움직임을 부채질하고 있다.
SEC는 최근 NYSE의 "내규 390호"를 폐지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규 390호는 NYSE의 79년 이전상장종목에 대해서는 다른 거래소에서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이 없어지면 제너럴일렉트릭(GE)이나 IBM등 NYSE 주요대형주들이
다른 거래소에서도 거래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치등 NYSE주요회원들은 이왕에 설립해
놓은 자체 ECN에서 이들 주식의 매매물량을 늘리게 될 것이다.
NYSE나 나스닥 등이 ECN을 설립해 회원사들의 이탈을 막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NYSE는 조만간 기업공개를 단행,확보된 자금으로 기존 ECN중 하나를 인수할
계획이다.
나스닥을 관할하는 미증권업협회(NASD)도 ECN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수퍼ECN"설립을 논의중이다.
현재 ECN중 최고,최대규모는 로이터 통신이 운영하는 "인스티넷"이다.
인스티넷에서는 세계 40여개국 고객들이 하루 1억7천만주를 거래중이다.
인스티넷 매출은 로이터 매출의 16%에 불과하지만 총 수익의 28%에 달하는
"알짜배기"사업이다.
메릴린치와 골드만삭스도 공동으로 올해 6월까지 "프라이멕스트레이딩"
이란 전자증권거래소를 따로 설립하겠다고 발표, 올해안에 3~4개의 ECN이
새로 생길 전망이다.
최근엔 인스티넷 아일랜드 등 8개 ECN들이 거래시세표를 공유키로 합의,
기존 증권거래소에게 결정타를 날렸다.
거래시세표가 공유되면 회원증권사들이 ECN별 시세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돼 ECN 참여층은 더욱 두꺼워질 수 밖에 없다.
< 박수진 기자 parksj@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일자 ).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테슬라 5% 떨어질 때 50% 올랐다…나홀로 강한 中 전기차 종목 [양병훈의 해외주식 꿀팁]](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063628.3.jpg)
![유로화에 등락한 환율…1.9원 상승 마감 [한경 외환시장 워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4820441.3.jpg)



![美소비자 심리 둔화에 반락한 유가…"수요 강세 전망은 호재" [오늘의 유가]](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6039374.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