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위성사업 '시들' .. 기업 등 수요 '급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아시아 지역은 하늘에서도 "버블"이 꺼지고 있다.
호황을 구가하던 아시아 지역 위성방송사업과 위성제작및 관련장비
제조업체들의 경영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경제위기로 인공위성을 사용하려는 기업과 방송국등의 수요가 뚝 끊겼기
때문이다.
위성 관련사업은 지난 93년부터 줄곧 확장세를 지속해왔었다.
데이터를 주고 받는 위성중계기의 경우 지난 5년동안 수요가 3배나
늘어나 1천1백개가 우주로 쏘아 올려졌다.
지난해에만도 14개의 로케트가 총 2백50개의 중계기를 아시아 상공에
뿌려 놓았다.
그러나 올들어서는 새로 쏘아진 중계기가 작년의 절반도 안된다.
가장 큰 이유는 인공위성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
기업들은 물론이고 주요 고객인 TV방송국들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위성채널
대여 주문을 보류하거나 아예 백지화하고 있다.
하늘에 떠있는 중계기도 주문이 없어 놀고 있다.
파 이스턴 이코노믹리뷰지는 지난 20일 현재 아시아 상공에 있는
인공위성 중계기의 50%만 실제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낭비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경기가 회복돼도 현재 아시아 상공에 떠 있는 위성을 모두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골드만 삭스 캐신디 차오 홍콩지점장)이라는
공급과잉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되자 중계기 제조업체들이 맨 먼저 타격을 받고 있다.
리스비용으로 연간 1백만-4백만달러씩 받고 임대해 주었으나 수요가
줄면서 가격도 20-30%나 떨어졌다.
총 1백60여기의 위성을 쏘아올린 위성서비스 제공업체들도 마찬가지다.
가장 경영상태가 좋다는 아시아셋사의 경우 올 상반기 매출은 지난해보다
8% 떨어졌다.
순익은 15%나 곤두박질 쳤다.
다른 업체들의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이 단지 경기 때문만은 아니다.
홍콩과 중국, 인도 정부가 가정에서 위성방송을 직접 수신하지 못하게
한 것도 위성사업자들에게 타격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 MGM골드사는 아시아에서 더 이상 비전이 없다며 사업을 포기하고
철수했다.
그러나 아시아 위성사업 전망이 꼭 암울한 것만도 아닌 것 같다.
인도와 중국이라는 광활한 미개척지가 있고 지난해 WTO(세계무역기구)를
통해 아시아 각국이 5년간에 걸쳐 통신시장을 적극 개방키로 한 것도 좋은
징조다.
영국 브리티시텔레콤(BT)이 최근 아시아에서 새로운 위성통신서비스를
시작키로 한 것도 이러한 전후사정을 노린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 위성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가 급속히 늘 것으로 보여 위성
서비스업체들의 장래를 밝게 하고 있다.
대부분 인터넷서비스 공급업체들(ISP)들이 지역 네트워크나 해저
광케이블을 이용하지만 위성을 이용하면 30-40%가량 싼 가격에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박수진 기자 parksj@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6일자 ).
호황을 구가하던 아시아 지역 위성방송사업과 위성제작및 관련장비
제조업체들의 경영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경제위기로 인공위성을 사용하려는 기업과 방송국등의 수요가 뚝 끊겼기
때문이다.
위성 관련사업은 지난 93년부터 줄곧 확장세를 지속해왔었다.
데이터를 주고 받는 위성중계기의 경우 지난 5년동안 수요가 3배나
늘어나 1천1백개가 우주로 쏘아 올려졌다.
지난해에만도 14개의 로케트가 총 2백50개의 중계기를 아시아 상공에
뿌려 놓았다.
그러나 올들어서는 새로 쏘아진 중계기가 작년의 절반도 안된다.
가장 큰 이유는 인공위성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
기업들은 물론이고 주요 고객인 TV방송국들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위성채널
대여 주문을 보류하거나 아예 백지화하고 있다.
하늘에 떠있는 중계기도 주문이 없어 놀고 있다.
파 이스턴 이코노믹리뷰지는 지난 20일 현재 아시아 상공에 있는
인공위성 중계기의 50%만 실제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낭비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경기가 회복돼도 현재 아시아 상공에 떠 있는 위성을 모두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골드만 삭스 캐신디 차오 홍콩지점장)이라는
공급과잉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되자 중계기 제조업체들이 맨 먼저 타격을 받고 있다.
리스비용으로 연간 1백만-4백만달러씩 받고 임대해 주었으나 수요가
줄면서 가격도 20-30%나 떨어졌다.
총 1백60여기의 위성을 쏘아올린 위성서비스 제공업체들도 마찬가지다.
가장 경영상태가 좋다는 아시아셋사의 경우 올 상반기 매출은 지난해보다
8% 떨어졌다.
순익은 15%나 곤두박질 쳤다.
다른 업체들의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이 단지 경기 때문만은 아니다.
홍콩과 중국, 인도 정부가 가정에서 위성방송을 직접 수신하지 못하게
한 것도 위성사업자들에게 타격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 MGM골드사는 아시아에서 더 이상 비전이 없다며 사업을 포기하고
철수했다.
그러나 아시아 위성사업 전망이 꼭 암울한 것만도 아닌 것 같다.
인도와 중국이라는 광활한 미개척지가 있고 지난해 WTO(세계무역기구)를
통해 아시아 각국이 5년간에 걸쳐 통신시장을 적극 개방키로 한 것도 좋은
징조다.
영국 브리티시텔레콤(BT)이 최근 아시아에서 새로운 위성통신서비스를
시작키로 한 것도 이러한 전후사정을 노린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 위성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가 급속히 늘 것으로 보여 위성
서비스업체들의 장래를 밝게 하고 있다.
대부분 인터넷서비스 공급업체들(ISP)들이 지역 네트워크나 해저
광케이블을 이용하지만 위성을 이용하면 30-40%가량 싼 가격에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박수진 기자 parksj@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6일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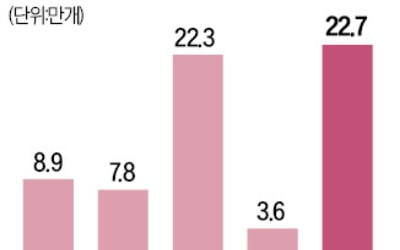
![[속보] 루마니아 헌재, '극우 승리' 대선 1차투표 무효화](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2.2257924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