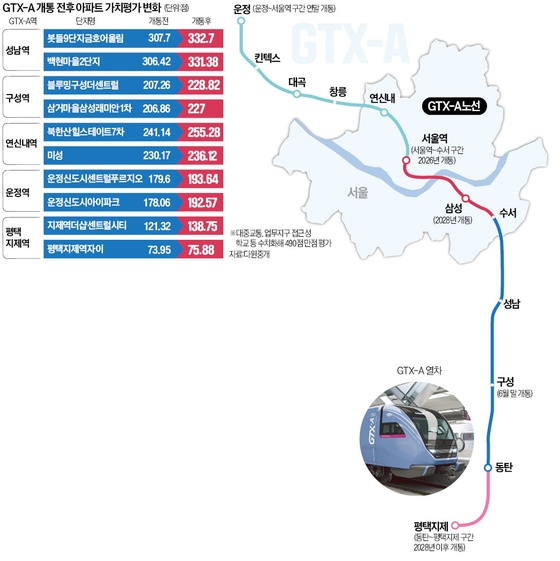지금 고통이 훗날 영광되길..제일은행 '남편 기살리기 행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천근만근 무거워 보여요"
19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제일은행 본점 강당.
역삼동지점장으로 재직중인 남편(최정남)을 위로하는 부인 정태옥씨의
편지 낭송에 2백50여명의 동료지점장 및 본점 간부 부인들이 하나둘씩
손수건을 꺼내기 시작했다.
"제일은행 서울은행 부실내용이 머리기사로 다뤄지던 지난 수개월,
아무런 보탬을 주지 못하는 제자신의 무능이 한없이 안타까웠답니다"
하루아침에 일등은행에서 매각대상은행으로 추락한 은행간부의
내조자로서 회한과 아쉬움이 이어졌다.
잠시전 제일은행 퇴직직원들의 이야기를 담은 "내일을 준비하며"라는
비디오를 시청할때보다 흐느끼며 어깨를 들먹이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창가를 때리는 봄비소리는 동변상련의 아픔을 더욱 키웠다.
"출근길에 나선 당신과 어느덧 듬직한 대학생이 된 아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참 고맙고 행복해 콧날이 시큰했습니다"
제일은행의 주인찾기가 본격화되면 우리 남편도 "고개숙인 남자"가 될수
있다는 우려속에 정태옥씨의 호소는 "고통의 무게가 큰 만큼 영광의 날도
크게 다가올 것이라고 믿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으로 끝났다.
이날 제일은행 가족들의 고통과 흐느낌은 대량실업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0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9년6월…이재명 '타격'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4874021.3.jpg)
![[속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이화영에 징역 9년6월 선고](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2.22579247.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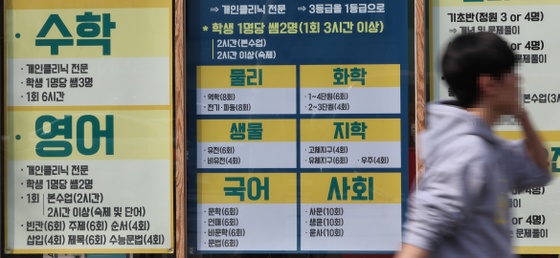

![옥수수 가격 반등…에탄올 수요가 견인 [원자재 포커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5973355.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