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US오픈 현장리포트] (6.끝) 난이도 1위 18번홀 4.518타
탄식을 내게 하기에 충분했다.
독자들도 "코스가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겠는가.
요즘의 프로골프에서 거리가 문제될 게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
솔직히 기자도 그런 생각을 했었다.
오크몬트나 시네콕힐스 등 난코스로 얘기되는 곳들도 많은 프로들이
언더파로 제압, 현대골프의 위력이 발휘되지 않았는가.
그러나 오클랜드힐스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바꿔 놓았다.
이곳에서는 "진정 파잡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괴물 오클랜드힐스를 자세히 분석하며 코스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립해 보자
=====================================================================
[[ 미 미시건주 오클랜드힐스GC 버밍햄 = 김흥구 기자 ]]
<> "투 포인트 게임"
오클랜드의 골프는 "투 포인트 게임"이다.
1951년 코스를 개조한 로버트 트렌스 존스의 의도대로 "티샷을 바로
거기에, 어프로치샷은 바로 그곳에" 보내지 않으면 영락없이 보기인게
이골프장이다.
18번홀 (파4.465야드)을 예로 든다.
이곳은 난이도 랭킹 1위의 홀로 최종일 평균 스코어는 4.518타였고
"우승을 노리던" 공동 5위까지의 6명 선수중 4명이 보기를 하며
챔피언의 꿈을 날려 버린 곳이다.
18번홀은 세컨드샷 지점부터 오른쪽으로 약간 꺾여 올라간 도그레그
형태이다.
티샷 낙하지점의 페어웨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크게 경사져 있다.
물론 페어웨이 폭은 25야드 정도이고 양옆에는 벙커가 도사리고
있다.
이 홀은 캐리로 270야드 이상을 날려 왼쪽 벙커를 넘기는 게 이상적이다.
볼이 페어웨이 가운데로 날아도 거리가 안나면 경사면을 타고 오른쪽으로
흘러 벙커행이거나 러프에 파묻힌다.
최종일 톰 레이먼의 드라이버샷이 바로 그렇게 돼 오른쪽 벙커행이었다.
왼쪽으로 쳐도 여차하면 러프이다.
폭 25야드의 페어웨이는 실제 웬만한 그린의 폭으로 티잉그라운드에
서면 마치 "뱀"의 허리만큼이나 좁게 느껴진다.
18번홀의 티샷은 거리를 크게 내거나 정확한 페이드를 걸어 벙커사이에
안착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 러프는 트리플보기
러프의 잔디는 15cm 이상이다.
볼이 러프에 파 묻히면 볼 컨트롤이 불가능하다.
"진득 진득한" 이곳 잔디는 헤드를 제멋대로 움켜 잡는다.
3라운드 16번홀에서 선두 페인 스튜어트의 "러프 세컨드샷"은 생크가
나며 물에 퐁당해 트리플보기였고 2라운드 상위권의 리 잰슨이나
제프 매거트는 18번홀에서의 티샷 러프행으로 다 트리플보기였다.
따라서 티샷이 러프에 빠지면 보기가 하늘같이 보인다.
러프는 또 다른 러프행으로 이어지는게 보통의 패턴이다.
<> 그린은 몬스터속의 몬스터
진정한 어려움은 그린에서 시작된다.
그린은 단단하다.
단단하다는 것은 쇼트아이언정도의 샷만이 스핀을 먹어 "홀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세컨드샷을 6번정도로만 쳐도 튀어 넘어가며 러프에 정지한다.
18번홀은 그 거리로 보아 미들아이언이나 롱아이언으로 세컨드샷을
해야 하는데 그린이 그 모양이니 여간 절묘하지 않으면 온그린이 힘들다.
굴러 올라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깊은 벙커들이 쭉 둘러쳐 있기 때문이다.
그린 사이드나 벙커에서의 "붙이는 파"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그게
말만큼 쉽지 않다.
그것은 그린 굴곡 때문이다.
18번홀 그린은 이리저리 굴곡져 있지만 가장 큰 굴곡은 가운데쯤의
언덕이다.
쉽게 말해 종이를 약간 접어 놓은 형태이다.
핀이 오른쪽에 있을때 볼이 그린 왼쪽에 정지하면 그곳은 2퍼트가
불가능한 지역이다.
언덕을 넘기는 퍼트는 내리막을 타고 하염없이 굴러 홀컵을 훨씬
지나 버리는 것.
그린사이드 어프로치도 마찬가지.
선수들은 "롤"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통 하늘높이 뜨는 "로브 샷"으로
짧은 어프로치를 하는데 착지지점이 여간 정확하지 않으면 오히려 홀컵
반대편으로 흐른다.
최종일 피터 제이콥슨의 더블보기도 바로 그런 형태였다.
세컨드샷이 핀을 향해 떨어져도 안심은 금물.
볼이 핀 전방에 떨어져 홀컵을 향해 구르다가도 그린 경사로 인해
방향을 바꿔 하염없이 옆으로 빠진다.
결국 이곳에서 파를 잡으려면 그린 경사도까지 염두에 두고 "바로
그 지점"에 안착시켜야 한다.
절대 "온그린=파"의 공식이 없는 셈이다.
여기에 그린 스피드는 좀 빠른가.
내리막 퍼트라도 걸리면 선수들이 절절 댄다.
최종일 러브3세는 우승 또는 연장 돌입을 위한 내리막 6m퍼트가 3피트
(약 9cm)나 짧았던데 대해 "나는 치고 나서도 홀컵을 지나 칠 줄
알았다"고 말했다.
스피드에 대한 주눅과 경기의 중압감이 "메이저 우승없는 최고 선수"
라는 칭호를 연장시킨 셈이다.
<> 본 모습과 세팅
코스 난이도는 원래의 코스설계와 세팅이 복합돼 나타난다.
벙커위치나 그린경사는 그 골프장의 원래 모습이나 페어웨이 세팅과
그린스피드조절은 주최자의 몫이다.
그런면에서 "25야드 폭이나 15cm이상 러프" 등 USGA (미 골프협회)의
US오픈 세팅은 극히 가혹한 편이다.
어려운게 능사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골프장들도 이제 "코스 세팅"에
대한 개념정립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골퍼들의 기량향상도 목적이지만 볼이 러프에 들어가도 페어웨이와
별반 다를 게 없다면 공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9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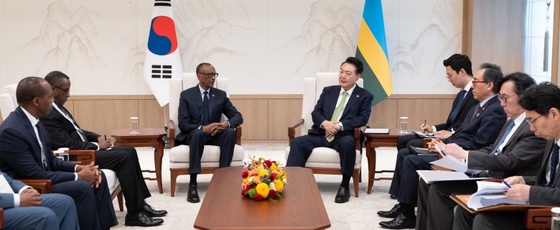


![[단독] 홈플러스, 슈퍼마켓 사업 부문 매각한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22731.3.jpg)
![[오늘의 arte] 예술인 QUIZ : 가택 연금됐던 러시아의 '反푸틴' 감독](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2036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