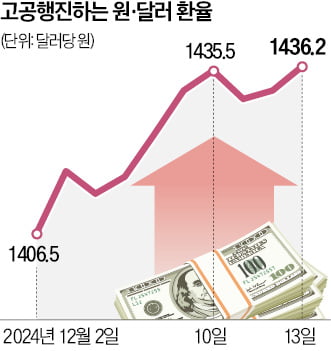[증시를 살리자] (10.끝) 증권정책의 일괄성..후진성 못면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주가가 폭락하면 으례 정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장기침체에 접어들기라도 하면 이는 곧장 정치적 문제로 비화해 정당들이
나서고 통치권 차원의 코멘트가 나오곤 한다.
결국엔 부양책도 모습을 드러낸다.
이것은 하나의 판에 박은 수순이 되어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제 이같은 정책 결정의 틀을 바꿀 때가 됐다.
증시에서 정치를 걷어내고 증권 정책이라는 이름의 관권개입마저 걷어내야
한다.
증시를 투자자와 증권업자 그리고 상장사의 것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얘기다.
증권 전문가들은 특히 정부 주도의 오랜 관행이 증시의 후진성을 만들어
냈다고 주장한다.
정부 스스로가 이같은 관행을 과감히 떨어낼 것을 주문하고 있다.
예컨대 상장기업의 유상증자는 아직도 정부의 관리를 받고 있고
기관투자가들의 자산운용 역시 때만되면 정부가 개입해 사고 팔기를
강제한다.
그러니 자율성은 없어지고 결국에는 투자신탁 각서파문같은 것이 터지고
만다.
정부의 시장관리 관행은 한마디로 개발경제 시절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 결과 우리 증시의 배당수익율은 세계증시에서도 가장 낯은 1% 남짓에
불과한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금리가 10%를 넘는터에 일본이나 미국보다 배당수익율이 낮다면 증시침체는
구조적인 것이 되고 만다.
주식공급 역시 투자자 무시의 원칙이 고수되고 있다.
정부가 민영화라는 미명하에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수백개의 민간
기업은 기업공개 대기실에서 하염없이 순서만을 기다리게 된다.
더구나 정책 편의를 위해 정부가 시장을 조작해왔다는 비난마저 적지아니
제기되고 있다.
예를들어 정부는 은행들이 증자나 공개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주가를
조작해왔던 관행을 눈감아 왔고 결국 은행주 붕락의 간접적 기초를 제공해
왔다.
증권시장의 각종 법률 장치에도 역시 문제가 없지 않다.
상법이 보장해할 투자자(소비자)의 권리는 오히려 공급자 중심으로 변질
되어 소액 주주는 주총에서 발언할 권리마저 박탈당한 상태이다.
자기가 투자한 기업의 장부를 열람 할 권리같은 것조차 잊은지 오래됐다.
이같은 제도는 지난 5공 당시 국보위에서 개악된 것이지만 문민정부요
세계화를 부르짖는 지금도 여전히 온존하고 있다.
주식 발행비용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단행된 액면 인상은 무권발행이
보편화된 지금도 고집스레 존속하고 있고 세계의 기업들이 주가관리를
위해 액면을 분할해가고 있는 요즘도 한국에서는 마냥 5천원짜리 액면만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정부의 무대책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 된다.
정부는 투자자들에 대해 스스로의 투자 책임을 강조하지만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겐 사실 너무도 많은 부담이 지워져 있다.
증권 투자자들이 농업도 살려야하고(농특세 0.15%) 정부 예산도 부담
(거래세 0.3%)해야하며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내면서
증권사도 먹여살려야 한다.
3중 4중의 부담인 셈이다.
그러니 거래를 할수록 원금은 줄어들고 주식으로 돈번 사람을 찾기
힘들게 됐다.
차제에 증시제도를 투자자 위주로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
당국자들은 "정부가 어떻게 주가를 올려주나"라는 푸념을 하기 전에 증시
지반을 침하시키고 있는 이런 장애물들을 제거할 방법들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금융과 증시가 살려면 미국처럼 재경원 조직에서 증권국과 이재국부터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마저 높아가고 있음을 당국자들은 새겨
들어야 한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9일자).
장기침체에 접어들기라도 하면 이는 곧장 정치적 문제로 비화해 정당들이
나서고 통치권 차원의 코멘트가 나오곤 한다.
결국엔 부양책도 모습을 드러낸다.
이것은 하나의 판에 박은 수순이 되어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제 이같은 정책 결정의 틀을 바꿀 때가 됐다.
증시에서 정치를 걷어내고 증권 정책이라는 이름의 관권개입마저 걷어내야
한다.
증시를 투자자와 증권업자 그리고 상장사의 것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얘기다.
증권 전문가들은 특히 정부 주도의 오랜 관행이 증시의 후진성을 만들어
냈다고 주장한다.
정부 스스로가 이같은 관행을 과감히 떨어낼 것을 주문하고 있다.
예컨대 상장기업의 유상증자는 아직도 정부의 관리를 받고 있고
기관투자가들의 자산운용 역시 때만되면 정부가 개입해 사고 팔기를
강제한다.
그러니 자율성은 없어지고 결국에는 투자신탁 각서파문같은 것이 터지고
만다.
정부의 시장관리 관행은 한마디로 개발경제 시절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 결과 우리 증시의 배당수익율은 세계증시에서도 가장 낯은 1% 남짓에
불과한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금리가 10%를 넘는터에 일본이나 미국보다 배당수익율이 낮다면 증시침체는
구조적인 것이 되고 만다.
주식공급 역시 투자자 무시의 원칙이 고수되고 있다.
정부가 민영화라는 미명하에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수백개의 민간
기업은 기업공개 대기실에서 하염없이 순서만을 기다리게 된다.
더구나 정책 편의를 위해 정부가 시장을 조작해왔다는 비난마저 적지아니
제기되고 있다.
예를들어 정부는 은행들이 증자나 공개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주가를
조작해왔던 관행을 눈감아 왔고 결국 은행주 붕락의 간접적 기초를 제공해
왔다.
증권시장의 각종 법률 장치에도 역시 문제가 없지 않다.
상법이 보장해할 투자자(소비자)의 권리는 오히려 공급자 중심으로 변질
되어 소액 주주는 주총에서 발언할 권리마저 박탈당한 상태이다.
자기가 투자한 기업의 장부를 열람 할 권리같은 것조차 잊은지 오래됐다.
이같은 제도는 지난 5공 당시 국보위에서 개악된 것이지만 문민정부요
세계화를 부르짖는 지금도 여전히 온존하고 있다.
주식 발행비용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단행된 액면 인상은 무권발행이
보편화된 지금도 고집스레 존속하고 있고 세계의 기업들이 주가관리를
위해 액면을 분할해가고 있는 요즘도 한국에서는 마냥 5천원짜리 액면만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정부의 무대책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 된다.
정부는 투자자들에 대해 스스로의 투자 책임을 강조하지만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겐 사실 너무도 많은 부담이 지워져 있다.
증권 투자자들이 농업도 살려야하고(농특세 0.15%) 정부 예산도 부담
(거래세 0.3%)해야하며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내면서
증권사도 먹여살려야 한다.
3중 4중의 부담인 셈이다.
그러니 거래를 할수록 원금은 줄어들고 주식으로 돈번 사람을 찾기
힘들게 됐다.
차제에 증시제도를 투자자 위주로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
당국자들은 "정부가 어떻게 주가를 올려주나"라는 푸념을 하기 전에 증시
지반을 침하시키고 있는 이런 장애물들을 제거할 방법들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금융과 증시가 살려면 미국처럼 재경원 조직에서 증권국과 이재국부터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마저 높아가고 있음을 당국자들은 새겨
들어야 한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