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전기업계, 전략분야 집중투자] '집중'으로 구조개편
계열사간 사업이관도 활발하다.
LG전자는 TFT-LCD(초박막액정표시장치)사업을 LG반도체로 떼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삼성전자는 플로피디스크 사업을 지난해 삼성전기로 이관했다.
사업간 통합으로는 LG전자가 멀티미디어 게임사업인 3DO와 교육용
멀티미디어 기기인 CD-i(대화형 컴팩트 디스크)의 일부 사업조직을
통합키로 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전자업계가 이같은 사업구조 정비를 통해 노리는 것은 "될 사업을
밀어주자"는 것.
빠른 기술발전에 미뤄보아 백화점식 사업구조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판단이다.
"모든 사업을 세계 톱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구자홍
LG전자사장)는 것이다.
잘 나가는 사업을 힘껏 밀어주고 상대적으로 "뒷다리"를 잡는 분야는
버릴 수 밖에 없다는 계산이다.
LG전자가 올들어 도입한 자원집중제가 이같은 전략의 대표적 예다.
인력과 자금을 몇가지 분야에 집중 투입해 주력상품으로 육성한다는
게 골자다.
LG는 <>가전에선 에어콘 <>부품으로는 브라운관과 CD롬드라이브
<>영상기기에선 모니터 등을 자원집중의 대상으로 정했다.
개발 연구 영업등의 모든 가용인력과 자금을 이들 분야에 최우선적으로
지원해 각 분야에서 세계 3위권내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기 역시 올해 MLB(다층인쇄회로기판)와 칩부품등을 전략품목으로
정했다.
"매출신장률에 연연하지 않고 대신 경쟁력 있는 제품에 투자를 집중해
이익률을 높이는 데 힘을 쏟겠다"(이형도 삼성전기사장)는 게 이 회사의
올해 경영전략이다.
유관사업을 통합하거나 계열사로 떼어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유사한 사업을 하나로 묶어 힘을 실어주고 대신 남은 조직과 인력으로
경쟁력있는 분야를 강화하겠다는 것.
LG전자가 TFT-LCD사업을 LG반도체로 넘겨주기로 한 것은 기술이 같은
사업을 두개의 회사에서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우전자는 유통기능이 강한 영상사업을 (주)대우로 넘기는 대신
그 조직과 투자자금을 활용해 반도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전자업계의 이같은 흐름은 경영전략이 "따라가기"에서 "앞서가기"로
변화됐음을 엿보게 한다.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생각으로는 "잘해야 2등"에 머물
수 밖에 없다.
남들이 하지 않더라도 나밖에 할 수 없는 사업을 찾아내야 한다"
(전자공업진흥회 이상원부회장)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
물론 이같은 움직임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소수정예주의를 택한 만큼 사업이 실패할 경우 받을 타격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자원이 특정 분야에만 편중되면 다른 사업분야가 겪을 어려움이 가중될
게 분명하다.
그렇지만 "지금은 가닥을 잡아야 할 시점"(배순훈 대우전자회장)인
것은 분명하다.
멀티미디어 정보통신 등 신개념의 기기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어
사업구조를 한 방향으로 잡아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길 저길 기웃거리다간 시간만 보내고 목적지를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사업의 "엘리트주의"를 표방하고 나선 국내업계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조주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9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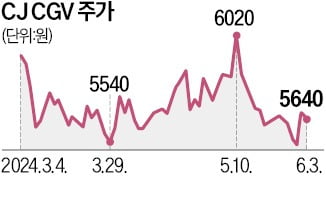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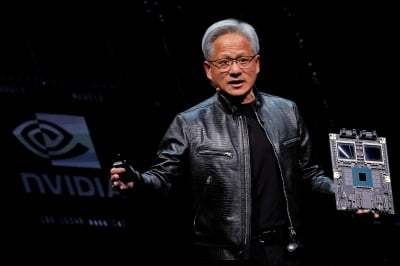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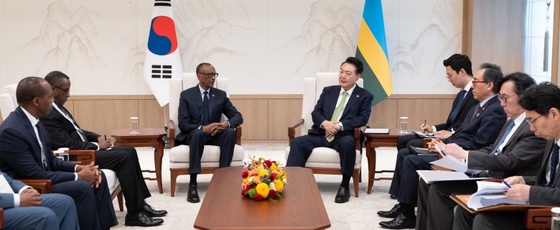


![[단독] 홈플러스, 슈퍼마켓 사업 부문 매각한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22731.3.jpg)
![[오늘의 arte] 예술인 QUIZ : 가택 연금됐던 러시아의 '反푸틴' 감독](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2036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