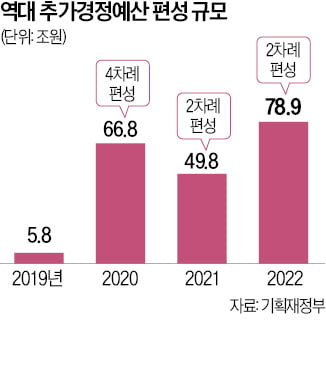[한국의 산업] (8) 반도체 세계제일 굳힌다 <8> 반쪽 1등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현대전자와 KAIST(한국과학기술원)는 최근 주목할만한 작업을 시작했다.
통상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펜티엄칩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한 것.펜티엄
칩은 현재 상용화된 반도체중 최고의 기술수준을 갖고 있는 비메모리
제품이다.
"현대-KAIST 컨소시엄"이 겨냥하는 것은 메모리 일변도의 탈피다.
첨단 비메모리 기술을 확보해 이 분야의 체질을 강화하자는 포석이다.
사실 한국 반도체 산업에는 두개의 상반된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메모리는 세계 정상,비메모리는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반쪽 1등"이라는 비아냥도 받고 있다.
업계 스스로 희랍신화에 나오는 수호신을 빗대 "두 얼굴의 야누스"라고
자조하기도 한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메모리 편중도는 지난해 삼성 LG 현대등 반도체3사가
올린 매출액 구조에서 잘 나타난다.
반도체 3사의 작년 매출액은 6조4천억원.이중 비메모리를 팔아 올린
액수는 약 5천억원 정도다.
전체의 10%에도 못미친다.
비메모리분야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메모리에 대한 과다한 의존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한투자에 따르는 "위험상존"이라는 함정이 따라 다니는 것.메모리는
막대한 설비투자를 요구하는 분야다.
메모리반도체 설비투자 공식에는 "1.7배 이론"이라는 게 있다.
메모리반도체의 세대가 높아질수록 약 1.7배씩 투자액이 늘어난다는
것.이 공식에 의하면 16메가 D램 생산공장 하나를 짓는 데 8천억원정도가
들어갔으니까 64메가D램 공장은 1조3천6백억원이 소요된다.
떼돈을 안겨준다는 D램산업이 자금플로우상으론 항상 네거티브(적자)
상태를 면치 못한다는 얘기도 이래서 나온다.
시장의 부침도 말할 수 없이 심하다.
올림픽 사이클을 따라 경기가 고저의 파동을 탄다고 해서 올림픽
산업이라고 불릴 정도다.
이런 메모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 한국 반도체 산업이다.
모래성과 같은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셈이다.
삼성.LG.현대등 반도체 3사는 올해부터 이 문제를 풀기위한 실질적인
"액션"에 들어갔다.
비메모리분야를 강화해 반도체 산업을 안정시키는 "포트폴리오"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 고부가가치 제품인 비메모리분야에 진출해 사업내용을
"양"에서 "질"위주로 고도화하겠다는 비전도 깔려있다.
삼성전자는 오는 2000년까지 세계 10위권의 비메모리기업으로 올라선다는
목표로 "비메모리 대장정"에 나섰다.
올해 3천억원을 시작으로 오는 2000년까지 총 1조5천억원을 비메모리
반도체 기술개발에 쏟아붓는다.
지난해 8억달러에 불과했던 비메모리 매출을 이때까지 50억달러로
끌어올릴 생각이다.
LG반도체는 매년 매출액의 12%를 이 분야에 투자키로 했다.
이 회사는 1메가D램과 4메가D램 생산라인을 비메모리 제조용으로
전환해 제품 생산비중을 오는 2000년까지 25%로 늘리기로 했다.
현대전자 역시 마이크로프로세서와 ASIC(주문형반도체)를 주력
사업으로 육성한다는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메모리대 비메모리의 사업비율을 65대 35로 조절해 비메모리전문기업으로
탈바꿈한다는 생각까지 갖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3사의 이같은 원대한 계획이 달성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그 중에서도 비메모리반도체 분야의 전문인력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전자제품 제어용 반도체)는
약 30종류다.
반면 일본 NEC는 2백여종을 생산하고 있다.
"D램 일변도의 고속성장 정책은 결국 D램 외에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다는 핸디캡을 안겨주었다"(황인길 아남산업 사장). 반도체와
전자산업이 따로 따로 움직이고 있는 것도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다.
"반도체와 전자제품은 부품과 완성품의 관계다.
때문에 양측은 서로의 기술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연결시스템이 없다"(박종섭 현대전자부사장).
다시말해 서로의 기술발전을 유도할 "시너지체제"가 안돼 있다는 얘기다.
기초기술과 장비가 없다는 것은 메모리분야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다.
삼성전자는 2백56메가D램을 일본업체보다 먼저 개발했다.
하지만 이 제품의 프로토타입(설계완료된 제품)은 일본기업들이
한 발 앞섰었다.
1기가D램도 마찬가지다.
그 이유는 국내에 기초기술과 장비가 없기 때문이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를 검증하고 지원할 기초기술과 장비가
없다"(삼성전자 권오현이사)는 지적이다.
그러나 한국 반도체 산업의 장래는 어둡지만은 않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D램 신화를 이룩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맨땅에서 맨주먹만 가지고 D램신화를 이룩했다.
비메모리분야에서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정해단
통산부차관보)는 말처럼 D램의 저력을 다시 발휘한다면 "제2의 메모리
신화"는 결코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선 설계인력양성등 기술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과
관의 2인3각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1일자).
통상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펜티엄칩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한 것.펜티엄
칩은 현재 상용화된 반도체중 최고의 기술수준을 갖고 있는 비메모리
제품이다.
"현대-KAIST 컨소시엄"이 겨냥하는 것은 메모리 일변도의 탈피다.
첨단 비메모리 기술을 확보해 이 분야의 체질을 강화하자는 포석이다.
사실 한국 반도체 산업에는 두개의 상반된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메모리는 세계 정상,비메모리는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반쪽 1등"이라는 비아냥도 받고 있다.
업계 스스로 희랍신화에 나오는 수호신을 빗대 "두 얼굴의 야누스"라고
자조하기도 한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메모리 편중도는 지난해 삼성 LG 현대등 반도체3사가
올린 매출액 구조에서 잘 나타난다.
반도체 3사의 작년 매출액은 6조4천억원.이중 비메모리를 팔아 올린
액수는 약 5천억원 정도다.
전체의 10%에도 못미친다.
비메모리분야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메모리에 대한 과다한 의존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한투자에 따르는 "위험상존"이라는 함정이 따라 다니는 것.메모리는
막대한 설비투자를 요구하는 분야다.
메모리반도체 설비투자 공식에는 "1.7배 이론"이라는 게 있다.
메모리반도체의 세대가 높아질수록 약 1.7배씩 투자액이 늘어난다는
것.이 공식에 의하면 16메가 D램 생산공장 하나를 짓는 데 8천억원정도가
들어갔으니까 64메가D램 공장은 1조3천6백억원이 소요된다.
떼돈을 안겨준다는 D램산업이 자금플로우상으론 항상 네거티브(적자)
상태를 면치 못한다는 얘기도 이래서 나온다.
시장의 부침도 말할 수 없이 심하다.
올림픽 사이클을 따라 경기가 고저의 파동을 탄다고 해서 올림픽
산업이라고 불릴 정도다.
이런 메모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 한국 반도체 산업이다.
모래성과 같은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셈이다.
삼성.LG.현대등 반도체 3사는 올해부터 이 문제를 풀기위한 실질적인
"액션"에 들어갔다.
비메모리분야를 강화해 반도체 산업을 안정시키는 "포트폴리오"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 고부가가치 제품인 비메모리분야에 진출해 사업내용을
"양"에서 "질"위주로 고도화하겠다는 비전도 깔려있다.
삼성전자는 오는 2000년까지 세계 10위권의 비메모리기업으로 올라선다는
목표로 "비메모리 대장정"에 나섰다.
올해 3천억원을 시작으로 오는 2000년까지 총 1조5천억원을 비메모리
반도체 기술개발에 쏟아붓는다.
지난해 8억달러에 불과했던 비메모리 매출을 이때까지 50억달러로
끌어올릴 생각이다.
LG반도체는 매년 매출액의 12%를 이 분야에 투자키로 했다.
이 회사는 1메가D램과 4메가D램 생산라인을 비메모리 제조용으로
전환해 제품 생산비중을 오는 2000년까지 25%로 늘리기로 했다.
현대전자 역시 마이크로프로세서와 ASIC(주문형반도체)를 주력
사업으로 육성한다는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메모리대 비메모리의 사업비율을 65대 35로 조절해 비메모리전문기업으로
탈바꿈한다는 생각까지 갖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3사의 이같은 원대한 계획이 달성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그 중에서도 비메모리반도체 분야의 전문인력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전자제품 제어용 반도체)는
약 30종류다.
반면 일본 NEC는 2백여종을 생산하고 있다.
"D램 일변도의 고속성장 정책은 결국 D램 외에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다는 핸디캡을 안겨주었다"(황인길 아남산업 사장). 반도체와
전자산업이 따로 따로 움직이고 있는 것도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다.
"반도체와 전자제품은 부품과 완성품의 관계다.
때문에 양측은 서로의 기술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연결시스템이 없다"(박종섭 현대전자부사장).
다시말해 서로의 기술발전을 유도할 "시너지체제"가 안돼 있다는 얘기다.
기초기술과 장비가 없다는 것은 메모리분야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다.
삼성전자는 2백56메가D램을 일본업체보다 먼저 개발했다.
하지만 이 제품의 프로토타입(설계완료된 제품)은 일본기업들이
한 발 앞섰었다.
1기가D램도 마찬가지다.
그 이유는 국내에 기초기술과 장비가 없기 때문이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를 검증하고 지원할 기초기술과 장비가
없다"(삼성전자 권오현이사)는 지적이다.
그러나 한국 반도체 산업의 장래는 어둡지만은 않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D램 신화를 이룩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맨땅에서 맨주먹만 가지고 D램신화를 이룩했다.
비메모리분야에서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정해단
통산부차관보)는 말처럼 D램의 저력을 다시 발휘한다면 "제2의 메모리
신화"는 결코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선 설계인력양성등 기술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과
관의 2인3각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