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일자) 주력업종제와 자율성 존중
30대기업집단에 대해 "주력업종및 주력기업군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비슷한 취지로 지난 91년6월 여신관리제도의 개편을 통해 "주력업체"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업종분류가 지나치게 세분되어 업체중심으로 운영되고
성장잠재력과는 관계없이 자금수요가 큰 업체가 선정되는 잘못이 있었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업종전문화와 주력기업의 대형화를
유도한다는 정책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번의 제도개편이 이루어졌는데 그
특징과 유의사항을 몇가지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업종 사이의 기술교류및 응용이 활발하고 하나의 제품생산에
여러부문이 관련되는 요즘의 산업발전추세를 고려할때 지윈대상을 업체에서
업종으로 바꾼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따라서 새 제도에서의
주력업종선정은 대분류에 따르며 여기에 속하는 기업은 몇개라도 모두
주력기업으로 선정될수 있다. 다만 선정과정에서 기업공개여부
소유분산정도 재무구조등이 고려되어 주력기업이 자금조달창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둘째 기업경영측면에서도 위험분산을 위해 어느정도의 사업다각화는
불가피한 점이 있는데 이번 조치는 관련다각화를 허용하되 비관련다각화는
규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의 10대그룹은 평균 11개업종에
걸쳐 다각화하고 있는데 비해 일본의 40대그룹은 평균 5개업종에 진출해
있다.
이같은 지적과 함께 "문어발식 기업확장"으로 대표되는 무분별한 다각화의
폐해를 생각할때 정책방향에는 수긍이 간다. 문제는 진출업종의 수가
5개냐 10개냐가 아니라 관련다각화로 포함되느냐 아니냐는 것으로
성격판정이 쉽지않다는 점이다. 비록 주력업종을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한다고 하지만 여신관리,기술개발자금,공업입지등에서의 우대조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개입이 없을수 없다.
특히 여러그룹에서 같은 업종을 주력업종으로 신청할 경우 자칫하면
과잉중복투자를 유발할수 있으며 이를 막기위한 교통정리에는 마찰이
따를수 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업종전문화를 강제하는 대신으로 약속된 여러 지원방안은
금융자율화,UR협상에서의 보조금규제 등을 고려할때 한시적일수밖에 없는데
과연 97년까지 바라는 효과를 거둘수 있느냐가 의심스럽다.
경쟁력강화에는 정부의 규제와 지원보다 시장경쟁이 더 효과적이므로
하루빨리 여신관리제도를 없애고 공정거래가 보장되는 환경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된다.
고도성장기간에 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집단은 적지않은 기여를
한것이 사실이며 이제 새로운 경제환경을 맞아 소유분산,시장개방,공정경쟁
등의 과제를 피할 길은 없다. 다만 이과정에서 정부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정책의 우선순위와 기대효과를 명확히 하여 전환기의
조정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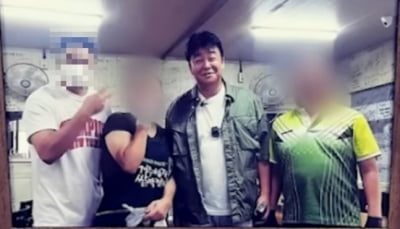











![[단독] 홈플러스, 슈퍼마켓 사업 부문 매각한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22731.3.jpg)
![[오늘의 arte] 예술인 QUIZ : 가택 연금됐던 러시아의 '反푸틴' 감독](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2036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