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칼럼] 김무성 대표의 노동개혁 믿어도 되나
임금과 해고 유연성 확보가 관건
철도파업 때 실수 되풀이 말아야
정규재 주필 jkj@hankyung.com
![[정규재 칼럼] 김무성 대표의 노동개혁 믿어도 되나](https://img.hankyung.com/photo/201507/02.6926659.1.jpg)
노동개혁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떤 수단이 동원되는지, 핵심적인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복잡한 질문들을 김 대표가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 김 대표는 해명해야 할 시빗거리도 남겨 놓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꽤 결연한 것처럼 보이면서 철도노조 파업에 맞섰을 때, 그리고 22일간의 인내 끝에 승리를 목전에 두었을 때, 노조에 퇴로를 열어주면서 개혁을 좌절시킨 치명적 실수를 범한 장본인이 바로 그였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노동개혁이라는 언어에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노조는 이미 권력구조 속에 깊숙이 침투하여 한두 마디 엄포나 공갈로 개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대기업들에 거미줄처럼 파고들어 철철 피를 흘리는 수술이 아니고는 개혁이 불가능하다. 사회 속에 뿌리를 내려 그들을 제거하려면 역시 사회 전체가 크고 작은 생채기를 견뎌야 한다. 노동법 전체를 자유노동 계약 체제로 재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직원들의 밥그릇부터 모두 치워야 한다. 사회적 합의 체제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노사정위원회도 폐지해야 한다. 각급 정부 위원회에 침투한 노조 대표들도 축출돼야 한다. 작은 사례지만 국민연금 위원회에 침투해 있는 노조대표도 철수시켜야 한다. 노조 간부와 시민단체 대표가 사회적 감투가 되는 동안은 노동시장 개혁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김 대표는 최근의 일만 하더라도 공무원 노조의 압력에 굴복해 너무도 쉽게 쥐꼬리 연금 개혁을 수용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국회에서 첫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노라고 자랑하는 김 대표의 계면쩍은 얼굴에서 공무원노조 개혁에 대한 고뇌는 흔적을 찾기 어렵다.
참고로 지금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정부가 내건 노동개혁의 주요 항목을 한 번 들려 드려야 할 것 같다. 우선 파업을 어렵게 만드는 각종 조치들이 포함됐다. 조합원 50% 이상이 참여해서 투표자 50%가 찬성해야 파업할 수 있다. 핵심 공공 사업장은 재적 조합원의 40%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포괄적 파업 위임은 불가능하다. 노조의 정치분담금 의무납부를 폐지하고,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파업 참여를 강제하지도 못한다. 파업 시 사용자의 대체인력 고용을 허용하고, 노조 회계를 감사하며, 노조의 위법활동은 정부가 직접 조사한다. 작업장 내 피켓 시위도 경찰에 신고해야 가능하다.
파업 규제가 캐머런 노조개혁의 골자인 셈이다. 김 대표가 직면한 노동개혁은 더 포괄적이다. 소위 ‘87 체제’로 노동세력이 정치과정에 진입한 이후 노동시장은 그동안 단 한 번도 개혁된 적이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임금과 해고의 유연성이다. 고용의 의무만 있고 해고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지금 한국의 노동시장이다. 임금과 고용의 유연성 없이는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할 방법도 없다. 이를 위해선 노조의 무한정한 파업 권력부터 줄여야 한다. 작업장 내 파업이나 노조활동은 금지돼야 한다. 대체인력 고용이 보장돼야 노사 간 균형을 잡을 수 있다. 정부가 노동시장에서 모든 자의 행동규칙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고 드는 잘못된 습관은 전면 폐기돼야 마땅하다. 통상임금 재판에서 보듯이 법원은 행정지도나 유권해석 따위의 법적 유효성을 모조리 부정하는 중이다. 지금 정부가 정하는 임금피크제도 같은 운명이다.
아뿔싸, 그러고 보니 지난주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분도 마당발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노동개혁이라는 단어에 상투성만 더하는 것은 아닌지.
정규재 주필 jkj@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밀양 성폭행 피해자 반박 "가해자 44명 공개 동의한 적 없다" [전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6949152.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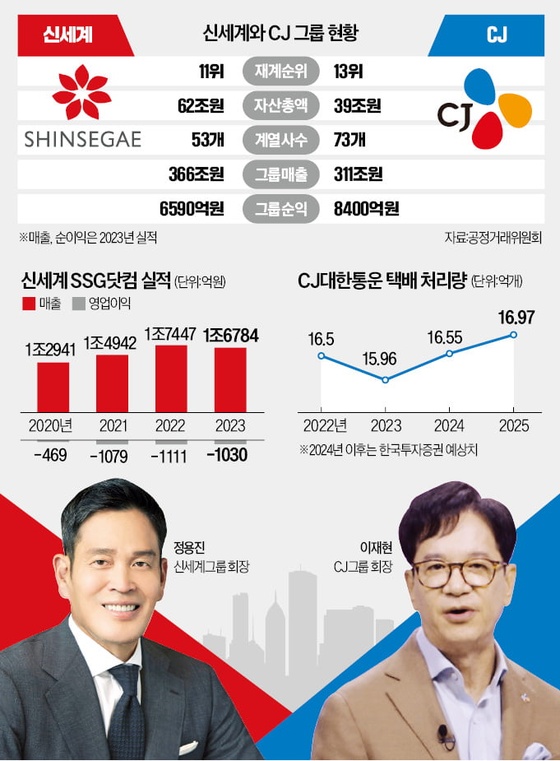





![[오늘의 arte] 티켓 이벤트 : 서울시향 드보르자크 교향곡 8번](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4448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