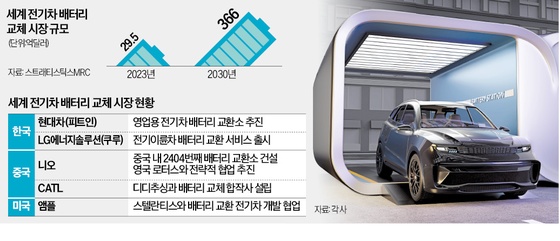[다산칼럼] 세제개편, 통일·고령화 대비한 것이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눈앞의 정책목표에 매몰되지 말고
국민생활 변화추세를 볼 줄 알아야
< 이인실 서강대 경제학 교수 insill723@sogang.ac.kr >
![[다산칼럼] 세제개편, 통일·고령화 대비한 것이어야](https://img.hankyung.com/photo/201409/AA.9092632.1.jpg)
돌아보면 격세지감이다.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세원(稅源)을 양성화하고자 1999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할 때만 해도 이렇게 카드 사용이 세계적 화제로 등장할 줄은 몰랐다. 이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축소하는 것이 논란의 대상이다. 도입 목적대로라면 일몰제도인 소득공제제도는 벌써 폐지됐어야 했다. 그동안 다섯 번이나 일몰기간이 연장됐고 올해 말 다시 일몰이 돌아오지만 당초 공언한 바와는 달리 정부는 지난해 기준 1조3800억원에 달하는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혜택을 2년 더 연장할 예정이다. 정부가 증세는 없다고 해놓고 담뱃세와 지방세 인상 등 증세를 한다고 반발이 심한 상황에서 수명이 다한 이 제도를 유지키로 한 것은 내년도 세제개편에 대한 국회 논의를 앞둔 조세정책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선진국일수록 조세정책은 선거에 민감하다.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핵심정책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은 민주화와 정권교체를 겪으며 감세와 지출축소라는 보수의 이념과 증세와 지출확대라는 진보의 이념 구분이 모호해졌다. 조세정책이 선거정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미국에서조차 진보와 보수 사이의 조세이념이 모호해져 가는 것은 마찬가지다. 국민들의 조세저항 때문이다. 작년 세법개정안에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여야가 모두 나서서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반대해 조정조차 못했다. 이처럼 조세혜택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개인의 경제활동에 항구화되면 줄이기 쉽지 않다. 이제 조세정책은 이념 논쟁이 아니라 세제개편을 통해 누구에게 세금이 얼마만큼 귀착되는가가 중요해지고 있다. 세제개편을 가진 자와 재벌 봐주기 시각에서만 봐서는 안된다.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 논쟁이다. 그동안 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나 내렸고 각종 세액공제제도로 세부담을 줄였으며, 환율정책 등의 지원으로 혜택을 본 대기업에 세금을 물리자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자연인이 아닌 법인에 대한 세부담은 결국 주주와 노동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세율이 낮아졌다고 해도 국세 중 법인세 비중은 1990년 15% 수준에서 꾸준히 늘어나 2003년 20%대에 진입한 이후 작년까지 20%를 웃돌고 있다. 2012년 기준 총 조세 중 법인세 비중은 14.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8.6%보다 높으며 OECD 국가 중 노르웨이, 호주 다음으로 높다.
올해도 정기국회에서 세제개편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하지만 지금 세제개편안을 놓고 심각하게 봐야 할 것은 하나하나의 세제가 아니라, 전체 세제의 큰 그림으로 국민생활이 어떻게 변하느냐다. 역대 정권이 조세를 신용카드 사용 장려나 부동산경기 회복 등 정책적 목적에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언제 어느 때 닥칠지 모를 통일과 더불어 세계에서 유례없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세제개편을 최우선시 해주길 바란다.
조세제도는 한 번 도입하면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 크게 앞을 내다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에서 얻은 교훈이다.
< 이인실 서강대 경제학 교수 insill723@sogang.ac.kr >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한국은 '산 넘어 산' 인데…최저임금 차등 확대 나선 일본 [김일규의 재팬워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027844.3.jpg)
![S&P·나스닥 또 역대최고…'60조원대 머스크 성과 보상안' 테슬라 주총서 가결 [모닝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ZA.37016514.3.jpg)
![프롭테크업계 "AI기술 접목하려면 특화된 데이터 확보해야" [Geeks' Briefing]](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027571.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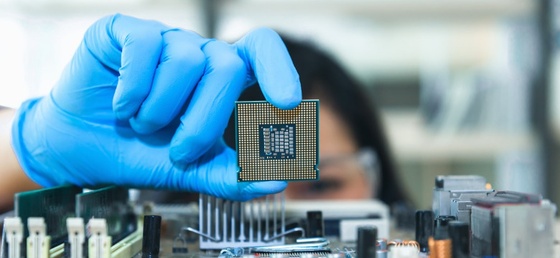
![금리인하 '연내 1회' 축소에도…S&P·나스닥 또 최고치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7017767.1.jpg)

![[단독] 새마을금고 '특판 예금' 가입했는데…"파산 위기라니"](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01262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