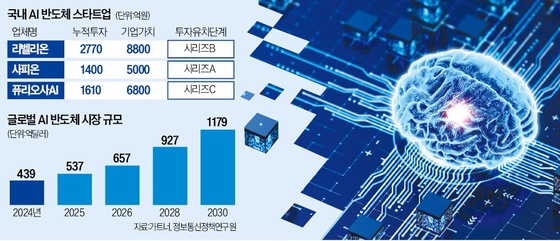[책마을] 생존위해 독약도 마다않는 인간…우리의 현주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깊은 마음의 생태학
김우창 지음 / 김영사 / 516쪽 / 2만7000원
![[책마을] 생존위해 독약도 마다않는 인간…우리의 현주소](https://img.hankyung.com/photo/201403/AA.8488148.1.jpg)
김 교수의 신간 《깊은 마음의 생태학》이 주목하고 있는 점도 이에 닿아 있다. “오직 나 또는 인간만을 위한 인간중심주의 때문에 우리가 자연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만들고 소비해야 하는 곳이다. 그러나 무작정 자원을 소모한다면 지구는 버텨낼 수 없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나중에 어찌 되든 우선 독약도 사양하지 않는 험한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 왔었다. 가차없는 생존 투쟁의 세상에서 인간에 대한 고려도 없는 마당에 자연을 돌아볼 여유가 어디에 있겠는가.”(452쪽)
김 교수는 “모든 과학기술을 동원하여 자연 만물을 사람의 편의대로 봉사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더 이상 새삼스럽지 않은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고 비판한다.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다. “오늘의 자본주의는 서구 합리주의가 확대되면서 사람들의 경쟁은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경쟁이 행복한 삶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책마을] 생존위해 독약도 마다않는 인간…우리의 현주소](https://img.hankyung.com/photo/201403/AA.8487797.1.jpg)
김 교수가 수십년 동안 사유해온 결과물인《깊은 마음의 생태학》은 특별한 메시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깊은 마음의 생태학이란 겸손함을 갖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세상의 넓은 관계를 보라는 함축적 의미다. 누구든 할 수 있는 말처럼 들린다. 하지만 언제나 어떤 편에 속해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낯설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진리와 정답에만 목말라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적지 않은 분량에 언뜻 복잡해 보이지만 저자가 말하는 바는 단순 명쾌하다. 인간의 마음 깊이에 대한 신뢰와 존재 전체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삶이 가능하다는 것. 이 존재는 자연과 우주까지도 포함한다. 자연에서 느끼는 절실한 마음으로, 존재의 신비에 대한 외포감으로 인간의 마음을 열어야 ‘깊은 마음의 생태학’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김 교수가 본 생태학이다.
한국 인문학의 거인이 내는 목소리를 한번에 이해하기는 어렵다. 저마다의 삶을 다양성과 자율성 그 자체로 보는 그이기에 사유의 복잡함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너는 어느 쪽이냐고 묻는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 사실과 이성을 따라 열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깊이를 만날 수 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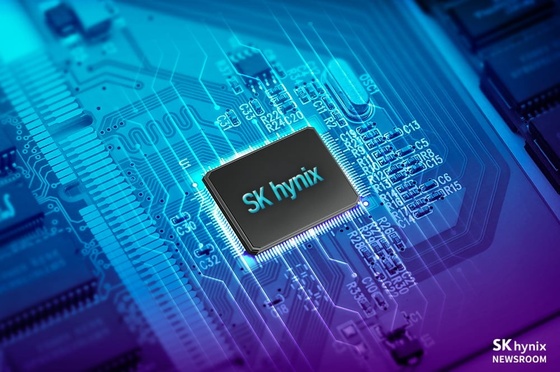
![금리인하 '연내 1회' 축소에도…S&P·나스닥 또 최고치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7017767.1.jpg)

![[단독] 새마을금고 '특판 예금' 가입했는데…"파산 위기라니"](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01262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