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을] 몸 교환 대가로 19억 주겠다면 당신은?
'육신교환' 통해 인간존재 성찰…"운명 긍정하면 새로운 삶"
내 몸 앞의 삶
복거일 지음 / 문학과지성사 / 221쪽 / 1만원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 사고 실험은 우리의 몸과 정신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이 논의는 철학책의 한 부분이 아닌 소설의 한 장면이다. 소설가이자 시인, 사회 평론가로 왕성하게 활동하며 다양한 글쓰기를 해온 복거일 씨(66)의 열한 번째 장편소설 《내 몸 앞의 삶》이다.
‘윤 선생’이 “역시 뇌를 가진 쪽이 원래의 사람인 것 같다”고 답하자 상대방은 논의를 더욱 확장시킨다.
“그러문 그 두 사이보그들이 인간 배우자를 만나서 같이 살게 됐다고 상상해봅세다. 여자든 남자든 같습네다. 사람 뇌를 가진 사이보그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네다. 사람 몸을 가진 사이보그는 아이를 낳을 수 있디요. 세월이 지나문, 그 사람은 자식, 손주, 증손주로 대가 이어질 것입네다. 뇌가 없는 사이보그를 통해서 자식들이 나왔다는 사실은 전혀 영향을 미치디 않디요.”
이 철학적 논의가 이뤄지는 소설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2074년 ‘북조선’. 주인공 윤세인은 대학 1학년일 때 반중국 독립운동 혐의로 체포돼 중국에서 25년간 강제노역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개방과 자유화를 추구하는 새 북한 정권의 필요에 따라서다. 사상범으로 몰려 노역 중인 지식인이 풀려났을 때 개방에 대한 정권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 하지만 막상 돌아온 함흥에는 가족도 친구도 남아 있지 않다. 그가 고심 끝에 찾아간 곳은 대학 시절 연인인 박민히의 집이다. 그는 반갑게 맞아주는 옛 애인과 예상치 못했던 딸 신지에게서 행복을 느끼며 새로운 삶의 의지를 다지지만, 그들에게는 새 가족이 있었다.
윤세인은 신지가 곧 결혼을 할 예정임을 알았으나 혼인 비용을 댈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해 시댁 식구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까 봐 걱정한다. 어린 나이 때부터 강제 노역에 묶여 있던 터라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 괴로워하던 그는 재교육 기관에서 만난 중개업자 전세훈을 통해 ‘육신교환 수술’에 대해 알게 된다. 육신교환 수술이란 젊은 몸과 늙은 몸의 뇌를 서로 바꾸는 일로, 중국의 부자들이 북한의 가난한 젊은이들의 몸을 사서 생명을 연장하는 데 이용하고 있었다. 음성적으로 횡행하고 있는 이 산업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해 안전한 수술과 섭섭하지 않을 만큼의 대가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결국 윤세인은 중국 돈 1100만위안(약 19억원)이라는 거금을 받고 40대인 자신의 몸을 팔아 60대의 몸으로 살기를 결정한다. 그가 바꿀 몸은 예전에 중국인 부자에게 이미 팔린 적이 있는 조선인의 것이었다.
소설은 때로는 슬픈 인간의 삶과 덧없는 젊음에 대한 질문을 담담한 문체로 던진다. 속도감 있는 이야기와 군더더기 없는 전개가 간단치 않은 소설의 주제를 흥미롭게 만든다. 작가가 이 덧없는 운명을 그리는 방식은 자기 연민이나 허무주의가 아니라 운명을 긍정하며 얻는 새로운 삶이다. 윤세인은 60대의 몸으로 살기로 결심한 후 바꾼 몸의 주인 ‘리진호’가 살던 곳으로 찾아간다. 이제는 자신의 것이 된 육체에 대한 ‘예의’ 때문이다. 고심 끝에 찾아간 곳에서는 리진호의 아내가 수십년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혹시라도 남편이 찾아올까 이사도 하지 못한 채.
윤세인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던 생각을 바꿔 ‘리진호’로 살아가기로 결심한다. 새로운 기술로 인해 하루 만에 늙어버린 자신의 운명을 긍정하는 것이다. 그는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지막이 말한다. “이것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나를 기다린 운명이었나.”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변우석·김지원 '진땀' 뺀 이유…아이돌급 인기에 '몸살' [이슈+]](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896445.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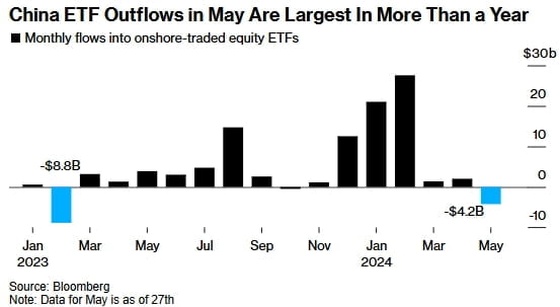








![[책마을] 아시아의 바다는 한순간도 잠잠한 적이 없었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AA.3689480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