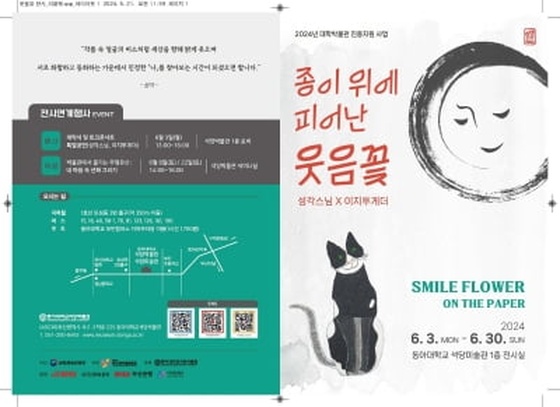[정규재 칼럼] 스탈린 직함이 서기장이었던 사연
행정을 길거리 투표로 만들건가
정규재 논설실장 jkj@hankyung.com
인민위원회는 집행과 의사결정을 겸하는 조직이다. 인민재판이라고 하게 되면 입법 행정 사법을 전횡하는 혁명적 조직으로 승격된다. 위원회는 사회적 대화이며 따라서 전원 합의 정신과 원리의 지배를 받는다. 이것이 민주적 의사결정체인 국회와 다른 점이다. 중국 공산당은 솔직하게 국가주석이라는 이름이나마 썼다. 북한은 위원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재미있게도 상무 위원은 김정일 한 사람밖에 없었다. 형식상의 위원회조차 내걸린 이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상황이다.
전원 일치의 사회적 합의라는 말은 실은 기만이거나 위선이거나 사기극이다. 서기장이 지배하는 사무국이 위원회에 올리는 안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추상적 구호이거나 이념적 슬로건이거나 도덕적 명분으로 바뀐다. 누구라도 동의할 수 있는 낮은 수준의 의사결정이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 착하게 살자”든가 “애국심을 갖자”는 등의 슬로건형 안건이 아니면 위원회에 상정되기 어렵다. 치열한 갈등적 주제는 아예 사무국의 전결사항으로 격하되고 전원 일치를 볼 만한 낮은 단계의 주제들만 거꾸로 위원회에 상정된다. 대중 민주주의 혹은 인민 민주주의는 그런 체제다. 대부분 혁명이 독재로 끝나는 이유다.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주제는 아예 위원회에 상정되지 않는다. 인민대표자 대회나 전당대회가 전원 합의를 전면에 내걸면서 실은 숨겨진 독재 기구에 모든 것을 양도하는 거수기로 전락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전원 합의를 보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테러리즘이고 다른 하나는 뇌물이다. 소련은 이 두 가지 전술 모두에 의존해왔다. 북한도 그렇다. 중국은 후자였던 것 같은데 보시라이 사건을 보면 전자의 방법도 한 번씩 써먹는 것같다. 테러나 부패를 기획하는 곳은 스탈린과 김정일이 직접 지배하는 사무국이다. 구체적 결정을 내리면서 전체 위원회의 박수를 유도하는 것 모두를 기획한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파괴된다.
이것이 위원회들이 겉도는 이유다. 대한민국의 합의제 행정 기구는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있다. 행정기구 아닌 위원회는 수백 개로 늘어난다. 대통령령 이상에서 설치된 위원회만도 500개다. 부령이나 훈령 등 하위 규정으로 설치된 소위 자문위원회는 아마 700~800개에 달할 것이다. 둘 모두를 합치면 1000개가 넘는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크게 늘어났다가 MB정부 들어 크게 줄이는 척했던 바로 그 위원회다.
위원회는 안철수 후보의 말마따나 국민적 대화나 사회적 합의를 명분으로 만들어진다. 그게 독임제 행정기관과의 차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전문가 시스템인 독임제 행정조직에 의해 뒷받침되는 그런 정치를 말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전문가 시스템을 우회하는 대중 통치 영역에서 만들어진다. 국민을 처벌하거나 이념의 중립이 필요한 주제를 다루는 행정조직은 종종 위원회로 설립된다. 금융위나 공정위가 그런 곳이다.
안 후보는 엊그제 청년 일자리를 위해 일자리와 복지, 경제민주화를 다루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아마 경제민주화로 재벌을 겁준 다음 일자리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를 모양이다. 아니라면 이 두 가지 주제가 하나의 위원회로 결합될 이유가 없다. 이미 교육개혁위원회, 재벌개혁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안철수 진영이다. 벌써 세 번째다. 대통령 아래에 청와대 직할 유사 행정부를 만들고 여기서 서기장 노릇을 하고 싶은 것인가. 아마추어리즘 냄새가 정말 풀풀 난다. 정당 정치를 모르는 줄만 알았는데 실은 정부와 행정에 대해서도 백치라는 고백들이다. 노무현의 동아리 수준 정치를 학예회로 또 격하시킬 작정인가.
정규재 논설실장 jkj@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속보] '오물 풍선' 살포에…정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논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23036541.3.jpg)

![[속보] 대통령실, NSC 상임위 소집…북한 오물 풍선 논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ZA.36908265.3.jpg)


!["심각한 고평가"…AI 서버 수요 의심 커졌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B202406010655477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