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을] 정감록은 성리학에 대한 평민의 '대항 이데올로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백승종 지음 / 푸른역사 / 400쪽 / 1만8000원
동학농민군이 꺼내 확인했다는 선운사 도솔암마애불의 비결서처럼 한반도에는 나라의 앞날을 예언하는 비결서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대표적인 게 《정감록》이다. 그런데 이 예언서 속의 ‘정도령(鄭姓眞人)’은 누구일까. 계룡산은 예언과 어떤 관계가 있고, 십승지(十勝地)로 불리는 명당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
한국의 예언문화사를 천착해온 백승종 씨가 《정감록 미스터리》를 통해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구했다. 저자는 몇 가지 단편적인 단서로 정감록에 담긴 의미의 변천을 역사적으로 정리했다.
저자는 “정감록은 조선시대 지배이데올로기인 성리학에 맞서 평민 지식인들이 준비한 대항이데올로기였다”고 말한다. 《조선왕조실록》 영조 15년(1739) 8월 기록에 정감록이 처음 등장한다. ‘이미 서북 변방(평안도와 함경도)의 사람들이 ‘정감의 참위(讖緯)한 글’을 서로 널리 전했다. 그래서 조정 신하들이 그 책을 불살라 금지시키기를 청했다’는 것이다. 정감록은 적어도 1739년 이전에 정치적으로 홀대받던 서북지방 사람들의 손에서 탄생했을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정감록은 정도령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 정감록은 정감과 이심, 이연 형제가 대화하는 형식이다. 저자는 “정도령은 정성진인 또는 진인(眞人)이라고 언급되는데 이는 조선 왕조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대표한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굳이 정씨라고 하는 데는 민중의 집단적 기억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조선 태조의 즉위를 반대하다 죽은 정몽주, 왕조 건립의 주역이었으나 태종에게 제거된 정도전, 선조 때 역적으로 몰려 죽은 정여립, 영조 때 반란 사건에 휩쓸린 정희량 등 정씨는 조선왕조와 상극이므로 새로 일어날 나라에서는 정씨가 왕이 돼야 한다는 신앙으로 굳어진 것이란 얘기다.
저자는 정감록 속에 나타난 계룡산의 의미와 관련, “계룡이란 이름에 성스러운 통치자의 출현 또는 새 세상의 시작이란 뜻이 담겨 있다”고 풀이한다. ‘계’, 즉 닭은 새벽을 알리는 일을 하므로 새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용’은 세상에 좋은 변화를 가져다주는 영물이자 성스러운 지배자를 뜻한다. 여기에 회룡고조와 산태극 수태극의 풍수설이 스며들면서 계룡산이 정씨가 도읍해 800년을 누릴 길한 땅이 됐다는 설명이다.
저자는 “정감록에는 겉으로는 늘 절망을 말하면서도 남몰래 희망의 씨앗을 감춰두고 싶어 하는 민중들의 비밀화법이 녹아 있다”며 “사람들은 이 예언을 나침반 삼아 난세를 살아갈 길을 찾으려 노력했다”고 말한다. 또 “그 예언이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했느냐는 것은 별개 문제”라며 “어디까지나 대안이라는 점에서 예언서 정감록의 생명이 오래 유지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김재일 기자 kjil@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오늘의 arte] 티켓 이벤트 : 뮌헨 체임버 오케스트라](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AA.37010608.3.jpg)





![[단독] 새마을금고 '초비상'…124곳에 '부실 딱지'](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001326.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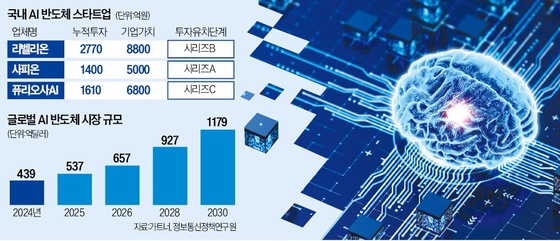





![[오늘의 arte] 티켓 이벤트 : 뮌헨 체임버 오케스트라](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010608.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