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을] '영혼의 조미료' 찾아라…香은 세계 질서도 재편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천국에서 온 사랑의 묘약' 유럽인 탐욕 부추겨
스파이스 / 잭 터너 지음 / 정서진 옮김 / 따비 / 592쪽 / 2만5000원
15~16세기 대항해시대 유럽 항해사들의 마음속 시선은 한곳을 향했다. 인도네시아 군도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몰루카 제도였다. 상상의 나침반이 이끌어주기를 원했던 몰루카 제도에는 떼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있었다. 정향(丁香)이라 불리는 향신료 클로브였다. 클로브는 몰루카 제도의 다섯 섬, 테르나테 티도레 모티 마키한 바칸 밖에서는 자라지 않았다.
중국 한나라 조신들이 황제를 알현할 때 입냄새를 없애기 위해 썼다는 클로브는 ‘향신료 전쟁’의 요인이기도 했다. 당시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네덜란드 등은 향신료를 확보하기 위해 정면 충돌도 불사했다. 누구나 ‘엘도라도(황금향)’뿐만 아니라 ‘엘 피칸테(매운맛 향신료)’를 찾으려고 범선을 띄웠다. 역시 몰루카 제도가 원산지인 넛메그(육두구)와 메이스, 인도 남부 말라바르 해안에서 자라는 후추, 스리랑카가 원산지인 시나몬도 탐험과 발견, 세계 재편의 촉매였다.
유럽인들은 왜 향신료에 집착했을까. 《스파이스》는 이 물음에 대한 해설서 격이다. 대항해시대를 중심으로 향신료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낸다. 저자는 유럽인들에게 있어 향신료의 의미는 경제적인 부(富)만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향신료는 음식 맛을 내는 것 이상의 매력이 있었다. 이미지, 전설, 환상으로 불룩한 욕망의 보따리였다. 신성이자 천국이었고, 섹스와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상징으로서 유럽인들을 끊임없이 매혹시켰다는 것이다.
향신료의 역사는 대항해시대에 국한되지 않는다. 향신료의 역사는 수만 년에 걸쳐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 기원전 1224년에 죽은 람세스 2세 미라의 코에서 발견된 후추 몇 알은 기원전 13세기 이집트와 아시아에서 향신료 교류가 있었다는 증거다. 로마인들은 시나몬을 태운 연기로 죽은자의 영혼을 하늘로 인도했고, 중세의 기독교인들은 향신료를 시신에 바르는 것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따르는 길이라고 여겼다.
저자는 “향신료가 갖는 매력은 그것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고 말한다. 먼 동방에서 온 향신료는 순전히 다른 세상의 것이었다. “유럽인은 향신료가 파라다이스, 즉 지상낙원에서 자란다고 믿었”던 것이다. 향신료의 향은 낙원의 환상 속에서나 접할 수 있는 영혼의 조미료였다.
물론 향신료는 특별한 식재료였다. 기원전 1세기께 잉글랜드에 주둔한 로마 군대는 음식 맛을 돋우기 위해 후추를 썼다. 중세에는 와인의 시큼한 맛을 덮기 위해 여러 향신료를 첨가했다. 고기의 상한 맛을 감추기
해서가 아니라 소금에 절인 짠맛을 상쇄하기 위해 향신료를 뿌렸다.
향신료는 건강을 위한 처방이기도 했다. 향신료는 차갑고 습한 음식을 해독하는 용도로 첨가됐다. 염증을 치료하는 데는 후추를, 관절염에는 시나몬을, 소화기 질병에는 카시아를 썼다. 나쁜 공기가 병을 부르고 좋은 공기는 병을 막아준다는 생각에 향을 피워 기분을 좋게 했다.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향이었다.
‘사랑의 묘약’으로서의 향신료 효과도 회자됐다. 18세기까지 유럽인들은 수도사이자 의학자인 아프리카의 콘스탄티누스 조언을 따랐다. 발기부전에는 생강, 후추, 시나몬, 여러 허브로 만든 미약을 복용했다. 아침 발기에는 우유에 담근 클로브를 먹기도 했다.
향신료의 매력은 희소성에도 있었다. 왕족과 귀족들은 향신료를 흥청망청 써대며 권력과 부를 과시했다. 그러나 저자는 향신료의 비밀이 풀리고, 산지도 확산되면서 그 매력도 사라지게 됐다고 말한다. 1818년께
푸아브르란 프랑스인이 클로브 모종을 훔쳐 심어 모리셔스섬에서부터 마다가스카르, 잔지바르 등으로 클로브 재배가 확대됐다. 지금은 클로브 이동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인도네시아가 수입국이 됐을 정도다. 담배와 고추, 커피와 차, 설탕 등 다양한 기호품이 등장한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저자는 종교의식에 사용된 향신료의 신비하고 주술적인 특징이 사라진 게 향신료가 그저그런 여러 재료의 하나가 된 주된 이유라고 말한다.
김재일 기자 kjil@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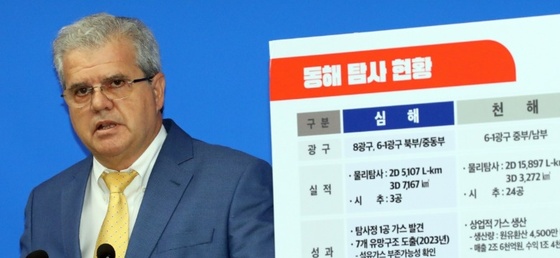

![옥수수 가격 반등…에탄올 수요가 견인 [원자재 포커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597335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