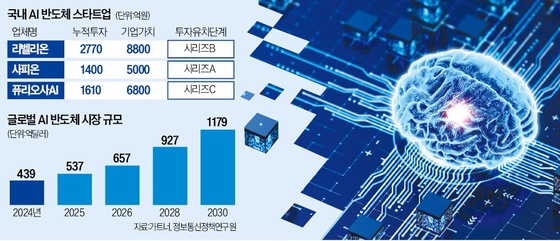[책마을] 아, 우리 어머니…韓·日작가의 '두 시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용택의 어머니, 전형적인 한국의 모성 다뤄…감성적 사진에 눈시울 붉어져
내 어머니의 연대기 / 이노우에 야스시 지음 / 이선윤 옮김 / 학고재 / 232쪽 / 1만3000원
내 어머니의 연대기, 치매 걸린 모친 간호…시종일관 건조하게 표현
가정의 달을 맞아 한국과 일본의 유명 작가가 각각 자신의 어머니를 그린 책이 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섬진강 시인’ 김용택 씨의 《김용택의 어머니》, 작고한 일본의 국보급 작가 이노우에 야스시가 쓴 《내 어머니의 연대기》다.
이미 많이 늙어버린 작가가 자신의 기원(起源)인 어머니를 바라보는 감정은 애절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책 속에 나타난 저자의 성향 차이야 물론 있겠지만, 표현하는 방법은 한·일 양국 사람들의 보편적 감정 표현과 상당히 닮아 있다. 한국과 일본 사회의 어떤 단면처럼 말이다.
《김용택의 어머니》에는 익숙한 한국적 정서가 흐른다.
‘복숙아/니 학교 그만둔 것/징검다리를 건너다가도/밭을 매다가도/그냥 우두커니 서지고/호미 끝이 돌자갈에 걸려/손길이 떨리고/눈물이 퉁퉁 떨어져/콩잎을 다 적신다/이 에미가 이렇게/가슴이 미어지는디/너사 을매나 가슴이 아프겠냐’(‘딸에게’ 중)
김씨의 어머니 박덕성 여사는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다. 가난 탓에 딸이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된 것에 가슴을 치며 우는 어머니다.
책은 어머니가 얘기해준 것을 김씨가 받아쓰고 옮겨적은 것이다. 김씨가 “사실 어머니의 시를 베껴 썼다”고 말할 만큼 박 여사는 문단 안팎에서 삶과 생명에 대한 혜안을 지닌 ‘어머니’로 통했다. 책 속에 배치된 시와 글, 사진이 감정선을 툭툭 건드린다.
‘차가 차부를 벗어나 조금 가니, 저기 조그마한 어머니가 뙤약볕 속을 부지런히 걷고 있었다. 내가 탄 차가 지나가자 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차를 올려다보았다. 눈물이 앞을 가렸다. 먼지 낀 유리창이 더 흐려 보였다. 앞의자 뒤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먹이며 나는 울었다.’
김씨가 회상하는 어릴 적 한 장면에서는 누구나 고향과 어머니 생각에 잠길 법하다.
《내 어머니의 연대기》는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랐던 이노우에 야스시의 자전적 소설이다. 1964년과 1969년, 1974년에 발표한 세 단편을 묶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느낀 감정을 풀어냈다. 저자는 시종일관 차분하다. 병든 어머니를 지켜보며 쓴 글이라면 감정의 높낮이가 자주 바뀔 법도 한데 말이다. ‘어머니는 몇 번이나 같은 말을 토해놓는다. 마치 고장난 레코드판이 몇 번씩이나 같은 곡조를 반복하면서 회전하는 것과도 비슷했다’고 쓰는 식이다.
어머니가 임종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1시50분에 시가코에게서 세 번째 전화가 왔다. 지금 할머니가 숨을 거두셨어요, 1시48분이었습니다, 라고 시가코가 말했다. 모든 것은 내일 아침에 내가 고향으로 출발한 후에 하기로 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치매를 앓아온 어머니가 세상을 뜨는 장면을 서술한 것치고는 놀랍도록 건조하다.
다분히 건조한 듯한 이런 서술은 인생과 죽음에 대한 차분한 고찰로 유도하는 것 같다. 슬픔에 동참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슬픔을 마주하는 일본인의 절제된 표정을 보는 듯하다. 일본의 장례식장에는 곡소리가 없다. 울더라도 훌쩍이는 정도다.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슬픔에 대해서조차 ‘겸허함’을 유지하는 일본식 삶의 태도가 다소 생경하게 다가오기도 한다.
이 두 권의 책이 한·일 두 나라 정서를 모두 설명해주지는 않지만 ‘어머니’라는 같은 소재를 표현하는 방식 차이를 경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어느 쪽이든 한 권만 읽어도 좋겠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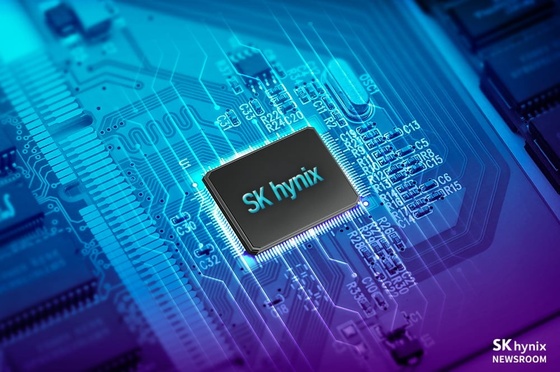
![금리인하 '연내 1회' 축소에도…S&P·나스닥 또 최고치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7017767.1.jpg)

![[단독] 새마을금고 '특판 예금' 가입했는데…"파산 위기라니"](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01262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