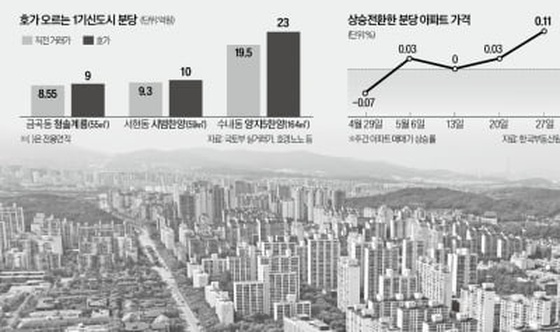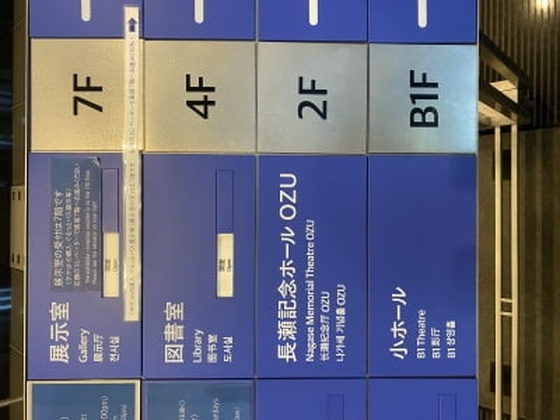[책마을] 성인군자 vs 세속정치가…공자의 두 얼굴
욕망하고 갈등하는 인간 그려
내 인생의 논어, 그 사람 공자
이덕일 지음 / 옥당 / 440쪽 / 1만7500원
사학자 이덕일 씨가 있는 그대로의 공자를 조명하는 책을 내놓았다. 《내 인생의 논어, 그 사람 공자》다. 이씨는 그동안 한국사의 쟁점에 정면 도전하는 역사 서술에 치중했다. 주목받지 못했던 비운의 천재나 왜곡됐던 인물을 재조명하는 작업에 매달려 왔다. 이번에는 동양고전으로 시각을 확장한 것.
후대에 알려진 공자의 얼굴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인간 공자의 얼굴, 다른 하나는 역사 속에서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성인’ 이미지로서의 얼굴이다. 이씨는 이 성인 공자에서 벗어나 욕망하고 갈등하는 인간 공자의 모습을 복원하는 데 치중했다. 이를 위해 학자이자 정치인으로 살았던 공자의 인생을 따로 떼어 접근했다.
인간 공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자의 어린시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공자는 세 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자랐다. 그는 먹고살기 위해 부유한 집안의 가축을 기르고 창고지기로 일하는 등 여러 직업을 전전했지만 현실의 틀에는 갇히지 않았다. 그럴수록 학문에 매진해 사람과 세상 이치에 눈을 뜨는 계기로 삼았던 것. 공자의 평등사상은 이 같은 성장기의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며 배움을 ‘즐기는’ 경지로 끌어올린 공자는 점차 이름을 알려 여러 제자를 가르치는 학자로서의 명성을 완성해갔다.
학자로서의 명성과 달리 정치인 공자의 인생은 순탄치 않았다. 천하를 제패하려는 군주들이 공자의 평화 사상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공자는 그런 현실을 고뇌하면서 14년간 천하를 주유했다. 이씨는 공자의 천하 주유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정치인 공자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여러 사례를 소개한다.
대표적인 예가 ‘삼손씨 무력화 계획’이다. 100년 이상 노나라 국정을 장악하고 있는 경대부(卿大夫) 삼손씨(맹손씨, 숙손씨, 계손씨)를 무력화해서 정권을 왕에게 되돌려주고, ‘바로 세운’ 노나라를 기반으로 천하를 도모하려던 원대한 계획이었다. 공자의 천하 개혁 프로젝트인 셈이다. 1868년 일본에서 하급 무사들이 막부를 타도하고 일왕 메이지에게 권력을 되찾아준 메이지 유신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공자는 이 계획을 성사시키기 위해 아끼는 제자 중유(자로)를 세력이 가장 막강한 계손씨의 가재(가신의 우두머리)로 ‘위장 취업’시키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다. 잘 드러나지 않았던 전략가로서 공자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사례다. 하지만 공자는 원대한 계획을 이루지 못한 채 유랑길에 오른다. 이후 정치인 공자는 여러 나라를 떠돌며 자신의 뜻을 펼치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그를 광야의 삶에 묶어둔다.
이씨는 역사학자의 시각으로 논어를 재구성했다. 사실 논어에 담긴 20편의 이야기는 ‘수수께끼 모음집’처럼 성격이 모호한 면이 있다.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성과 앞뒤 문장 간의 연관성도 부족하다. 앞쪽에서 말한 내용과 어긋나는 문장이 독자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이씨는 이를 당시 상황에 맞게 추적, 공자의 전체상을 찾아냈다. 또 논어 텍스트에 머무르지 않고 2500년간 동양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그의 사상이 우리 선조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핀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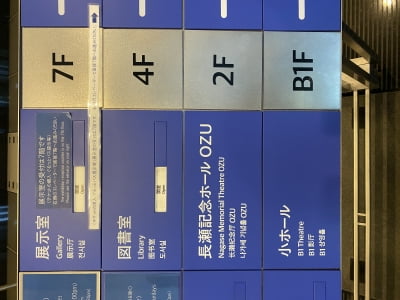




!["심각한 고평가"…AI 서버 수요 의심 커졌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B202406010655477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