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3.0시대] 빈 라덴 사살 실황중계 '트위터 특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속보성에 의제 설정까지
"청룽 사망" 등 오보 양산도
이 역사적인 트위트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2011년 최고의 트위트’ 1위로 뽑혔다. 이처럼 ‘트위터발(發) 속보’는 느려터진 기성 언론을 비웃으며 초고속으로 유통·확산된다.
초기에는 ‘트위터→기성 언론’ 순으로 퍼졌지만, 최근에는 트위터 스스로 의제를 만들며 언론의 영역을 잠식하고 있다.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커뮤니케이션과 인적 네트워킹이란 좁은 틀을 벗어나 전통 미디어의 의제 설정력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트위터는 지구촌 전역 이용자를 특파원으로 거느린 ‘막강 취재군단’이다. 기존 언론의 물리적 한계와 인적 제약에서 자유로운 이유다.
2008년 인도 뭄바이 폭탄테러 사건, 지난 1월 아이티 대지진도 트위터가 가장 먼저 전했다. 압권은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체포 특종이었다. 뉴욕의 한 호텔에서 체포된 지 19분 만에 캐나다 출신 파리 유학생이 트위터로 알렸다. 뉴욕에 있는 친구와 페이스북으로 대화를 나누다 알아낸 정보였다.
2009년 미국 뉴욕 허드슨강에 여객기가 불시착한 사건도 트위터 특종이었다. 목격자인 한 청년의 발빠른 트위터 속보로 승객·승무원 200여명이 무사히 구출됐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가을 수해를 입은 광화문·강남·홍익대 입구 상황이 트위터로 속속 올라와 기성 언론과 소방당국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트위터에서 정보의 판단 주체는 언론과 전문가가 아니라 ‘개인’이다. 이른바 ‘풀뿌리 저널리즘’이다. 전통 미디어가 독식하던 ‘정보’를 나눠 가진 이용자들은 새로운 전문가 그룹으로 부상했다.
이들은 생생한 현장감과 어마어마한 분량을 앞세워 다수와 기록을 공유한다. 기성 언론의 엄숙주의를 걷어낸 자유로운 글쓰기 방식은 가독성 면에서 전통미디어보다 유리했다. 심각한 이슈를 정색하고 설명하기보다 흘리듯 ‘툭’ 던져 친밀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반면 오보(誤報)도 적지 않다는 게 단점이다. 책임감 없는 개인들이 아무런 여과 없이 무차별적으로 글을 올리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지난 9월 스티브 잡스 전 애플 최고경영자(CEO) 사망 오보였다. 트위터에서는 지난 3월 세계적인 액션배우 청룽(成龍)의 사망설이 사실인양 유포되기도 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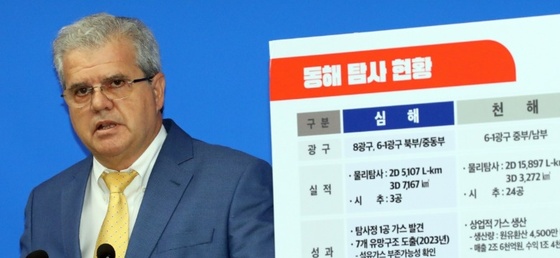

![옥수수 가격 반등…에탄올 수요가 견인 [원자재 포커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597335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