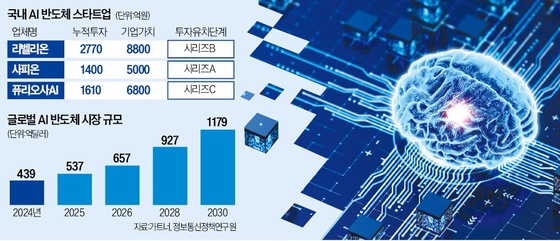국악에 빠진 CEO들 '얼~쑤' 소리에 어깨 들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판소리ㆍ단소 배우며 감성 충전
지난 28일 저녁 8시 반 남산 중턱의 국립극장 달오름극장.2층 연습실에서 단가(短歌) 실기수업이 한창이다. 국립극장이 서울과학종합대학원과 함께 처음으로 기획한 '전통예술 최고경영자 과정'의 일부다. 지난 14일 시작된 1기 과정엔 윤영달 크라운해태제과 회장과 변인근 중앙디자인 회장,한규택 삼주에스엠씨 회장,이순조 명승건축그룹 회장 등 40명이 참가하고 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단가반의 열기는 뜨거웠다. '더엉덕 쿵~덕 쿵~덕 쿵~쿵' 12박자 중중모리 장단에 맞춰 판소리 춘향가의 한 대목인 '사랑가' 연습이 진행됐다. 단가란 판소리 전에 부르는 짧은 사설의 노래.인생무상과 사계절 등에 관한 곡이 많다. 이들은 일반인에게 친숙한 창을 먼저 배워보기로 했다.
"'당동지 지루지 허니 외가지 단참외 먹으랴느냐(짤막 몽땅하고 길쭉한 외가지의 참외를 먹으려느냐)'의 '당~동~지' 부분은 애교섞인 콧소리로 끌어주세요. 악보상 '단참외' 뒤에는 쉼표가 없지만 숨이 차면 몰래 쉬시구요. 저희는 '도둑숨'이라고 부릅니다. "
강사로 나선 이연주 국립창극단 단원이 판소리의 4대 구성 요소 '아니리(가락을 붙이지 않은 사설)' '창(노래)' '추임새(흥을 돋우는 소리)' '발림(몸짓)'을 설명하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무리하게 성음(구성지게 떠는 음)을 만들어내지 말라고 따끔한 잔소리를 한다. 개인과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 성음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붙게 된다는 것.
CEO들은 잠시 물을 마시며 목을 축이는 1~2분간의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한 시간 내내 '사랑가'를 수십 번 반복해 불렀다. 코스닥 상장사인 중앙디자인의 변인근 회장이 "우리 음이 너무 낮아요. 목에 피가 나도록 소리 한번 질러 봅시다"라고 말하자 부동산개발 업체 조인씨엠의 심영애 회장 등이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강사가 "요새는 득음하겠다고 피가 날 정도로 소리를 내면 병원가서 치료받고 쉬어야 한다"고 말하자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함께 연습 중이던 윤영달 크라운해태제과 회장은 "한국인의 유전자(DNA)에는 국악이 흐르고 있어 나이가 들면 다 좋아할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배우고 싶은 것인데 CEO들이 먼저 국악을 접하면 저변 확대에도 큰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2006년 '락음국악단'을 창단해 창신제와 대보름명인전 등 공연을 수십차례 개최한 국악 마니아.
같은 시간 다른 연습실에선 단소 레슨이 진행됐다. 거울 앞에 죽 늘어선 경영자들이 자신의 입모양과 자세를 관찰하며 단소 불기에 여념이 없다. 단소는 고개를 숙여 취구(소리를 만드는 구멍)를 정확하게 윗입술 가운데에 댄 후 고개를 들어야만 바른 소리가 나온다. 단소도 몸통과 약 45도 각도를 이뤄야 한다. 원래 지공(손가락으로 막는 구명)이 5개인 전통 단소 대신 7음계를 잘 표현하도록 개량한 단소를 잡고 모두 균일한 소리를 만들려고 노력 중이다.
이날 세 번째 수업에 참여한 CEO들의 표정은 무척 밝았다. 차에 단소를 매일 싣고 다니며 연습한다는 한규택 삼주에스엠씨 회장은 "베토벤이나 푸치니를 모르면 무식하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우리의 가락,국악 역사는 더 모른다"며 "지난주 상하이에서 프랑스 사업가들과 식사를 하며 한국 문화와 음악에 대해 얘기해 줬더니 반응이 아주 좋았다"고 귀띔했다. 그는 "MS와 애플의 싸움은 기술과 감성의 대결"이라며 "고객이 제품이나 회사를 선택할 때 감성적인 마케팅을 중시하는 만큼 굳어진 감성을 연마하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변인근 회장은 "최근 우리 회사가 진행하는 건축디자인과 인테리어 프로젝트에 한국적인 모티브를 접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통예술 최고경영자' 과정 참가자들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에 모여 국립극장에서 제공하는 뷔페로 저녁을 해결한 뒤 가야금 대가 황병기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의 이론수업을 듣고 각자 실기연습 시간을 갖는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모닝브리핑] 애플, MS와 시총 1위 박빙…美 기준금리 또 동결, 연내 1회 인하 예고](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ZA.37004834.3.jpg)
![[일문일답] 파월 "인플레 지표 아주 좋지만은 않아…노동시장 여전히 견실" [Fed 워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ZK.37016492.3.jpg)





![[단독] 새마을금고 '초비상'…124곳에 '부실 딱지'](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00132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