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락 凋落

진달래 개나리 벚꽃도 나 몰라라 했고
푸른 바다도 장마도 태풍도 애써 외면하며 달음질만 쳐왔다.
그 길밖에 없었고 그 길만 배웠고 그 길만 길인 줄 알았다.
혼자 길 한가운데서 나를 본다.
어? 이게 누구지? 내 옆에 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지?
왜 나만 여기 있어야 하는 거야.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이 길을 왔지?
이 길이 제대로 된 길인가?
이 길의 끝은 어디지?
잘못온 길이면 이제 어떻게 하지?
아무도 없다. 물어볼 곳도 없다.
알려줄 사람도 없다.
바람이 휭 불고 낙엽이 우수수 떨어져 이리저리 딩군다.
가을은 갈대가 있어서 가을이다.
물가의 갈대나 산비탈의 억새들.
꼬장꼬장 시퍼렇게 날을 세우고 종아리를 할퀴던 그 풀들이 어느새
누렇게 되더니 칙칙하게 갈빛으로 젖어 시든다.
들판의 벼들은 다 거두어져 삭막한 그루터기만 남았다.
잡풀 무성하던 들판은 어디를 보나 어룩어룩 누릇누릇이다.
길거리는 낙엽들이 뒹굴고
바쁜 차들이 냅다 달리면 와사사삭 까르르륵 놀리며 따라간다.
산은 더 이상 물감을 찍을 곳 없이 알록달록이다.
그러나 아주 잠시 뒷면 이제 곧 저 잎들도 다 떨어지고
서리가 희끗희끗 내리면 산과 들엔 아무 것도 남지 않는다.
그리고는 시베리아 같은 눈보라뿐이고 북극 같은 죽음뿐이리라.
살아있는 것은 시들어 떨어진다.
떨어지기 전에 시들고 시들기 전에 슬프도록 아름답게 물든다.
시들기 전의 마지막 불꽃이리라.
아 내 청춘은 언제 이토록 아름다웠던가?
몇십 년 살아오면서 과연 나는 꽃처럼 아름답게 살려 한 적이 그 얼마인가?
이제와 생각하니 그 긴긴 세월 동안 나는 과연 무엇을 찾으려 헤맸던가?
다 헛되고 헛되도다. 저기 저 나뭇잎과 풀들보다 못한 것이 바로 나이다.
저들은 내년 봄이면 다시 돋아나지만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이다.
사그라지고 모지라진 몸을 본다.
펄펄 뛰던 가슴을 쓸어본다.
기운은 다 빠지고 눈은 가물거리고 다리는 휘청거리고
손은 이미 메마르고 거칠다.
가슴엔 슬픔만 고이고 뱃속에는 욕심만 가득하고 머리 속은 수심만 가득하다.
아! 조락이여. 너도 시들고 나도 떨어진다.
떨어지는 잎들. 그들은 모를 것이다.
자신이 왜 떨어져야 하는지를.
자연의 섭리라는 것을 잎들은 모른다.
겨울을 나기 위한 자연의 이치.
땅에 떨어져 부엽토가 되어 내년에 돋아날 새잎을 위한 거름인 것을.
나도 자연의 일부이거늘 영원할 수는 없다.
오늘 내가 뿌린 이 땀과 눈물과 한숨을 거름으로
내일의 뒷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또한 자연이 내게 준 섭리 아닌가.
나는 그래도 그 섭리를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저 조락하는 잎들보다는 더 잘 적응할 것이다.
나는 내게 주어진 역할, 세대를 잇는 고리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족한 것이다.
그래, 열심히 지금을 사는 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가자 가자 가자
길은 가는 데 그 뜻이 있나니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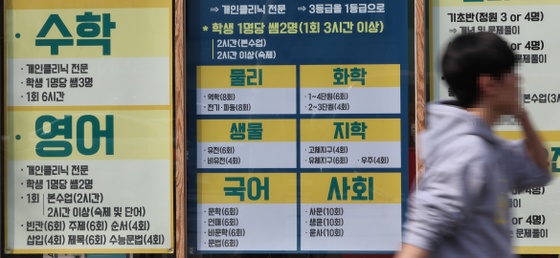

![고용보고서 앞두고 혼조 마감…엔비디아, 시총 3위로 밀려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4384444.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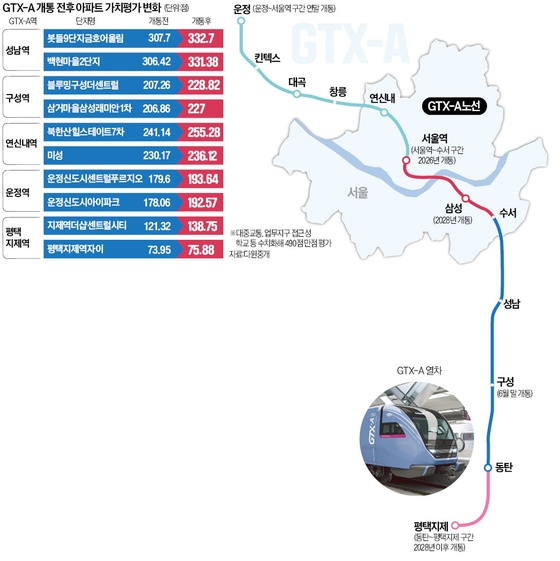







![[베스트셀러] 서점가도 푸바오앓이…'전지적 푸바오 시점' 단숨에 1위](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ZK.3695989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