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을] '1번지' 식당엔 늘 친구들이 있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밥 먹다가, 울컥
박찬일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260쪽|1만7000원
![[책마을] '1번지' 식당엔 늘 친구들이 있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AA.36820279.1.jpg)
1번지 주인아저씨는 늘 무심한 얼굴로 생맥주를 담아주거나 치킨을 튀겼다. 손님에게 웃음을 지어야만 친절한 건 아니다. 술 먹다 돈이 모자라면 학생증을 대신 받아주는 곳도, 학교 행사 때 후원금을 받기 위해 늘 첫 번째로 들르는 곳도 1번지였다.
1번지에는 늘 아는 얼굴이 앉아 있었다. 아마 늘 오는 사람만 와서 그랬을 테다. 우리는 1번지에서 동아리 뒤풀이를 했고, 학회 뒤풀이를 했고, 공연 연습 뒤풀이를 했고, 집회 뒤풀이를 했다. 그러고 앉아 있으면 또 아는 얼굴이 와 자연스레 어울려 앉았다. 먹은 대로 돈을 내지도, n분의 1을 하지도 않았다. 있는 사람이 더 내면 됐고, 없는 사람에게 생맥주 한잔 못 사줄 이유도 없었다. 제법 술이 돌고 나면 우리는 노래를 불렀다. ‘오늘의 할 일은 내일로 미루고, 내일의 할 일은 하지 않는다. 노나 공부하나 마찬가지다….’
박찬일 셰프의 <밥 먹다가, 울컥>을 읽으면서 내가 떠올린 식당은 1번지였다. 음식에 쌓인 오래된 그리움을 털어놓는 에세이인 이 책은, 막막한 유학 시절 고추장과 멸치를 챙겨 보내주던, 이제는 만날 수 없는 후배, 친정 간 새댁 대신 봐주기 시작한 가게를 40년째 운영하고 있는 군산 ‘홍집’ 주인 등 어렵고 허기진 시절을 함께 지낸 사람들과의 소설 같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대학 시절 철없고 무지하던 내 곁에는 자기 할 일은 미루면서 타인과 함께 사는 법을 알려준 선배들이 있었다. 공부는 안 했어도 가방에 시집 한 권 넣어 다니며 좋은 시를 읊어주던 친구들이 있었다.
지금의 내가 미약하게나마 타인의 처지를 공감하고, 세상일에 관심을 두고,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때 1번지에서 함께 노래 부르던, 남의 일 먼저 챙기느라 사회가 말하는 성공과 거리가 멀어진 그들 덕분이다.
그때보다 훨씬 분위기 좋은 술집에서 비싼 안주에 술을 마셔도 그때처럼 흥이 나지 않는 건, 술자리 대화가 할 일을 미루고 공부하지 않으면 닿을 수 없는, 부동산과 주식과 입시와 건강과 노후 같은 것으로 채워졌기 때문일까.
최윤경 어크로스 편집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주목! 이 책] 다윈이 사랑한 식물](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AA.36820245.3.jpg)
![[주목! 이 책] 소셜 애니멀](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AA.36820247.3.jpg)
![[주목! 이 책] 우아한 단어 품격있는 말](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AA.36820253.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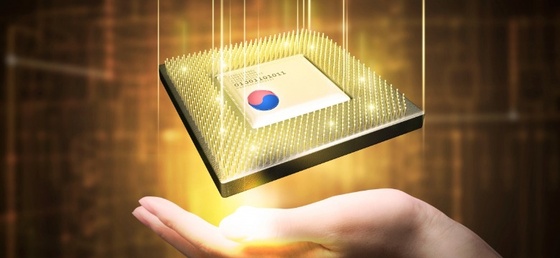
![美소비자 심리 둔화에 반락한 유가…"수요 강세 전망은 호재" [오늘의 유가]](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6039374.1.jpg)








